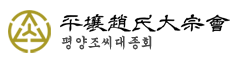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시(詩) 4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목은시고 제20권 / 시(詩)
염시중(廉侍中)을 배알하고 인하여 동정(東亭)의 집에 들르다.
백발 나이로 부자 사이를 분주하다 보니 / 白首遨遊父子間
한산의 늙은 목은은 진정 청한한 몸일세 / 韓山牧老儘淸閑
송악산과 용수산 빛이 서로 연접한 데서 / 鵠峯龍岫光相接
우연히 새 시 얻으니 희색이 만면하여라 / 偶得新詩喜溢顔
백 년 세월이 한순간 취몽과도 같거니 / 百歲光陰醉夢間
잠시의 한가함인들 그 몇이나 얻을쏜가 / 幾人能得暫時閑
겹겹 두른 강산에 돌아갈 길 헷갈리어라 / 江山萬疊迷歸路
앉아서 병풍 대하니 낯에 땀이 흐르누나 / 坐對屛風汗我顔
사소한 의리 이끗엔 비록 헷갈리더라도 / 毫忽雖迷義利間
끝내 대덕은 한계를 넘지 않게 해야지 / 終敎大德不踰閑
취중에는 얻고 잃음을 모두 잊을 만하니 / 醉中得喪俱忘了
상제의 조화로 안회 주조했다 말을 마오 / 謾道洪爐帝鑄顔
1) 끝내…해야지 :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드나듦이 있더라도 괜찮다.
[大德不踰閑 小德出入可也]”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子張》
2 상제(上帝)의…마오 : 양웅(揚雄)의법언(法言)에 의하면, 혹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주조할 수 있는가?
[人可鑄與]” 하니, 대답하기를 “공자가 안연을 주조했었다.[孔子鑄顔淵矣]”고 하였는바, 주조란 곧 인재양성을
의미하는데, 두목(杜牧)의 도일대윤…정상삼군자(道一大尹…呈上三君子) 시에 “북두 사이 붉은 기는 옥에 용천검이요,
천상의 조화로는 상제가 안연을 주조했네.[斗間紫氣龍埋獄 天上洪爐帝鑄顔]” 하였으므로 이른 말이다.
주석 : 염시중(廉侍中)은 파주염씨 곡성부원군 염제신으로 정숙공의 외손자이다.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가 이색이다.
동정(東亭)은 염흥방(廉興邦)으로 염제신의 차남이고, 목은 이색의 친우이며,
8世 조준(趙浚)의 동지공거(同知貢擧)이다. 지공거는 광양부원군(光陽府院君) 이무방(李茂芳)이다.
목은시고 제20권 / 시(詩)
유항(柳巷)의 문생(門生)이 주석(酒席)을 마련하였으니, 공(公)이 첨서(簽書)에 거듭 제배(除拜)된 것을
하례하기 위한 것이다. 나와 염동정(廉東亭)이 부름을 받고 자리에 나갔는데, 천태판사(天台判事) 나잔자(懶殘子)
또한 초청을 받고 와서 함께 앉아 묘련사(妙蓮寺)의 삼장법사(三藏法師) 당시의 일을 진진하게 담론하여
마지않았다. 취중(醉中)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아직도 구속 유풍(舊俗遺風)이 남아 있음을 즐겁게 여겨,
깨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바이다.
정해년의 문생은 한 시대의 웅걸인데 / 丁亥門生一世雄
의발 전수받은 이는 유독 한공이로세 / 得傳衣鉢獨韓公
가련도 하여라 우마주는 너무 쇠하여 / 自憐牛馬走衰甚
매양 주연에서 두 뺨만 붉어질 뿐이네 / 每向尊前雙頰紅
대승의 묘법연화는 불심을 드러내고 / 大乘蓮花表佛心
동정의 풍채는 유림 속에 환히 빛나네 / 東亭風彩照儒林
청성의 훌륭한 문생들은 줄지어 섰으니 / 淸城玉笋森相映
일곱 자 새 시구를 취해 읊조릴 만하네 / 七字新聯可醉吟
삼장법사의 풍채는 묘련사에 빛났는데 / 三藏風儀照妙蓮
첨서의 기발한 시구는 연석을 경동하네 / 簽書警句動賓筵
당시의 부귀가 장안 호걸을 압도했기에 / 當時富貴傾豪傑
전신이 바로 의천 국사라고 말들 한다지 / 共道前身是義天
1) 정해년의…한공(韓公)이로세 : 고려 충목왕(忠穆王) 3년인 정해년(1347) 겨울에
저자의 아버지인 이곡(李穀)이 동지공거(同知貢擧)로 고시(考試)를 주관했는데,
이때 유항(柳巷) 한수(韓脩)가 문과에 급제했으므로 이른 말이다.
2) 우마주(牛馬走) : 우마(牛馬)를 관장하는 하인(下人)이란 뜻으로, 스스로 겸사(謙辭)하는 말이다.
사마천(司馬遷)의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에 ‘태사공의 우마주[太史公牛馬走]’라고 했는데,
여기의 태사공은 바로 사마천의 아버지인 태사(太史) 사마담(司馬談)을 가리킨 것이므로,
여기서 저자 또한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을 우마주라 일컬은 것이다.
3) 대승(大乘)의 묘법연화(妙法蓮花) : 대승 경전(大乘經傳) 중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이
가장 미묘(微妙)한 경전이라 하여 이를 ‘대승묘경(大乘妙經)’이라 하므로, 여기서는
곧 묘법연화경을 강설(講說)하는 천태 판사(天台判事) 나잔자(懶殘子)를 가리켜 한 말이다.
주석 : 유항은 청주한씨 한수의 호이며 7세 조굉의 외사촌 한악(韓渥)의 손자이고, 6世 조위(趙瑋)의 묘지명을 썼다.
염동정은 염흥방으로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차남이며, 8世 조준의 좌주이자 이색의 친우이다.
가정 이곡은 6世 삼장법사가 원의 수도 대도에서 대천원연성사에 주석할 때 원의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로 있었으며 수많은 교류가 있었다.
천태판사(天台判事) 나잔자(懶殘子)는 삼장법사 의선 스님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21권 / 시(詩)
나잔자(懶殘子)가 최졸옹(崔拙翁)이 뽑은 동인시(東人詩)를 가지고
와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므로, 나는 그의 배우려는 뜻이 쇠하지
않았음을 기뻐하여 한 수를 읊어 이루다.
불교의 경전 만 권 서책을 다 섭렵하고 / 敎海禪林萬卷書
곁으로는 이두와 한소까지 정통하고는 / 旁通李杜與韓蘇
다시 계림국 문장으로 좇아 시작하여 / 更從雞國文章始
예산이 찬집한 책으로 연구를 하려는데 / 欲究猊山紀纂餘
전고 인용과 정서 표현은 전아한 게 많고 / 用事紓情多典雅
모양 본뜸과 글귀 퇴고엔 허황된 게 적네 / 模形鍊句少荒虛
승려는 환술 잘하고 참으로 한가하기에 / 浮屠善幻眞閑暇
매양 유편 가지고 내 초려를 찾아오누나 / 每把遺編顧草廬
1) 최졸옹(崔拙翁)이 뽑은 동인시(東人詩) : 최졸옹은 고려 후기의 문인(文人)으로
호가 졸옹인 최해(崔瀣)를 가리키고, 뽑은 동인시란 곧 최해가 고려 시대 명현(名賢)
들의 시를 뽑아서 편찬한 동인지문(東人之文)을 가리킨다.
2) 이두(李杜)와 한소(韓蘇) : 이두는 성당(盛唐)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詩人) 이백(李白),
두보(杜甫)를 합칭한 말이고, 한소는 당(唐)나라의 한유(韓愈)와 송(宋)나라의 소식
(蘇軾)을 합칭한 말이다.
3) 계림국(雞林國)…시작하여 : 계림국은 신라(新羅)를 가리킨 말인데, 여기서 특히 계림국
문장(文章)이라고 한 것은 곧 신라 말기의 문장가였던 최치원(崔致遠)의 문장을 가리킨
것으로, 최해(崔瀣)가 《동인지문》을 찬집(纂集)함에 있어 신라 최치원의 문장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4) 예산(猊山) : 최해의 별호인 예산농은(猊山農隱)의 약칭이다.
5) 승려는 환술(幻術) 잘하고 : 환술은 변환(變幻)하는 기술을 가리킨 것으로, 한유(韓愈)의
송고한상인서(送高閑上人序)에, “나는 들으니, 승려는 환술을 잘하여 기능이 많다고
하더라.[吾聞淨屠人善幻 多技能]” 한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나잔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23권 / 시(詩)
4월 26일에 서린(西鄰)의 길창군(吉昌君)이 빈객(賓客)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었다.
영문하(領門下) 곡성공(曲城公)과 문하시중(門下侍中) 칠원공(漆原公)은 한중앙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정계림(鄭雞林)과 연로한 한정당(韓政堂)은 동편에 앉아서 서쪽을 향하였으며,
창녕군(昌寧君) 성공(成公)과 연소한 한정당(韓政堂)은 서편에 앉아서 동쪽을 향하고,
주인(主人) 길창군은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향하였는데, 나는 연소한 한 정당 아래에 앉았었으니,
이는 연치(年齒)의 차례로 앉은 것이었다. 전 개성윤(開城尹) 권희문(權希文),
전 군부판서(軍簿判書) 권희천(權希天), 전판사 (判事) 권희안(權希顔) 삼 형제는 주인공(主人公)의 조카들이고,
상당(上黨) 한공맹운(韓公孟雲)과 판사(判事) 권현(權顯)은 주인공의 아들과 사위인데,
모두 자제(子弟)의 예를 갖추어 행동거지를 오직 삼가서 하였다.
이때 원로(元老) (元老)들은 모두 칠순 이상이었으나,
유독 창녕군이 63세이고 연소한 한 정당이 56세였는데,
나 또한 53세로 나이가 가장 아래였기 때문에 속으로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다음 날에 비가 오므로 기뻐서 이를 노래하는 바이다.
태평성대에 태어나서 장수를 누리어라 / 生於太平享高年
달존이 됨은 천명이요 우연이 아니로다 / 天也達尊非偶然
장수 하나가 우뚝이 오복에 으뜸인데 / 一壽巍巍冠五福
명예와 관작 겸해서 어찌 그리 온전한고 / 得名得位何其全
국가의 원기는 대신에게 있는 것이라 / 國家元氣在大臣
대신의 거취는 끝내 천명에 관계된다오 / 大臣去就終關天
곡성공의 옛 호칭은 태평재상이거니와 / 曲城舊號太平相
칠원공은 정대하게 조정 반열에 임했고 / 漆原正大臨朝聯
정공은 멀리 유람해 관람한 게 풍부하고 / 鄭公遠游富觀覽
성공은 일 처리에 경권을 통달하였고 / 成公幹事通經權
노한의 청호한 기백은 하늘 높이 치솟고 / 老韓淸豪氣凌空
소한의 정명한 문장은 달천과 같고말고 / 少韓精明詞達泉
주인의 높은 덕은 벌열 가문을 빛내어라 / 主人碩德照閥閱
늙을수록 강건하여 늘상 주연을 열어서 / 老而益健長開筵
매양 원로 초치하여 함께 담소를 나누니 / 每邀元老共談笑
풍류의 한아함이 선대보다도 뛰어나네 / 風流閑雅超於先
수많은 자질들은 모두가 호걸이거니와 / 子姪詵詵盡豪傑
서원의 옥윤 풍채는 왜 그리 우아한고 / 西原玉潤何翩翩
한산의 목동은 쇠하기 이를데 없는데 / 韓山牧童衰也甚
다행히 좋은 이웃 만나 은혜를 입어서 / 芳鄰幸接蒙恩憐
높은 연회에 참여하니 기쁘기 그지없어 / 叨陪高會喜又極
참으로 천상의 신선에 합류한 것 같네 / 眞如上界參神仙
서로 즐김이 잔뜩 취함에 있지 않는지라 / 交懽未必在沈酗
대면하자마자 고운 미인들을 내치었고 / 對面斥去紅粧鮮
국생도 명함 내밀고 알현하려 하다가 / 麴生投刺欲入謁
읍하고 물러갔네 어울리길 감히 바라랴 / 揖退敢望來磨肩
평생에 마음씀이 절로 뭇사람과 달라 / 平生用意自異衆
온 세상에 교화를 입히려고 노력하기에 / 欲令一世歸陶甄
삼가 법도 지키고 검소함을 숭상했으니 / 謹守條章尙儉素
지기가 서로 합함은 말로 다 못 전하리 / 志同氣合難言傳
분명히 알괘라 화기가 하늘을 감동시켜 / 端知和氣感眞宰
부슬비가 가문 밭을 밤에 두루 적시었지 / 霂霢夜遍黃埃田
불상에 공들인 것으론 꼭 얻진 못하리니 / 叩頭泥佛未必得
이 연회의 얻은 바와 어느 것이 나은가 / 此會所得知誰賢
자고 깨니 작은 창에 날은 이미 밝았고 / 小窓夢斷天已白
꾀꼬리 우는 푸른 나무엔 연기가 떴는데 / 黃鸝碧樹浮蒼煙
부슬부슬 부슬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서 / 微微映空勢不止
요즘 오골오골 타던 심장을 다 씻어 주네 / 洗盡近日心腸煎
성대한 일 형용함은 우리의 책임이건만 / 形容盛事在我輩
경색한 문장 얽는 게 부끄러울 뿐이로다 / 但愧緝綴如拘攣
회상하건대 쌍명재를 상상할 만하여라 / 回頭雙明可想見
당시에 희우의 시편을 그 누가 제했던고 / 當時喜雨誰題篇
1) 달존(達尊) : 천하(天下)가 공통으로 높여야 할 대상을 말한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천하에 달존이 세 가지가 있으니, 관작이 하나이고, 연치가 하나이고, 덕이 하나이다.
[天下有達尊三 爵一齒一德一]” 하였다.
2) 장수…으뜸인데 :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오복은 첫째는 장수함이고, 둘째는 부함이고,
셋째는 강녕함이고, 넷째는 덕을 좋아함이고, 다섯째는 정명으로 마치는 것이다.
[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하였다.
3) 경권(經權) : 경은 상도(常道) 즉 원칙을 의미하고,
권은 권도(權道) 즉 임기응변(臨機應變)을 의미한다.
4) 달천(達泉) : 샘물이 막 콸콸 솟아나오기 시작한 것을 말한 것으로, 아주 힘찬 기세를 의미한다.
5) 서원(西原)의 옥윤(玉潤) : 서원은 상당(上黨)과 함께 청주(淸州)의 고호이고, 옥윤은 진(晉)나라
때 장인인 악광(樂廣)과 사위인 위개(衛玠)가 똑같이 명망이 높아서 당시의 논자(論者)들이,
“장인은 얼음처럼 깨끗하고, 사위는 옥같이 윤택하다.[婦翁冰淸 女壻玉潤]”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사위를 가리킨다. 《晉書 卷36 衛玠列傳》 여기서는 곧 길창군(吉昌君) 권적(權適)의 사위인
상당군(上黨君) 한수(韓脩)를 가리켜 한 말이다. 자는 맹운(孟雲)이다.
6) 국생(麴生) : 술을 의인화하여 일컬은 말이다.
7) 쌍명재(雙明齋) : 고려 중기의 문신(文臣) 최당(崔讜)의 호이자, 같은 시대의 문신인 이인로(李仁老)의
호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세하지 않다. 최당은 일찍이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수태위(守太尉)로 치사(致仕)했는데, 그는 특히 풍류가 아주 뛰어나서 치사한 뒤에는 당대의 명사
(名士)인 장자목(張自牧), 고형중(高瑩中), 백광신(白光臣), 이준창(李俊昌), 현덕수(玄德秀), 이세장(李世長),
조통(趙通) 등과 함께 기로회(耆老會)를 결성하여 시주(詩酒)를 즐기며 유유자적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지상선(地上仙)이라 호칭하고 그들의 도형(圖形)을 돌에 새겨서 후세에 전했다고 한다.
이인로는 역시 여러 관직을 거쳐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이르렀는데, 풍류가 매우 뛰어나서 벼슬을
떠난 뒤에는 당대의 명사인 오세재(吳世才), 임춘(林椿), 조통, 황보항(皇甫抗), 함순(咸淳), 이담(李湛)과
함께 망년우(忘年友)를 맺어 시주를 즐기면서 중국의 강좌칠현(江左七賢)을 모방하여 해좌칠현
(海左七賢)으로 자처했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다 뛰어났다고 한다.
주석 : 길창군 안동권씨 권적(權適)은 6世 조련의 첫째 사위 권렴의 동생이다.
영문하(領門下) 곡성공(曲城公)은 파주염씨 곡성부원군 염제신(廉悌臣)으로
정숙공의 외손자이다.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가 목은 이색이다.
상당(上黨) 한공맹운(韓公孟雲)은 청주한씨 한수(韓脩)로 자가 맹운(孟雲)이며,
길창군 권적의 사위이고, 7世 조굉의 외사촌 한악(韓渥)의 손자이다.
한수(韓脩)의 문집으로 유항시집(柳巷詩集)이 있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의 기단(忌旦)에 사위인 염시중(廉侍中)이 수정사(水精寺)에서 재(齋)를 올리는데, 나는 바로
장자(長子)인 화원군(花原君)의 사위인지라, 당상(堂上)에서 염 시중을 모시고 앉았더니, 공(公)이 관음상(觀音像)을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장모 채 부인(蔡夫人)께서 막내아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 재물을 희사해서 만든 것
이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막내아들이란 바로 내 장인의 아우인데, 연도(燕都)에서 죽었고 자식도 없다.
수월관음이 장엄하기도 하여라 / 水月粧嚴□□□
소리 듣고 고통 구함을 순순히 하듯 하네 / 聞聲救苦似諄諄
막내아들을 유독 사랑함은 자친의 뜻이요 / 尤憐季子慈親意
중생을 널리 구제한 이는 대사의 몸이로다 / 普應羣生大士身
전각은 거듭 새로워져 땅을 환히 비추고 / 殿宇重新明照地
산봉우리는 사방에서 모아들어 옹위하네 / 峯巒四合□□□
곡성 총재는 늙어갈수록 더욱 강건하니 / 曲城冢宰逾強健
응당 빙옹을 닮아 구십 연세를 향수하리 / 應似氷翁九十春
1) 장자(長子)인 화원군(花原君) : 예천부원군 권한공(權漢功)의 장자로서 화원군에 봉해진 권중달(權仲達)을
가리키는데, 그가 바로 목은의 장인이기도 하다.
2) 수월관음(水月觀音)이…하네 : 수월관음은 달이 비친 바다 위의 한 잎의 연꽃 위에 선 모양을 한 관세음보살상
(觀世音菩薩像)을 가리키는데, 모든 고통 받는 중생(衆生)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名號)를 암송(暗誦)하거나
일컫기만 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音聲)을 관(觀)하여 바로 달려가서 그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해 준다고 한다
이 밖에 별칭으로는 구세보살(救世菩薩), 연화수보살(蓮華手菩薩), 원통대사(圓通大士) 등의 여러 가지 명호가 있다.
3) 곡성총재(曲城冢宰)는…향수하리 : 곡성총재는 당시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진
염제신(廉悌臣)을 가리키고, 빙옹(氷翁)은 처부(妻父)의 별칭으로, 여기서는 곧 염제신의 처부인
권한공(權漢功)을 가리킨다.
주석 :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은 안동권씨 권한공(權漢功)이고,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장인이다.
이색은 권한공의 아들 권중달(權仲達)의 사위이다.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가 이색이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대사도(大司徒) 희암공(煕菴公)이 일찍이 삼장법사(三藏法師)를 이어 흑탑(黑塔)의 고려승원(高麗僧院)에 거주하다가,
원(元)나라 천자(天子)가 북쪽으로 몽진하고, 중원(中原)의 군대가 도성(都城)을 쳐들어가자, 탈주(脫走)하여 동국(東國)
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현릉(玄陵)께서 그를 청하여 내정(內庭)에서 재(齋)를 올리게 하였으나, 그는 자기 스승 순암공
(順菴公)을 추념(追念)하여 조용히 지낸 지 오래되었다. 그 후 금상(今上)께서 그를 판천태종사(判天台宗事)에 임명했으
나, 이윽고 남의 무함을 입어 산중(山中)으로 들어간 지 수년이 되었는데, 은혜를 입고 환경(還京)하여 이 병든 사람을
방문해 주므로, 서로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 짤막한 율시(律詩)를 읊는 바이다.
허정당에 일찍이 늙은 순암이 있었는데 / 虛淨堂中老順菴
스님 얻으니 청색이 쪽보다 푸른 격일세 / 得師靑也出於藍
회삼 귀일에 대해선 끝내 입을 다물고 / 會三歸一終成默
현실 개권에 대해선 되레 말을 하누나 / 顯實開權却費談
천자의 몽진 때는 배알한 걸 고마워했고 / 天子蒙塵嘉上謁
국왕은 옛정 생각해 거듭 참여 윤허했네 / 國王懷舊許重參
세간 영욕은 이제 흔적 없이 쓸어버린 듯 / 世間榮辱今如掃
갠 하늘 구름이요 맑은 못의 달빛이로다 / 雲在晴空月在潭
1) 삼장법사(三藏法師) : 고려 후기(後期)의 선승(禪僧)으로 속명(俗名)은 조의선(趙義旋)이고 호는 순암(順菴)인데,
일찍이 원제(元帝)로부터 정혜원통 지견무애 삼장법사(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의 호를 받았었다.
2) 허정당(虛淨堂)에…있었는데 : 삼장법사(三藏法師) 순암(順菴)이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허정(虛淨)이란 편액을
걸었는데, 이곡(李穀)이 일찍이 허정당기(虛淨堂記)를 지었다.
3) 스님…격일세 :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청색은 쪽에서 취하나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지만
물보다 차갑다.[靑取之於藍而靑於藍 氷水爲之而寒於水]”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제자가 스승보다 낫거나
혹은 후인(後人)이 전인(前人)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한 말인데, 여기서는 곧 희암(煕菴)이 그의 스승인
순암(順菴)보다도 훌륭하다고 칭찬한 것이다.
4) 회삼 귀일(會三歸一) : 실교(實敎)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方便)으로 삼승(三乘)을 개회(開會)하여 실교인 일승(一乘)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데, 이는 곧 천태종(天台宗)에서 쓰는 말로, 《법화경(法華經)》 이전에 말한 삼승은 방편이라고
하여, 삼승은 일승에서 나누어 말한 것이므로, 일승 이외에 삼승이 따로 없고, 삼승 이외에 일승이 따로 없다고 하는
이론이다.
5) 현실 개권(顯實開權) : 권교(權敎)인 방편(方便)을 치우고 진실한 교리(敎理)를 나타내 보인다는 뜻으로, 석가(釋迦)의
일대(一代) 50년 중 《법화경》을 설(說)할 때까지의 40년 동안은 방편교(方便敎)를 진실한 듯이 말하고, 방편을 방편
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법화경》을 설하면서부터 삼승교(三乘敎)는 방편이고 일승교(一乘敎)는 진실한 것이라
하여 방편을 치우고 진실을 나타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흑탑(黑塔)의 고려승원(高麗僧院)은 대천원연성사(大天源延聖寺)이다.
대사도는 희암공은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며,
7世 조덕유의 사남 조순(趙恂)으로 법명은 묘혜(妙慧)이다.
현재 북경에는 흑탑은 사라졌지만, 흑탑 200미터 남쪽에 있던 백탑(白塔)은 존재한다.
이를 백탑사(白塔寺)라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외 (역)
주석 : 이색(李穡, 1328~1396) 호는 목은(牧隱), 자는 영숙(潁叔).
가정 이곡의 아들이며. 익재 이제현의 제자이고.
정숙공의 외손자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이다.
8世 조호의 스승이며, 조선의 유학자들의 스승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색 목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