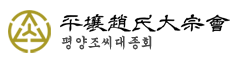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시(詩) 5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장차 희암 대사도(煕菴大司徒)를 알현하기 위해 유동(柳洞)을 출발하여 수금항(水金巷) 어귀로 들어가
숭교사(崇敎寺)를 달려 지나서 서쪽 고개를 넘으니, 고(故) 판사(判事) 김사도(金師道)의 고택(故宅)이
빈 터만 남아 있었다. 여기서 또 서쪽 고개를 넘으니, 송림사(松林寺)가 있으므로, 들어가서 사리탑
(舍利塔)에 예배하고 산을 내려가니, 그곳이 당사천동(唐寺泉洞)이었다. 여기서 또 서쪽 고개로
올라갔다가 장대천동(長大泉洞)으로 내려가 큰 거리로 나가서 성문(省門)을 되돌아보니, 안마(鞍馬)가
성대히 모여 있었다. 이것은 도당(都堂)에서 금릉(金陵)에 갈 계품사(計稟使)를 전별함과 동시에
포왜군선(捕倭軍船)의 제장(諸將)을 위하여 축하연(祝賀宴)을 베푼 자리였다. 불은사(佛恩寺)에
이르러 사도(司徒)를 참알하고 앉아서 담론(談論)하는 사이에 한유항(韓柳巷)이 또 오므로 함께
저녁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판사 이성중(李誠中), 판사 장보지(張輔之)를 방문하였으나 모두
만나지 못했다. 이때 한공(韓公)은 자기 어버이께 저녁 문안을 드리러 가고, 나만 홀로 동년(同年)
이구(李玖)를 방문한 다음 천현(穿峴)을 넘어서 돌아오다.
시끄러움 피해 나의 길 우회하고 / 避喧迂我路
고요함 사랑해 스님 방에 이르니 / 愛靜到僧窓
내 종적은 석가모니와 다르지만 / 跡與牟尼異
마음은 사리를 보고 복종되었네 / 心從舍利降
빈 집터는 예전 길이 헷갈리었고 / 丘墟迷故道
스님은 장강을 향해 떠나 버렸네 / 甁錫向長江
한유항이 이윽고 뒤따라 이르니 / 柳巷俄相踵
은구가 절로 흉중에 가득하여라 / 銀鉤自滿腔
밥상 가득 진미엔 문득 놀랐으나 / 忽驚珍列案
다만 항아리 가득한 술은 없었지 / 只欠酒盈缸
준수한 용모는 쇠할수록 예스럽고 / 秀貌衰來古
청아한 담론은 전혀 잡되지 않아 / 淸談正不哤
군왕을 연연하여 몹시 슬퍼하는데 / 戀君悲惻惻
도를 묻자니 무능함이 부끄러웠네 / 問道愧悾悾
작은 비는 소나무숲에 몰아오고 / 小雨來松麓
석양은 돌다리에 거꾸로 비치니 / 斜陽倒石矼
역력하기는 마치 그림과도 같고 / 如圖畫歷歷
뒤섞인 모양은 갑주와도 같아서 / 似甲冑摐摐
흥이 넘치매 깃발 또한 펄럭이고 / 興逸旛隨動
힘찬 재주는 구정도 들 만하였지 / 才雄鼎可杠
사람 찾아가선 성자만 남겼으나 / □人留姓字
교우는 국가 바루기 위함이었고 / 交友正家邦
어버이 문안차 헤어지는 마당엔 / 昏定須分馬
훌륭한 두 아들이 뒤를 따랐었네 / 追隨玉一雙
1) 금릉(金陵) : 금릉은 명(明)나라가 처음 도읍했던 곳으로, 즉 명나라의 사행(使行) 길을 말한다.
2) 은구(銀鉤) : 은으로 만든 갈고리란 뜻으로, 전하여 뛰어난 서법(書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당대의 명필(名筆) 이었던 유항(柳巷) 한수(韓脩)의 글씨를 가리켜 한 말이다.
3) 뒤섞인…같아서 : 두목(杜牧)의 〈만청부(晚晴賦)〉에 “대숲은 밖에서 둘러싸 십만 장부와 같아라,
갑옷 칼날 어지러이 뒤섞여 빽빽이 포진해 빙 둘러 시립한 듯하네.
[竹林外裹兮十萬丈夫 甲刃摐摐密陳而環侍]”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소나무 등 여러 가지 숲을 통틀어 가리킨 것이다.
주석 : 희암 대사도(煕菴大司徒)는 7世 조덕유의 사남 조순(趙恂)으로 법명은 묘혜(妙慧)이다.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한시 "희암공의 시권 중 목은 선생의 시에 차운하여
희암 대사도에게 바치다" 라는 시와 연계된 목은 이색의 시이다.
불은사(佛恩寺)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이 중창하고 주석한 절이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대사도(大司徒) 조공(趙公)이 화답하였으므로, 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여 짓다.
몇 해나 북녘 바라보며 희암을 생각했던고 / 幾年北望憶煕菴
쪽빛같이 푸른 연산이 아련히 떠올랐었지 / 彷彿燕山靑似藍
난리 뒤에 서로 만남은 참으로 꿈만 같거니 / 亂後相逢眞是夢
귀양살이의 고통쯤은 말할 것도 없고말고 / 謫中之苦不須談
천화가 땅에 떨어질 땐 아침 강경을 열고 / 天花落地開朝講
산월이 하늘에 밝을 땐 야참을 그만두네 / 山月當空放夜參
백련사를 결성하는 게 바로 내 소원인데 / 結社白蓮吾所願
암벽에 머문 보찰이 다행히 깊고도 넓구려 / 留巖寶刹幸潭潭
죽 마시고 누더기 입고 초막 암자에 있는 게 / 啜粥懸鶉草結菴
어찌 금포 차림으로 명찰에 머무름만 하랴만 / 錦袍何似住名藍
세상을 비춘 법화는 마음으로 좇아 나오고 / 法花照世從心發
오묘한 곳은 기회 따라 남김없이 설파하네 / 妙處隨機極口談
뭇 새들도 때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 衆鳥□□時致供
신룡은 보배 바치고 혹 참여도 요구하누나 / 神龍獻寶或求參
다만 화려한 말들은 내 전생의 업이라서 / 獨□綺語吾前業
묵은 때 씻자면 만 길 못물을 쏟아야 하리 / 滌垢須傾萬丈潭
삼한의 크고 작은 암자 손꼽아 세어 보면 / 屈指三韓大小菴
산은 푸른 병풍 같고 물은 쪽빛과 같은데 / 山如翠嶂水如藍
젊어선 죽원에 가서 스님 만나 환담했더니 / 少從竹院欣逢話
늙어선 풍랑에서 담승 굴복시키지 못하네 / 老向風廊懶折談
흑탑의 옛 놀이는 다시 얻기 어렵거니와 / 黑塔舊游難再得
백발엔 병이 많아서 자주 참여하고파라 / 白頭多病欲頻參
연지에서 술 마시기를 고대 기다리노니 / 苦心只待蓮池飮
다시 남은 생에 국담을 묻고 싶어서라네 / 更擬殘生問菊潭
1) 천화(天花)가…열고 : 불교의 전설에 의하면, 불조(佛祖)가 《법화경(法華經)》을 강설(講說)한
것이 천신(天神)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제천(諸天)의 각색(各色) 향화(香花)가 어지러이 땅에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불경을 강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야참(夜參) : 만참(晚參)과 같은 뜻으로, 선사(禪寺)에서 저녁때에 사장(師匠)에게
불법(佛法)을 묻는 것을 말한다.
3)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하는 게 : 진(晉)나라 때 혜원 법사(慧遠法師)가 여산(廬山)의 동림사
(東林寺)에서 일찍이 유유민(劉遺民), 뇌차종(雷次宗) 등 명유(名儒)들을 초빙하여 무량수불상
(無量壽佛像) 앞에서 유불(儒佛)이 함께 서방(西方)의 정업(淨業)을 닦기로 서원(誓願)하고,
또 이 절의 못에 백련(白蓮)을 많이 심고서, 이 유불의 단체를 백련사라 이름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유불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4) 법화(法花) : 《법화경》을 가리킨 것으로, 전하여 불법을 의미한다.
5) 신룡(神龍)은 보배 바치고 : 《법화경》에 의하면, 용녀(龍女)가 일찍이 부처[佛]를 매우 존경한
나머지 부처에게 보주(寶珠)를 바쳤다는 데서 온 말이다.
6) 다만…업(業)이라서 : 소식(蘇軾)의 〈차운승잠견증(次韻僧潛見贈)〉 시에 “다생의 화려한 말들을
전부 없애지 못해, 아직도 완전한 시인의 정이 있네그려.[多生綺語磨不盡 尙有宛轉詩人情]”
한 데서 온 말이다.
7) 젊어선…환담했더니 : 죽원(竹院)은 대를 심은 정원을 말한 것으로, 전하여 승사(僧舍)를 의미한다.
당(唐)나라 장적(張籍)의 〈심서도사(尋徐道士)〉 시에 “스님 찾아서 멀리 휘천관에 당도하니,
죽원의 대는 무성한데 약방은 닫혀 있네.[尋師遠到暉天觀 竹院森森閉藥房]” 하였고,
이섭(李涉)의 〈제학림사승사(題鶴林寺僧舍)〉시에는 “죽원을 지나다가 스님 만나 담화를 나누니,
또 덧없는 인생 한나절 한가함을 얻었구나. [因過竹院逢僧話 又得浮生半日閑]” 하였다.
8) 늙어선…못하네 : 풍랑(風廊)은 바람이 잘 통하는 낭옥(廊屋)을 가리키고, 담승(談僧)은 담론(談論)
잘하는 중을 가리킨 것으로, 한유(韓愈)의 〈송후참모부하중막(送侯參謀赴河中幕)〉 시에 “눈길은
헤쳐 나무꾼 찾아가 놀고, 풍랑에서는 담승을 굴복시키네.
[雪徑抵樵叟 風廊折談僧]” 한 데서 온 말이다.
9) 국담(菊潭) : 하남성(河南省) 남양부(南陽府)에 국담이란 못이 있는데, 그 물이 매우 달고
향기로워서 그곳 주민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장수(長壽)한 이가 많다고 한 데서, 즉 장수를 의미한다.
주석 : 대사도 조공(趙公)은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며,
7世 조덕유의 사남 조순(趙恂)으로 법명은 묘혜(妙慧)이다.
유항(柳巷) 한수(韓脩)도 이색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희암대사도에 봉정(奉呈)"이란 시가 있다.
흑탑은 북경에 있는 대천원연성사로
6世 삼장법사 의선과 8世 묘혜가 주석한 절이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유항루(柳巷樓) 위에서 놀았던 일을 추후에 기록하다.
어제 서쪽 누각을 지팡이 짚고 올라가니 / 昨向西樓扶以登
호화스러운 진수성찬에 술은 강물 같았지 / 食前方丈酒如澠
희암은 딴 데를 가서 약간 실망되었지만 / 煕菴他適稍缺望
규헌은 우연히 와서 흔연히 나가 맞았네 / 葵軒偶來欣出應
줄을 이은 문생들도 취하고 배불렀어라 / 聯翩門生亦醉飽
뫼고 헤짐은 천명인데 무슨 득실이 되랴 / 聚散天數誰除乘
작은 비 뜰 가득 내릴 제 몽당붓 잡으니 / 小雨滿□携敗筆
읊조리지 않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구려 / 欲止不吟還未能
1) 규헌(葵軒) :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준(權準)의 손자이며 현복군(玄福君) 권렴(權廉)의
아들인 권주(權鑄)의 호이다.
주석 : 규헌(葵軒) 권주(權鑄)는 6世 조련의 외손자이고,
희암(煕菴) 조순(趙恂)은 6世 조련의 손자이다.
목은시고 제26권 / 시(詩)
한유항(韓柳巷)과 함께 이 개성(李開城)을 방문하고 송봉(松峯)의 남쪽에 들러
홍이상(洪二相)을 방문했으나 모두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정으로 소환(召還)된
김 영공(金令公)을 특별히 위로하면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다시 정 남경(鄭南京)을
방문했으나 또 만나지 못했다. 그러고는 보제사(普濟寺)에 들어가서 나잔자(懶殘子)를
알현하고 차를 마신 다음, 한공(韓公)은 어버이께 저녁 문안차 가고,
나만 홀로 돌아와서 한 수를 짓다.
말고삐 나란히 하여 남성 가까이 이르니 / 聯鑣緩轡傍南城
용산의 푸른빛이 눈에 가득 선명하여라 / 滿目龍山翠色明
문정 두루 방문해 공연히 자취만 붙였고 / 徧歷門庭空托跡
억지로 동복 불러서 이름자만 남기었네 / 強呼僮僕獨留名
유배 풀려 온 갑제엔 금술병이 불룩하고 / 賜環甲第金樽凸
음주 금한 절간엔 설완이 깨끗했었지 / 止酒蓮坊雪椀淸
어버이 조석 문안은 폐하기 어려운 거라 / 定省朝昏難可廢
유동에 홀로 오니 날이 벌써 저물었구려 / 歸來柳洞暮痕生
1) 설완(雪椀) : 본디 시문(詩文)을 쓰는 데 사용하는 청아(淸雅)한 문구(文具)를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찻잔을 가리킨 듯하다.
주석 :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27권 / 시(詩)
가동(家童)을 보내서 나잔자(懶殘子)에게 차(茶)를 얻어 오게 하고,
가동이 떠난 뒤에 한 수를 읊어 이루다.
대로 깎은 꼬챙이에 메밀떡을 꿰가지고 / 削竹串穿蕎麥餻
거기에 간장을 발라서 불에 구워 먹다가 / 仍塗醬汁火邊燒
옥천자의 차를 얻어 마시고만 싶어라 / 玉川欲得茶來喫
어찌 향적반이 소화 안 될까 걱정하랴 / 香積何憂食不消
땀 흐르는 한여름에 처음 씨 뿌릴 텐데 / 汗滴火雲初下種
상서로운 납설이 또 곡식을 보호했으니 / 呈祥臘雪又藏苗
명년엔 가서 농촌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 明年往試田家樂
배 두들기고 노래하여 성조에 감사하련다 / 鼓腹長歌謝聖朝
1) 옥천자(玉川子)의 차 : 옥천자는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노동(盧仝)의 호인데,
그는 특히 차(茶)를 아주 좋아하여 그가 지은 〈다가(茶歌)〉가 또한 유명하다.
2) 향적반(香積飯) : 불가(佛家)의 용어로, 향적여래(香積如來)가 먹는다는
식물(食物)을 말하는데, 《유마경(維摩經)》에 의하면, 향적여래가 뭇 바리때에
향반(香飯)을 가득 담아서 보살(菩薩)들에게 주어 교화시켰다는 데서 온 말로,
전하여 향적은 승사(僧舍)의 주방(廚房)의 뜻으로 쓰이고,
향적반은 또한 승려(僧侶)들의 재반(齋飯)의 뜻으로 쓰인다.
3) 상서로운…보호했으니 : 납설(臘雪)은 일반적으로 동지(冬至) 이후, 입춘(立春)
이전 사이에 오는 눈을 말하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동지 이후
셋째 술일(戌日)이 납일(臘日)인데, 납일 이전까지 세 차례 눈이 내리면 그해의
채소와 보리[菜麥]가 아주 잘되고, 또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주석 :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27권 / 시(詩)
나잔자가 차를 보내왔으므로, 또 한 수를 읊어서 삼가 사례하다.
늙어서 먹을 것 탐하기 그 누가 나만 하랴 / 老去口饞誰似吾
좋고 나쁨과 정밀하거나 거칢도 문득 잊고 / 頓忘宜忌與精麤
먹을 것 만나면 구덩이 채우듯 배불리지만 / 逢場大飽如塡塹
호구책은 평생토록 전혀 융통성이 없었네 / 謀食平生似守株
내장의 열은 차로 씻을 수 있음을 알거니와 / 內熱只知茶可洗
하초의 허함은 오직 술로만 치유가 되는데 / 下虛唯遣酒相扶
아침에 연꽃의 이슬을 한번 마시고 나니 / 朝來一吸蓮花露
두 겨드랑이 청풍을 외칠 것도 없네그려 / 兩腋淸風不用呼
1) 연꽃의 이슬 : 승사(僧舍)에서 보낸 차(茶)이므로, 차를 특별히 예찬하여 일컬은 말이다.
2) 두…없네그려 : 노동(盧仝)의 〈다가(茶歌)〉에 “첫째 잔은 목과 입술을 적셔 주고,
둘째 잔은 외로운 시름을 떨쳐주고,……일곱째 잔은 다 마시기도 전에 두 겨드랑이에
청풍이 이는 것을 깨닫겠네. [一椀喉吻潤 二椀破孤悶…七椀喫不得 也唯覺兩腋習習淸風生]”
한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외, (역)
주석 : 이색(李穡, 1328~1396) 호는 목은(牧隱), 자는 영숙(潁叔).
가정 이곡의 아들이며. 익재 이제현의 제자이고.
정숙공의 외손자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이다.
8世 조호의 스승이며, 조선의 유학자들의 스승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색 목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