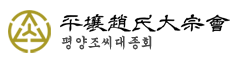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유항(柳巷) 한수(韓脩) 시(詩) 3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한수(韓脩) 유항집(柳巷集)
한산군이 (상련) 세 수를 보여주기에 차운하여 받들어 답하다.
세상과 내가 서로 버린다는 말을 백 번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 世我相遺白不聞
마음대로 술을 담으려고 질그릇 동이를 만들었네 / 任敎盛酒瓦爲盆
가련하게도 눈을 보호하려 해도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 / 可燐養目心猶在
연꽃이 물결 무늬를 덮고 있음을 생각해 보네 / 思見荷花페朤紋
연꽃은 감상하기도 좋고 또 향기를 맡기도 좋더니 / 荷花宜賞復宜聞
허물어진 집에 지금은 수많은 줄기의 화분이 없네 / 獘宇今無千䈎盆
나란히 말을 타고 노닐며 보는 것이 나의 바람인데 / 聯騎遊觀吾所願
하늘의 조화로 어느 곳에서 비단 무늬를 이루었는가 / 天機何處錦城紋
지난 날 광제사에서는 흥이 끝없이 일어 / 往時廣濟興無涯
저녁때까지 못 가에서 술 마시고 읇었네 / 觴詠池邊池日斜
이제 연꽃과 나잔자가 있지 않으니 / 蓮興懶殘今不在
어찌 모든 것이 분화함을 피함이 아니랴 / 豈非俱是避紛華
사물의 변화에도 끝이 있음을 이제 알겠는데 / 物化今知亦有涯
옛날처럼 하나의 길이 못 가에 비껴 있네 / 依然一逕傍逕斜
오가는 말 위에서 슬품이 더해짐은 / 往來馬上增悲槪
물에 비친 연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네 / 不見荷花見數華
주석 : 한산군(韓山君) 목은 이색을 가르킨다. 1373년 11월 봉해졌다.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이다.
광제사(廣濟寺)는 개성에 있던 절이다. 1372년 공민왕이 충숙왕 기일에
광제사에 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충숙왕을 모신 절로 나잔자가 주석했다.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황회산군 상만시 (黃檜山君 裳挽詩)
중화의 나라에서 생장하여 / 生長中華國
영특하고 젊은 나이에 등용되었네 / 登庸英妙時
어연에서는 예법에 통하였고 / 御筵通禮法
빈관에서는 언사에 능하였네 / 賓館善言辭
활을 멀리 쏘아 오랫동안 적수가 없었고 / 射遠久無敵
술을 많이 마셔도 끝까지 예의가 있었네 / 酌多終有儀
재상을 몇 번이나 지냈던가 / 黃扉幾出入
다시는 따르는 무리들을 보지 못하겠네 / 無復見曺隨
주석 : 황회산군은 7世 문정공(文精公) 조덕유(趙德裕)의 셋째 사위 창원황씨
황상(黃裳 1328~1382)이다. 충혜왕(忠惠王) 때 호군(護軍)에 제수되었다.
시호 공정(恭靖)이다. 기철(奇轍)을 주살한 공으로 1등에 책록되었고,
홍건적 2차 침입을 격퇴하고, 공민왕을 안동까지 호종한 1등 공신이다.
우왕(禑王) 때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여러 차례 왜적을 막는데 공이 있었다.
8世 묘혜선사(妙慧禪師) 조순(趙恂)의 법화삼매참조선강의 권하 발원문에
회산군(檜山君)은 황상이다. 목은 이색도 "동경(同庚) 황회산(黃檜山)을 곡하다."
라는 만시(挽詩)를 지었다.
향을 받들고 홍경사에 가서 축리하고 나서 벽란도에 이르러 누각에 올라
사암 상국이 정유년에 지은 것을 우러러보고 감탄을 이기지 못해 운자에
따라 받을어 화답하다. 5수
벽란도를 모르고서 / 不識碧瀾渡
지금 지명의 나이를 넘기네 / 今踰知命年
지금 다행히 눈으로 보며 / 如今幸滿目
보화 앞에 이르렀네 / 爲到寶華前
예불을 드릴 여가가 적은데 / 禮佛小餘暇
임금께서 오래 계시기를 축원하네 / 祝君多歷年
잠시 여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데 / 暫時須到此
훌륭한 경치가 앞에 닿아 있네 / 勝槩耍當前
팔월 열엿샛날에 / 八月十六日
조수 위에서 풍년 소식을 들었네 / 潮頭聞有年
명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인데 / 靈胥所不及
강물의 형세는 절로 전과 같네 / 江勢自如前
정유년 지은 사암의 시 구절를 / 丁酉思庵句
나는 계해년 읊네 / 吾吟癸亥年
유악에 있던 날을 추억하는데 / 追懷帷幄日
마치 눈앞에 바라보이는 듯하네 / 彷佛若瞻前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은데 / 歲月若流水
강산은 지난해인 듯하네 / 江山如昔年
누가 장차 향기로운 자취를 이어 / 誰將繼芳躅
한 사람 앞에 착한 일을 펼치겠는가 / 陳善一人前
주석 : 사암(思庵) 유숙(柳淑 1316~1368) 8世 조호의 외숙부이다. 부친은
태상경(太常卿) 류성계(柳成桂)이고, 조부는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증 도첨의평리(都僉議平理) 상호군(上護軍) 류굉(柳宏) 이다. 모친은
진주강씨 강문세(姜文世)의 따님이다. 1340년 과거에 급제하고, 후에
공민왕이 되는 강릉대군(江陵大君)을 시종해 4년간 원에 있었다. 1356년
기철(奇轍) 일당을 물리치는 데, 세운 공으로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고,
홍건적이 2차 침입하자 왕을 안동으로 호종한 공으로 충근절의찬화공신
(忠勤節義贊化功臣)의 호를 받았고, 서령군(瑞寧君)에 봉해졌다. 우시중
홍언박(洪彦博)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함양박씨 박실(朴實) 장원이 되고
8世 조후의 외육촌인 허시(許時)와 8世 조준의 동서인 영광김씨 김지(金祗),
성주이씨 이숭인(李崇仁), 봉화정씨 정도전(鄭道傳) 등을 급제 시켰다.
사암 유숙의 능력과 충직을 두려워하던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1368년
홍주(洪州)로 장류(杖流) 되었다가, 12월 영광에서 신돈이 보낸 자에게
교살당하였다. 1376년(우왕 2) 11월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유항의 문생들이 술자리를 열고 다시 첨서에 임명된 공에게
하례를 드렸다. 나는 염동정과 함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가니 천태판사 나잔자도 초청을 받아서 와 있었다. 앉아서
묘련사의 삼장 스님을 이야기하니 당시의 일이 쌓이고 쌓여
그치지 않았다. 취중에 듣고 그 옛날 풍속이 즐거워 이미
취하여 기록하다.(柳巷門生開酒席 賀公重拜簽書也 僕興廉東亭承
招赴席 天台判事懶殘子亦被請而至 座談妙連三藏時事 疊疊不已
醉中聞之 樂基有舊俗遺風 旣醉錄之)
정해년의 문생들은 한 시대에 빼어난데 / 丁亥門生一世雄
의발을 전수받은 것은 한공뿐이네 / 得傳衣鉢獨韓公
늙은 우마처럼 분주히 다닌 것이 매우 아타까워 / 自燐牛馬走哀甚
늘 술자리에서 두 빰이 붉어지네 / 每向尊前雙顂紅
큰 잎세의 연꽃은 불심을 드러내고 / 大葉蓮花表佛心
동정의 풍채는 유림에 빛나네 / 東亭風采照儒林
청성의 옥순문생이 빽빽이 비치니 / 淸城玉笋森相暎
일곱 글자의 새 시련은 취하여도 읊을 수 있네 / 七字新聯可醉吟
주석 : 1347년 (충목왕 3년) 정해년 과거에 양천허씨 허백(許伯)과 한산이씨 이곡이
유항 한수(韓脩)와 광양이씨 이무방(李茂芳 8世 조준의 좌주)등을 뽑았다.
허백(許伯)은 6世 조련의 장인 허공의 손자이다. 이곡은 목은 이색의 부친이다.
6世 삼장법사 의선과 나잔자는 고려의 유학자들과 교류가 많았다.
주석 : 청주한씨 한수(韓脩, 1333~1384). 호가 유항(柳巷)이고. 자는 맹운(孟雲)이며,
시호는 문경(文敬), 봉호는 상당군(上黨君), 청성군(淸城君)이다. 시서(詩書)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색(李穡), 염흥방(廉興邦) 등과 교분이 깊어
수많은 시를 주고받았다. 또한 예서(隷書)와 초서(草書)에 모두 능해 당대의
명필(名筆)로 이름났다. 노국대장공주묘비(魯國大長公主墓碑),
회암사지공대사탑비(檜巖寺指空大師塔碑) 현존하는
여주 신륵사보제선사사리석종비(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는
한수의 필적이며, 6世 조위의 묘지명도 한수의 필적이다.
7世 조굉, 조천미의 외사촌 한악(韓渥)의 손자이며, 개국공신 한상경의 부친이다.
번역 : 국학자료원. 성범준 박경신.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유항집(柳巷集),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