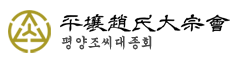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시(詩) 1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도은집(陶隱集) 제2권 / 시(詩)
조 판사에 대한 만사 : 이름은 문경이다. 충숙공의 손자이다.
〔趙判事挽詞 名文景忠肅公孫〕
소싯적에 귀공자 티를 내는 일도 없이 / 少無紈綺習
날마다 술집에 가서 쓰러져 잠들었나니 / 日向酒家眠
나는 말하기를 기심(機心)을 잊었다고 하고 / 我道忘機者
누구는 세상을 희롱하는 신선 같다 하였네 / 人疑翫世仙
차가운 눈 속 그대 묻힐 안식처 / 佳城寒雪裏
삭풍 앞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들 / 丹旐朔風前
가고 가는 저 행렬 멀리 바라보며 / 去去遙相望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오 / 誰能不泫然
1) 충숙공(忠肅公) : 조련(趙璉, ?~1322)의 시호이다. 그는 조인규
(趙仁規, 1227~1308)의 둘째 아들이다.
주석 : 조판사는 7世 평원군(平原君) 조천미(趙千미)의 넷째 아들 조문경(趙文慶)이다.
시(詩) 제목 설명에 6世 충숙공 조련의 손자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世 장민공(莊敏公) 조서(趙瑞)의 손자이다.
조문경의 사위는 파주염씨 염흥방이다. 1388년 1월, 우왕과 최영이 무진피화를
일으켜 염흥방 등 많은 사람을 죽였고, 국정을 농단한 염흥방과 이인임, 임견미와
조금이라도 혈연으로 관련된 고려의 권문세가들도 함께 살해당했다.
이때 7世 조천미의 일곱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외손자들까지 모두 살해되었다.
대동보에는 조천미의 여섯째 아들, 즉 8世 조문신의 아들인 9世 조진(趙瑨)이
유일하게 후손으로 살아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문신이 이성계의 종사관(작전 참모)을 역임한 인연으로 살아 남은 것 같다.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끌어들였지만, 이성계는 최영의 과도한 살육을 비판했다.
염흥방 일족 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포함해 약 1,000명에 달하는 권문세가의
남녀노소는 죄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 당시 남북에서 외적이
침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숙청은 고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개월 후, 이성계와 조민수가 위화도회군을 일으켰을 때, 우왕과 최영을 도울 수 있는
권문세가들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색과 제자들이 마지막 고려의 희망이었지만,
당시 유학자들은 무력이 없었다. 성주이씨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은 이색의 제자로
8世 조호(趙瑚)동문이며, 조호가 12살 연상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염동정이 장단에 호가하여 지은 시에 차운하다 신해년(1371, 공민왕20) 4월
(奉次廉東亭扈駕長湍詩韻 辛亥四月)
먼 강물은 한 필의 누인 명주요 / 江遠練一匹
높다란 바위는 열 길의 무쇠로세 / 巖高鐵十尋
엄숙하여라 정기 펄럭이는 임금님의 의장(儀仗)이여 / 旌旗仙仗肅
심오하도다 궁중 악대 음악 속에 내재한 그 의미여 / 歌吹樂觀深
골짜기까지 비추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 畏景明中谷
무성한 수풀에 가려진 이름 모를 들꽃들 / 幽花翳茂林
예로부터 검소한 덕을 숭상했나니 / 古來崇儉德
여림 후삭의 경계도 있지 않던가 / 朽索戒余臨
이때 꽤나 가물었다. 그래서 제5구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1) 염동정(廉東亭) : 동정은 염흥방(廉興邦)의 호이다.
2) 심오하도다…의미여 : 예기 악기(樂記)에 “친소와 귀천과 장유와 남녀의 도리가 모두
구체적으로 음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음악 속에서
심오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使親疏貴賤長幼男女之理
皆形見於樂 故曰 樂觀其深矣)”라는 말이 나온다.
3) 여림(余臨) 후삭(朽索)의 경계 :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내가 억조의 백성 위에
임하는 것이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조심스럽기만 하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로서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予臨兆民 凜乎若朽索之馭六馬 爲人上者 奈何不敬)”라는 말이 나온다.
주석 : 염흥방은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차남이다.
목은 이색, 유항 한수등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밤에 앉아서 민망의 시에 차운하였다. (夜坐 次民望韻)
산골 마을에서 밤중에 홀로 앉아 / 獨坐山村夜
길고 짧은 경고(更鼓)를 모두 듣노라 / 長更復短更
병풍에 흔들리는 외로운 촛불 그림자 / 屛搖孤燭影
창문을 울리는 한 줄기 시냇물 소리 / 窓撼一溪聲
한 해 십이 율이 다하려 하는 지금 / 歲律行將盡
나그네 마음 걸핏하면 놀라곤 하네 / 羈懷動輒驚
돌이켜 생각건대 도성의 넓은 거리에는 / 還思九街上
흙먼지 자욱이 일어 산까지 뒤덮었으리 / 塵土漲崢嶸
1) 경고(更鼓) : 밤중에 시각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소리를 말한다.
주석 :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막내아들이 대제학 염정수이다. 자는 민망(民望)
호는 훤정(萱庭)이다.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고, 1383년(우왕 9)
지신사(知申事)로서 한때 인사행정을 맡았으며,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호복
(胡服: 원나라의 복식)을 폐지하고 중국의 제도를 따르자고 건의하였다.
저서에 훤정집(萱庭集)이 있다. 우왕과 최영이 형 염흥방을 제거할 때
함께 살해되었다. 염정수의 배위는 성주이씨 이원구(李元具)의 따님으로
도은 이숭인의 누이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동짓날에 민망의 운을 썼다. (至日 用民望韻)
세월은 유수처럼 잘도 흘러가는데 / 歲時何袞袞
근심 걱정으로 애태우는 이 마음 / 憂抱政忡忡
애매모호하여 아슴푸레한 인사라면 / 人事蒼茫裏
끝없이 순환하며 변함없는 천심이라 / 天心坱圠中
강호에 홀로 멀리 나와 있는 신세 / 江湖身獨遠
포홀이 꿈속에서 괜히 어른거린다네 / 袍笏夢還空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음이 있어 / 猶幸知音在
일묘의 집에서 서로 어울리는 것 / 相從一畝宮
1) 민망(民望) : 염정수(廉廷秀, ?~1388)의 자이다.
2) 일묘(一畝)의 집 : 보통 청빈한 선비의 검소한 거처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유배지의
거처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일묘궁(一畝宮)은, 예기 유행(儒行)의 “선비는 가로
세로 각각 10보(步) 이내의 담장 안에서 거주한다. 좁은 방 안에는 사방에 벽만 서
있을 뿐이다. 대를 쪼개어 엮은 사립문을 매달고, 문 옆으로 규(圭) 모양의 쑥대를
엮은 문을 통해서 방을 출입하고, 깨진 옹기 구멍의 들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
(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篳門圭窬 蓬戶甕牖)”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375년
(우왕 원년) 8월에 도은이 북원(北元)의 사신을 배척한 일로 경산부(京山府)로 귀양
갈 적에 염정수도 함께 유배되었다. 그는 도은 이숭인의 매부이기도 하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민망의 시에 차운하다(次民望韻)
시골집 궁벽하다 그 누가 말하는가 / 誰道村居僻
참말이지 내 취향에 아주 맞는걸 / 眞成適我情
구름이 한가하니 몸도 절로 게으르고 / 雲閑身覺懶
산이 좋으니 눈도 훨씬 더 밝아지네 / 山好眼增明
읊조리다가 시고를 고쳐보기도 하고 / 詩稿吟餘改
밥 먹고는 찻잔을 기울여보기도 하고 / 茶甌飯後傾
그동안 이런 맛을 알긴 하면서도 / 從來知此味
다시 따로 공명을 추구했으니 원 / 更別策功名
주석 :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막내아들이 염정수이다.
자는 민망(民望) 호는 훤정(萱庭)이다.
배위는 성주이씨 이원구(李元具)의 따님으로 이숭인의 누이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문충공 익재 선생에 대한 만사 2수 (文忠公益齋先生挽詞 二首)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 北學游中國
동쪽에 돌아와 다섯 조정을 보좌하였네 / 東還相五朝
문장은 웅심하여 가마를 추적했고 / 雄深追賈馬
조정은 정대한 소조를 잃었도다 / 正大失蕭曹
기둥 사이 제사 꿈을 갑자기 꾸다니요 / 夢奠楹間遽
글 지으러 멀리 지하로 내려가셨네 / 修文地下遙
서풍은 상엿줄과 운불삽(雲黻翣)에 불어대는데 / 西風吹紼翣
처절하여라 (초사)의 (초혼(招魂))이여 / 凄斷楚辭招
예전에 외람되게 반면식을 얻었고 / 曾叨半面識
한마디 칭찬하는 말씀도 들었네 / 更獲一言譽
문장이 성대한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 簪履文章盛
기구의 가업을 계승하여 빛냈다네 / 箕裘積累餘
창망하여라 하늘 북쪽의 그 길이여 / 蒼茫天北路
표묘하여라 바다 동쪽의 세월이여 / 縹渺海東居
십 년 동안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그 일 / 十載勤王事
휘황하게 태사가 역사책에 기록하리라 / 煌煌大史書
1) 문충공(文忠公) 익재(益齋) 선생 : 고려 후기의 학자, 정치가인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을 가리킨다.
2) 북쪽으로…하고 : 맹자 (등문공 상)에 “진량은 초나라 출신으로, 주공과 공자의
도를 좋아한 나머지 북쪽으로 중국에 와서 공부하였는데, 북방의 학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보다 앞서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이른바 호걸지사라고 할 만하였다.
(陳良 楚産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謂豪傑之士也)”라는 말이 나온다.
3) 가마(賈馬) : 각각 한나라 문제와 무제 때의 저명한 문사(文士)인 가의(賈誼)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병칭이다.
4) 소조(蕭曹) : 한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잇따라 재상의 중책을 담당한 명신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의 병칭이다.
5) 기둥…꾸다니요 : 위인의 죽음을 가리킨다.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서
제사 드리는 꿈을 꾸었는데 (夢坐奠於兩楹之間),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는 와병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禮記 檀弓上)
6) 글…내려가셨네 : 문인의 죽음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소소(蘇韶)가 죽어서
지하에 내려가 보니, 안연(顔淵)과 복상(卜商)이 귀신의 성자로 대접받으면서
수문랑(修文郞)으로 있더라고 말한 기록이 전한다. (太平廣記 卷319 蘇韶)
7) 처절하여라 초사(楚辭)의 초혼(招魂)이여 : (초사) (초혼)에 “혼령이여 돌아오라,
옛날 살던 곳으로.(魂兮歸來 反故居些)” 라는 등 죽은 이를 애도하는 처창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이 (초혼)은 초나라 굴원(屈原)이 초 회왕(楚懷王)을 애도해서
지었다는 설도 있고, 송옥(宋玉)이 그의 스승인 굴원을 위해 지었다는 설도 있다.
8) 반면식(半面識) : 과거에 한 번 잠깐 동안 만난 일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다분히 겸사의 뜻으로 쓰였다. 후한 응봉(應奉)이 나이 20세에 원하(袁賀)를
찾아갔을 적에,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 문을 열고 얼굴 반쪽만 내보이면서 원하가
출타 중이라고 알려주었으므로 곧장 발길을 돌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응봉이
거리에서 그 장인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불렀다는 반면지식(半面之識)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應奉列傳)
9) 한마디…들었네 : 한유의 여진급사서(與陳給事書)에 “처음 만났을 적에 역시 한마디
칭찬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始者 亦嘗辱一言之譽)”라는 말이 나온다.
(昌黎文集 卷17)
10) 기구(箕裘)의 가업 : 부친의 뛰어난 자질을 아들이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다는
말이다. 기구는 키와 가죽옷을 뜻하는데, (예기) (학기)에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아비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가죽옷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고, 활을 잘 만드는
궁장(弓匠)의 아들은 아비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키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라는 말이 나온다.
11) 십……일 : 원나라에서 충선왕(忠宣王)을 호종하며 보좌한 것을 말한다. 충선왕이
상왕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참소를 당해 귀양 가게 되었을 적에는 원나라 낭중과
승상에게 글을 올려 해명하고 토번(吐蕃)의 살사결(撒思結)에서 타사마(朶思麻)
지역으로 양이(量移)되게 하기도 하였다.
주석 : 경주이씨 익재 이제현은 6世 삼장법사 의선의 묘련사중흥비(妙蓮寺重興碑),
묘련사석지조기(妙蓮寺石池竈記) 등을 지었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여태허 시에 차운하여 좨주 선생에게 올리다
여태허가 와서 말하기를, “삼현의 제 선생으로, 가령 권 좨주와 유 장원과
이 사인과 이 겸박 같은 분들은 창화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고는, 좨주
선생이 지은 당률 2수를 비롯해서 그가 구일에 지은 시 4수 및 좨주 선생의
방문을 받고 화답한 시 1수를 암송하였다. 이에 내가 그 운에 따라 붓을 달려
좨주 선생에게 봉정하는 한편, 유 장원과 이 사인과 이 겸박에게 편지를 보내
“나의 거소가 벽루해서 사문의 모임에 끼일 수 없겠다.”라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다행히 허락을 받았다.
(如太虛來言三峴諸先生若權祭酒柳狀元李舍人李兼博唱和無虛日且誦祭酒先生
所作唐律二首及渠九日四首和祭酒見訪一首僕依韻走筆奉呈祭酒先生
兼簡柳狀元李舍人李兼博致僕所居僻陋不得與於斯文之會之意幸有以見教)
삼현의 다사가 이름났는데 / 三峴號多士
휴상인에게서 다시 확인했네 / 更聞休上人
참으로 그림과 같은 풍표요 / 風標眞似畫
본디 먼지가 없는 경물이라 / 景物自無塵
술통을 몇 번이나 옮겨 왔을까 / 酒榼携應數
시통도 빈번하게 교체했으리라 / 詩筒遞亦頻
내일 혹시 서로 불러 만나게 되면 / 明朝倘相喚
손뼉 치며 새 화제로 담소를 나누겠지 / 抵掌笑談新
1) 여태허(如太虛)…올리다 : 시의 원 제목이 너무 길어 요약해 주고
원 내용은 아래에 본문으로 번역하였다.
2) 휴상인(休上人) : 제목에 나오는 여태허로, 천태종(天台宗) 판사인 고승 나잔자(懶殘子)의
제자인데, 목은문고 제8권에 "휴 상인에게 준 글(贈休上人序)" 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 :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 나잔자의 제자인 휴상인(休上人), 휴상인과
이숭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 즉 익재 이제현, 가정 이곡, 목은 이색, 유항 한수,
도은 이숭인으로 이어지는 불교와 성리학의 세대를 이은 교류를 알 수 있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파주염씨대종회.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