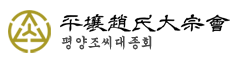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시(詩) 2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고우호에 배를 머물고 포은과 훤정과 호정과 삼봉을 생각하며
(舟次高郵湖憶圃隱萱庭浩亭三峯)
호수 이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 湖名聞已久
오늘 밤 호숫가에서 묵게 되었네 / 今夜宿湖邊
별빛과 달빛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 星月相凌亂
파도치는 물결 정말 끝이 없어라 / 波濤正渺然
벗님들이야 응당 잘 있겠지만 / 故人應好在
외로운 나그네는 잠 못 이루네 / 孤客不成眠
어느 날 매화 핀 창 아래에서 / 何日梅窓底
단란하게 이 시편 읊어볼거나 / 團欒誦此篇
1) 훤정(萱庭) : 염정수(廉廷秀, ?~1388)의 호이다. 자는 민망(民望)이다.
2) 호정(浩亭) : 하륜(河崙, 1347~1416)의 호이다. 자는 대림(大臨)이고,
순흥 부사(順興府使) 하윤린(河允麟)의 아들이다.
주석 : 성주이씨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의 누이는 염정수(廉廷秀)의 부인이다
염정수는 정숙공의 외증손자이며, 6世 삼장법사 의선의 5촌 조카이다.
대제학 염정수가 무진피화 때 염흥방의 동생이란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우왕과 최영을 두려워해, 누구도 감히 염정수의 죽음에 대해
어찌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제자였던 양천허씨 허조(許稠)가
혼자서 스승 염정수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 허조는 6世 조련의
장인 허공의 후손으로 훗날 조선 세종대왕 때 좌의정(정승)까지 오른 인물이다.
포은은 연일정씨 정몽주(鄭夢周)로 이성계와 친밀했으나 조선 건국에는 반대했다.
삼봉은 봉화정씨 정도전(鄭道傳)이며, 후에 8世 조준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친구인 이숭인을 멀리하다가 개국 후에 등을 때려 살해했다.
호정은 진주하씨 하륜(河崙)으로 8世 조준과 강원도 하조대(河趙臺)의
기록이 있으며, 하륜의 6촌 처남이 이숭인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희암공의 시권 중 목은 선생의 시에 차운하여 희암 대사도에게 바치다.
근체시 한 수는 유실되었다.(近體一首遺失)
희암공이 판천태종사의 신분으로 지장사에 주석하고 계실 적에 내가 김경지
선생과 함께 찾아가 뵈었더니, 공이 방장으로 맞아들여 차를 대접하였다.
이로부터 날로 달로 서로 어울려 노닐던 중에 변고를 당한 나머지 공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남주로 유락하여 서로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하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어떠할지 알 만한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공이 이생을 보내 시권을 보여주면서 나의 시를 요구하였는데, 그 시권은
대개 목은 선생과 유항 선생이 공과 창화한 시를 모은 것이었다. 이에 내가 삼가
그 운에 따라 시를 지어 희암 대사도 법좌 아래에 바쳤다. 배율 한 편에는 내가
오랫동안 상종하면서 함께 우환을 당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근체 한 수에는 공이
중원에서 노닐며 세상의 변고를 모두 겪은 다음에 만년에 동방으로 돌아와서
목은과 유항 등 고향의 여러 노인들과 함께 창화하는 즐거움을 서술하였다.
옛날의 감회에 젖으면서 지금의 일을 논하노라니 그 정서가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煕菴公之判天台宗事也住錫地藏寺崇仁與金先生敬之內謁公
迎入方丈設茶自是月日相從焉中罹變故公入山中余流落南州不相聞者久今茲會
于都下喜可知也一日公使李生袖詩徵余作蓋牧隱先生柳巷先生及公唱和之卷也
崇仁謹依韻錄呈煕菴大司徒法座下排律一篇敍余相從之久而同罹憂患之意近體
一首敍公游中原閱盡世變晚歲東還與卿之諸老若牧隱柳巷公相唱和之樂感舊論
今情見乎辭)
지장사는 일찍이 주지로 계시던 곳 / 地藏曾主席
처마 끊긴 곳에 창이 멋지게 트였었지 / 檐割好開窓
손과 처음으로 서로 대면했을 적에 / 與客初相謁
비록 나라도 감히 낮추지 않았으랴 / 雖吾敢不降
전생에 동쪽 선원(禪院)에 머무르면서 / 前身住東院
한입으로 서강의 물을 들이켜신 분 / 一口吸西江
법을 설할 때에는 꽃잎이 자리에 흩날리고 / 說法花飄座
시를 읊을 때에는 눈이 엉덩이에 들어왔네 / 吟詩雪入肛
밤에 차를 끓이노라면 솥 속에 솔바람 소리요 / 松風鳴夜鼎
봄에 술이 발효되면 단지에 노을빛 진액이라 / 霞液潑春缸
벼슬길은 원래 험악하기 그지없어 / 宦路由來險
참언이 어지럽게 일어나기 시작했네 / 讒言始亂哤
자기 혼자 과시하며 그저 혁혁하였을 뿐 / 自誇徒赫赫
남이 보기엔 그야말로 무능했을 따름이라 / 人視正悾悾
된서리에 잎이 진다고 다들 탄식하였는데 / 共歎霜摧葉
옥이 돌에 뒤섞일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 誰知玉雜矼
나는 빈 강물 위에 구름이 막막한 곳 / 江空雲漠漠
공은 고요한 산속에 대숲이 창창한 곳 / 山靜竹摐摐
유랑한 그 자취 부평초처럼 떠돌면서 / 浪迹萍同泛
시름 달래는 붓은 홀로 들 만하였다오 / 寬愁筆獨扛
은혜 입고 놀랍게도 두 번 살게 되었으니 / 蒙恩驚再世
보배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놔둘 수야 / 懷寶肯迷邦
유자(儒者)와 승려가 예전부터 종유했지만 / 儒釋從游久
공과 나 같은 관계는 다시 찾기 어려우리 / 如公我少雙
1) 희암공(煕菴公)의…바치다 : 시의 원 제목이 너무 길어 요약해 주고 원 내용은 아래에
본문으로 번역하였다. 이 시의 원운인 이색의 시는 국역 목은집 목은시고 제26권에
실려 있는 "장차 희암 대사도를 알현하기 위해……(將謁煕菴大司徒……)"이다.
2) 유항(柳巷) : 목은의 절친한 벗인 한수(韓脩, 1333~1384)의 호이다.
3) 한입으로…분 : 불법을 크게 깨달은 고승이라는 말이다. 동방의 유마거사(維摩居士)
로 일컬어지는 양주(襄州)의 방온거사(龐蘊居士)가 강서(江西)로 마조 도일(馬祖道一)
을 찾아가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不與萬法爲侶者是什麽)” 하고 묻자, 마조가 “그대가 한입으로 서강의 물을 다
들이마시면 그때 바로 그대에게 일러주겠다.(待汝一口吸盡西江水 卽向汝道)”라고
답하였는데, 거사가 이 한마디 말을 듣고는 바로 깨달았다는 말이 나온다.
(景德傳燈錄 卷8) (碧巖錄 第42則)
4) 옥이…알았으랴 : 희암(煕菴)도 이때 무함을 받고 함께 연루되어 결국에는 개경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다. 희암은 원 조정으로부터 삼장법사
(三藏法師)의 호를 수여받은 승려 순암(順菴)의 제자이며, 정숙공의 증손자로 본명은
조순(趙恂)이다. 희암이 간행한 법화삼매참조선강의 (法華三昧懺助宣講義)는
경주 기림사(祇林寺)에 있는데 보물로 지정되었다.
5) 창창(摐摐) : 서로 부딪쳐 울리는 것을 형용한 말인데, 당나라 두목(杜牧)의 만청부
(晩晴賦)에 “대숲이 외부를 둘러싸고 있음이여, 십만 장부가 갑옷과 칼날을 서로
부딪치면서 빽빽하게 진을 친 채 주위를 시위(侍衛)하고 있도다. (竹林外裹兮
十萬丈夫 甲刃摐摐 密陣而環侍)” 라는 표현이 나온다. (樊川集 卷1)
6) 시름…만하였다오 : 기상이 웅장하고 힘 있는 시문이 나왔다는 말이다. 사기 권7
항우본기(項羽本紀)에 “항우는 힘이 세서 세 발 달린 솥을 두 손으로 불끈 들 만하였다.
(力能扛鼎)” 라고 하였는데, 한유의 시에 “용 무늬 새겨 백 곡을 담은 세 발 달린 큰 솥을,
홀로 불끈들 만한 필력을 그대는 가졌다오. (龍文百斛鼎 筆力可獨扛)”라는 표현이 보인다.
(韓昌黎集 卷5 病中贈張十八)
7) 보배…수야 : 논어 양화(陽貨)에 “보배를 속에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그냥 놔둔다면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라는 말이 나온다.
주석 : 희암 대사도(煕菴大司徒)는 8世 조순(趙恂)으로 법명은 묘혜(妙慧)이다.
김경지는 안동김씨 김구용(金九容 1338~1384)으로 자는 경지(敬之) 호는
척약재(惕若齋), 육우당(六友堂)으로 김방경의 현손이다. 7世 조련의 장인인
김흔의 남동생 김순(金恂)의 증손자이자, 6세 삼장법사 의선의 문도인
급암(及菴) 민사평(閔思平)의 외손자이다.
지장사(地藏寺)는 8世 묘혜선사가 주석했던 개경 북쪽에 있던 절이다.
유항(柳巷)은 한수의 호이다. 7世 조굉, 조천미의 외사촌 한악의 손자이다.
이숭인은 정숙공의 외증손자이자, 6世 삼장법사 의선의 5촌 조카인
염정수(廉廷秀)의 처남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좌주 사암 선생이 물러가기를 청하여 남쪽으로 돌아가실 적에 시를 봉정하다
(座主思菴先生乞退南歸以詩奉呈)
은퇴 청하고 옥경을 나가는 맑은 가을날 / 乞退淸秋出玉京
자방의 공업 이루시고 자방처럼 떠나시네 / 子房功業子房行
푸른 산 가까이 좋은 곳에 터 잡은 초당 / 卜廬地近靑山好
대궐 생각에 밝은 해 때때로 쳐다보시리 / 戀闕時瞻白日明
만사가 옛 꿈 찾는 것과 같게 된 지금 / 萬事已同尋舊夢
급류에서 속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지 / 急流方可見眞情
책 싣고 수레 뒤를 따라가고 싶어라 / 載書甚欲從車後
이웃에서 목숨 붙이고 살 수 있도록 / 旁舍須敎著我生
1) 사암(思菴) : 도은의 좌주(座主)인 유숙(柳淑, 1324~1368)의 호이다.
2) 자방(子房)의…떠나시네 : 유숙이 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공민왕을 보필하여 누차
공신의 호를 하사받고서 정계를 떠나 은퇴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장량(張良)이 한
고조의 창업을 도와 개국 공신이 된 뒤에 미련 없이 속세를 떠나 양생의 도를 닦은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다. 자방은 장량의 자이다.
주석 : 사암(思庵) 유숙(柳淑 1316~1368)은 8世 조호의 외숙부이다.
1340년 과거에 급제하고, 후에 공민왕이 되는 강릉대군(江陵大君)을 시종해
4년간 원에 있었다. 1356년 기철(奇轍) 일당을 물리치는 데, 세운 공으로 안사공신
(安社功臣)이 되고, 홍건적이 2차 침입하자 왕을 안동으로 호종한 공으로 충근절의
찬화공신(忠勤節義贊化功臣)의 호를 받았고, 서령군(瑞寧君)에 봉해졌다.
우시중 홍언박(洪彦博)과 과거를 주관하여, 함양박씨 박실(朴實)이 장원이 되고
8世 조후의 육촌인 허시(許時)와 8世 조준의 동서인 영광김씨 김지(金祗)
성주이씨 이숭인(李崇仁), 봉화정씨 정도전(鄭道傳) 등을 급제 시켰다.
사암 유숙의 충직을 두려워하던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1368년 신돈에 의해
홍주(洪州)로 장류(杖流)되었다가, 12월 영광에서 신돈이 보낸 자에게
교살당하였다. 1376년(우왕 2) 11월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동짓날에 민망의 운을 써서 시를 짓고는 별운을 써서 재차 읊다
(至日用民望韻再賦用別韻)
쫓겨난 나그네 은혜 받고 돌아온 고향 / 逐客承恩返故鄕
더구나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명절임에랴 / 佳辰況復是生陽
후한 인심 어여뻐라 팥죽을 서로 나눠주니 / 豆糜相饋憐人厚
낮이 길어지는구나 자수하는 실이 늘어나니 / 綉線初添覺日長
버들은 시내가 차가워 일천 그루 생기가 없고 / 柳色溪寒千樹澁
매화는 창이 따스해 하나의 가지 향기로워라 / 梅花窓暖一枝香
대궐의 임금님 의장(儀仗) 따르는 꿈에서 깨어 / 夢驚雙闕隨仙仗
기쁨 가득 어버이에게 축수의 술잔을 올리노라 / 喜滿高堂薦壽觴
1) 민망(民望) : 염정수(廉廷秀, ?~1388)의 자이다.
2) 낮이…늘어나니 : 동지 이후로는 낮 시간이 길어져서 자수하는 궁중 여인들의
하루 일거리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동지 이틀 뒤의 소지(小至)를
읊은 두보의 시에 “수놓는 오색 무늬 옷감에는 가는 실이 더 늘어나고, 갈대의 재
채운 여섯 관에는 날리는 재가 들썩거리네. (刺繡五紋添弱線 吹葭六琯動飛灰)”라는
표현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18 小至)
주석 : 정숙공의 외증손자 대제학 염정수의 부인은 이숭인의 누이이다.
8世 조문신과 염정수, 이숭인, 박상충, 전녹생등은 이인임을 함께 탄해했는데,
최영이 가혹하게 장을 치고 국문하기를 매우 참혹하게 하여, 박상충과 전녹생은
유배를 가던중 사망하였다.
도은집 제2권 / 시(詩)
여태허가 좨주에게 화답한 시에 차운하다(次如太虛和祭酒韻)
일찍이 육관으로 암자의 간판을 삼으신 분 / 曾將六觀作菴顔
오묘한 뜻 초연하니 되돌아오게 할 수 있나 / 妙義超然不可還
재 파하면 차를 사러 가끔 저자에 들어가고 / 齋罷買茶時入郭
읊조리다 붓을 놓고 누워서 산을 바라본다네 / 吟餘閣筆臥看山
가련해라 도성 먼지 속에서 분주하며 노곤한 이 몸 / 軟紅奔走憐吾倦
부러워라 허백의 경지에서 소요하며 한가한 그대 / 虛白逍遙羡子閑
언젠가 흥이 나면 양촌과 함께 찾아가서 / 欲與陽村乘興去
그대로 연사의 인연 좇아 삼간 빌리고 싶어라 / 直從蓮社借三間
1) 육관(六觀) : 불교에서 말하는 별교(別敎) 보살의 6종 관법(觀法)을 가리킨다.
첫째는 주관(住觀)으로 십주위(十住位) 중에서 공관(空觀)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행관(行觀)으로 십행위(十行位) 중에서 가관(假觀)을 닦는 것이고,
셋째는 향관(向觀)으로 십회향위(十回向位) 중에서 중관(中觀)을 닦는 것이고,
넷째는 지관(地觀)으로 십지위(十地位) 중에서 중관을 닦아 불지(佛智)를 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무상관(無相觀)으로 등각위(等覺位) 중에서 중관을 닦아 성상(性相)이
본공(本空)한 것을 아는 것이고,
여섯째는 일체종지관(一切種智觀)으로 묘각(妙覺)의 불과(佛果)에서 중도의 관법을
이루는 것이다.
2) 오묘한…있나 : 승려인 여태허(如太虛)가 추구하는 뜻이 세상을 초월하여 워낙 오묘한
만큼 그를 제아무리 속세로 되돌아오게 하려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뜻의 해학적인
표현이다. 옛날에 한유가 승려를 환속시켜 유자로 만들고 싶다는 시를 지은 유명한
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가 승려를 전송한 시 (송영사(送靈師))에
“지금 그대를 우리의 도로 끌어들여, 삭발한 머리에 선비의 관을 씌워주고 싶구려.
(方將斂之道 且欲冠其顚) 라는 말이 나온다. (韓昌黎集 卷2) 여태허는 휴상인(休上人)
으로, 천태종(天台宗) 판사인 고승 나잔자(懶殘子)의 제자인데, 목은문고 제8권에
"휴 상인에게 준 글(贈休上人序)" 이 수록되어 있다.
3) 허백(虛白) : 청정무욕의 경지를 뜻하는 말인데, (장자) (인간세(人間世))의
“텅 빈 방에서 하얀 광채가 뿜어 나온다. (虛室生白)”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4) 연사(蓮社) : 유자와 승려의 교분을 뜻하는 말이다. 진대(晉代)에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고승 혜원(慧遠)이 승속의 18현과 함께 염불 결사를 하였는데,
그 절의 못에 백련이 있었으므로, 백련사(白蓮社)라고도 칭한다.
(蓮社高賢傳 慧遠法師)
주석 :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의 제자인 휴상인(休上人)이 좨주(祭酒)에게
화답한 시이다. 좨주(祭酒)는 성규관에 두었던 종 3품의 관직명으로, 회동이나
향연 때 그 가운데에서 존장자가 술을 땅에 부어 지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
다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의 관직이 된 것이다.
주석 : 양촌(陽村)은 안동권씨 권근(權近)의 호이며. 배위는 고성이씨 이강(李崗)의
따님이다. 8世 조준의 배위 고성이씨 이숭의 따님과 사촌지간이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보련사 주지에게 부치다(寄寶蓮住持)
보련사 안에 청정한 낙이 있는데 / 蓮社有淸樂
도인이 밖에서 구할 게 있으리오 / 道人無外求
머리를 돌리니 저녁 해 뉘엿뉘엿 / 回頭日欲暮
산의 푸른 이내 멀리서 아른아른 / 山翠遠浮浮
주석 : 이숭인의 다른 시 "보련에게 주다(贈寶蓮)" 에서 보련은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의 제자인 보련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련사(寶蓮持)는 충북 충주시
노은면에 있던 큰 사찰이었으며, 교종 18사 중 하나로 충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보련사는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봉황리 마애불과 더불어 대표적인
고구려의 유적지 중에 하나로 꼽힌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염 태부의 시에 차운하다 2수 (次廉太傅韻 二首)
꽃향기 모락모락 번뇌에 잠기게 해 / 花氣濛濛惱我情
새벽보다 대낮의 잠이 배나 더 달아 / 嘉眠淸晝倍殘更
산새가 일부러 으슥한 서재에 찾아와서 / 山禽故向幽齋裏
가지가지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 발표하네 / 啼送新腔種種聲
산이 있는데 구태여 산수화를 감상할까 / 有山不用開圖畫
일이 없는데 번거롭게 바둑 둘 것까지야 / 無事何煩下奕棋
한 조각 옛사람 마음만은 아직 내려놓지 못해 / 一片古心降未了
매번 시어를 가지고 남의 턱 빠지게 한다나요 / 每將詩語解人頤
1) 일이…것까지야 :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회비(淮肥)까지
진군하여 동진(東晉)의 서울이 진동하며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정토대도독
(征討大都督)에 임명된 사안(謝安)이 조카인 사현(謝玄)을 보내 격파하게 하고는
자신은 손님을 상대로 담소하며 태연히 바둑을 두어 흉흉한 인심을 진정시키면서
승첩의 보고를 기다렸던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도은이 이 고사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태평 시대라서 옛날 사안처럼 굳이 바둑을 둘 필요도 없다고
해학적으로 말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뜻이 이 속에 함께 들어 있다고 하겠다.
2) 한 조각…한다나요 : 옛사람은 서한(西漢)의 학자 광형(匡衡)을 가리킨다. 그가 시경에
조예가 깊어서 “해설을 하기만 하면 사람의 턱을 빠지게 한다.(匡說詩 解人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턱을 빠지게 한다는 것은 고민하던 사람들의 안색이 펴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통쾌하게 웃도록 만든다는 말이다. (漢書 卷81 匡衡傳)
주석 : 염태부(廉太傅)의 태부(太傅)는 고려시대에 왕자, 부마(駙馬),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4녀가 공민왕의 제 5비로 신비염씨(愼妃廉氏)이다.
태부(太傅)는 곡성부원군 염제신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파주염씨대종회.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