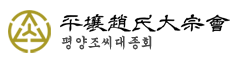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시(詩) 3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김약재를 전송하며 경지이다. (送金若齋 敬之)
가을 물 맑기도 한 예성강 항구 / 禮成港口秋水淸
부상의 아침 햇살 밝게 쏟아지네 / 扶桑初日向人明
만 섬을 싣고 강남으로 떠나는 거대한 배 / 樓船萬斛江南去
사자는 말을 타고 땅을 밟는 것 같으리라 / 使者還如乘馬行
1) 김약재(金若齋) : 호가 척약재(惕若齋)인 김구용(金九容, 1338~1384)을
가르킨다 경지(敬之)는 그의 자(字)이다.
주석 : 선안동김씨 김구용은 6世 조연수의 외손자 해평윤씨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윤진(尹珍) 사위이고, 부친은 상락군(上洛君) 김묘(金昴)이며 모친은
6世 삼장법사 의선과 교류가 있었던 문도인 민사평(閔思平)의 따님이다.
외할아버지 급암 민사평의 글들을 모아 공민왕 11년(1362년) 급암시집
(及菴詩集)을 편찬하였으며, 본인 문집 척약재집(惕若齋集)이 있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산으로 돌아가는 여 스님을 전송하며(送如師還山)
여 스님은 소산하여 기심(機心)을 잊으신 분 / 如公蕭散已忘機
휘주하며 청담할 때면 옥설이 분분하다나요 / 揮麈淸談玉屑霏
세모에 가야산은 높이 누울 만한 곳인지라 / 歲暮琊山可高臥
나는 백운과 짝하여 지팡이 짚고 가신다오 / 一枝筇杖白雲飛
1) 휘주(揮麈)하며…분분하다나요 :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마치 옥가루가 분분하게 날리며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말이다. 휘주는 고라니 꼬리털(麈尾)을 매단 불자(拂子)를 손에 쥔다는 뜻인데,
먼지떨이처럼 생긴 그 불자는 위진(魏晉) 시대 때 청담을 즐기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으며, 나중에는 선종(禪宗)의 승려들도 애용하였다.
주석 : 제목에 나오는 여 스님은 여태허로, 천태종(天台宗) 판사인 고승 나잔자
(懶殘子)의 제자이다. 나잔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가야산(伽琊山)을 바라보며 우스개로 짓다(望琊山戲賦)
산허리엔 구름 감고 산머리엔 눈을 이고 / 山腰雲氣山頭雪
절간들이 높고 낮게 아득히 먼 저 산속에 / 蘭若高低縹渺中
하지만 산신령이 부처만 섬기진 않는가봐 / 未是山靈專事佛
몇 봉우리가 선비의 집을 호위하는 것을 보면 / 數峯來繞一儒宮
주석 : 가야산에 있는 여태허를 생각하며 지은 시. 가야산은 이숭인의
본적인 경북 성주군에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가야산(伽琊山)에 노닐며 식곡에게 증정하다(游琊山呈息谷)
봄 산에 꽃나무 흐드러지게 터지는 때 / 春山花木政紛披
사흘 동안 나귀 타고 술 취해 시 읊었네 / 三日騎驢醉賦詩
속세에 대해 초연함을 단연 자부하지만 / 在俗超然端自負
다시 인가받아야지 우리 스님 계시니까 / 更須印可賴吾師
주석 : 이숭인의 절친인 여태허 스님이 가야산에 있다는 표현.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 나잔자의 제자인 여태허
나잔자는 휴상인이라고도 하며 위의 시와 연계된 시라 할 수 있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여태허가 구일에 지은 시에 차운하다(次如太虛九日韻)
산천의 빼어난 경치 여기에 또 맑은 가을 / 山川形勝更淸秋
병든 나그네 무료하게 그저 누워서 노니노라 / 病客無聊只臥遊
문밖에 백의를 누가 알아서 보내줄까 / 門外白衣誰解送
울 동쪽 노란 국화꽃도 거두지 못했는데 / 籬東黃菊不曾收
가을 하늘 아스라이 치솟은 삼봉 / 三峯渺渺聳高秋
산 정상에서 (원유)를 읊는 시인 / 峯頂騷人賦遠遊
오늘 표령하지만 옛날 모습은 여전 / 今日飄零猶故態
황천의 노안 언제나 거두어주실까 / 皇天老眼幾時收
삼봉(三峯)은 증오(曾吾)이다.
명절을 맞아 벗에 대한 감회를 스스로 금할 수가 없었다.
유안의 닭과 개도 흰 구름 속에 있었는데 / 劉安雞犬白雲秋
신선의 한만유가 괴이할 것이 뭐 있으랴 / 曾怪神仙汗漫遊
도은의 서재가 낮고 작다 하더라도 / 縱是陶齋低且小
주인의 호기를 주체하지 못하겠네 / 主人豪氣未能收
송도에서 가장 좋은 일 년 중 가을 / 松都最好一年秋
소쇄한 계산이 객에게 유람을 권하네 / 瀟洒溪山勸客遊
삼현의 모임 얼마나 풍류가 넘쳤을까 / 想得風流三峴會
꽃 앞에 떨어진 모자 옥섬이 주웠을 테니 / 花前落帽玉纖收
1) 여태허(如太虛)가…차운하다 : 도은집 권2에 "여태허 시에 차운하여 좨주 선생에게
올리다가" 있는데, 원제는 “여태허가 와서 말하기를, ‘삼현(三峴)의 제선생(諸先生)
으로, 가령 권 좨주(權祭酒)와 유 장원(柳狀元)과 이 사인(李舍人)과 이 겸박(李兼博)
같은 분들은 창화(唱和)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고는, 좨주 선생이 지은 당률(唐律)
2수를 비롯해서 그가 구일(九日)에 지은 시 4수 및 좨주 선생의 방문을 받고 화답한
시 1수를 암송하였다. 이에 내가 그 운에 따라 붓을 달려 좨주 선생에게 봉정(奉呈)하는
한편, 유 장원과 이 사인과 이 겸박에게 편지를 보내 ‘나의 거소(居所)가 벽루(僻陋)해서
사문(斯文)의 모임에 끼일 수 없겠다.’라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다행히 허락을 받았다.”
이다. 이 시는 위 제목 중의 그가 구일에 지은 시 4수’에 차운한 시에 해당한다.
2) 문밖에…못했는데 : 도은이 옛날의 도연명(陶淵明)과는 다르게 술도 마시지 못한 채
그저 쓸쓸하게 중양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말이다. 도연명이 9월 9일 중양절에 좋아하는
술도 없이 울타리 가의 국화꽃을 따면서 하염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때마침
자사(刺史)인 왕홍(王弘)이 보낸 백의(白衣)의 사자(使者)가 술을 가지고 왔으므로,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갔다는 고사가 전한다. (宋書 卷93 陶潛列傳) 도연명의
음주(飮酒) 20수 중의 다섯 번째 시에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꽃을 따다가, 우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명구가 나온다. (陶淵明集 卷3)
3) 원유(遠遊) : 전국 시대 초나라 굴원(屈原)이 소인들의 참소를 당해 조정에서 축출된
뒤에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자 선인(仙人)과 함께 천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소요하는
내용으로 지은 우언체(寓言體)의 사부(辭賦)이다. 초사(楚辭) 권5에 실려 있다.
4) 오늘…여전 : 삼봉 정도전이 지금 비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긴 하였지만,
그 기상과 패기는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한유(韓愈)의 시에 “공작새는
난새와 봉황의 친구인데, 어느 해에 여기에 와 머물게 되었는고. 떠돌아다니다가 옛날
모습 잃어버린 채, 멀리 떨어진 고향 생각에 항상 잠겨 있다네.(穆穆鸞鳳友 何年來止茲
飄零失故態 隔絶抱長思)”라는 구절이 있는데, 도은이 이 내용을 슬쩍 반대로 바꿔서
절묘하게 인용하였다. (韓昌黎集 卷7 奉和武相公鎭蜀時詠使宅韋太尉所養孔雀)
5) 황천(皇天)의…거두어주실까 : 하늘이 노련한 안목으로 시비(是非)와 정사(正邪)를
판별하여 언제쯤이나 고난에 처한 삼봉을 구제해 줄 것이냐는 말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혜자가 야윈 흰 망아지 타고서, 단지 병든 몸 안고 계곡으로 돌아가네. 황천은
노안이 없는 것일까, 빈 골짜기에 이런 현인을 머물게 하다니.(惠子白駒瘦 歸溪唯病身
皇天無老眼 空谷滯斯人)”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역시 도은이 약간 변용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8 送惠二歸故居)
6) 증오(曾吾) :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다.
7) 유안(劉安)의…있었는데 :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승천할 적에 그 집의 닭과 개도 그릇에 남아 있던 단약(丹藥)을 핥아
먹고 하늘에 올라가서 “개는 천상에서 짖고 닭은 구름 속에서 울었다.
(犬吠于天上 鷄鳴于雲中)” 라는 전설이 전한다. (論衡 道虛)
8) 한만유(汗漫遊) : 속세를 초월한 신선의 유람을 말한다. 옛날 진(秦)나라 노오(盧敖)가
북해(北海)에서 노닐다가 선인(仙人)인 약사(若士)를 만나 함께 벗으로 노닐자고
청하자, 약사가 “나는 구해(九垓) 밖에서 한만(汗漫)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곧바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구해(九垓)는 구천(九天)을 말한다. (淮南子 道應訓)
9) 삼현(三峴)의 모임 : 삼현에서 권 좨주(權祭酒)와 유 장원(柳狀元)과 이 사인(李舍人)과
이 겸박(李兼博) 같은 분들이 모여서 시를 창화(唱和)하였다. (국역 도은집 제2권
여태허 시에 차운하여 좨주 선생에게 올리다)
10) 꽃…테니 :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9월 9일에 정서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군(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국화주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서 측간에 가자, 환온이
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손성(孫盛)에게 희롱하는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는 곧장 멋지게 대응하는 글을 지어서
좌중을 경탄하게 했던 고사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世說新語 識鑑) 옥섬
(玉纖)은 섬섬옥수(纖纖玉手), 즉 가냘프고 고운 미인의 손을 말한다.
주석 :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 나잔자의 제자인 여태허와 도은 이숭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 즉 익재 이제현, 금압 민사평, 가정 이곡, 목은 이색, 유항 한수,
도은 이숭인으로 이어지는 불교와 유학자들의 세대를 이은 교류를 알 수 있다.
도은집 제3권 / 시(詩)
보련에게 주다(贈寶蓮)
나잔이 서거한 지 어언 몇 성상 / 懶殘逝矣幾星霜
천태의 길 돌아보면 아득하기만 / 回首天台路渺茫
게다가 보련도 만나기 어려우니 / 又是寶蓮相見少
꿈속에 자꾸만 선방을 찾겠구려 / 不禁淸夢覓禪房
1) 나잔(懶殘) : 천태종(天台宗) 판사(判事) 나잔자(懶殘子)를 말한다.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절친하였다.
주석 :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 나잔자를 그리워하는 이숭인이
나잔자의 제자 보련에게 준 시.
도은집 제3권 / 시(詩)
양산으로 가는 소년 김자지를 전송하면서 아울러 양산의 장로에게
소식을 전하다 (送金少年自知之陽山兼柬陽山長老)
티끌 없이 정결한 양산의 사원 / 陽山寶地淨無塵
재공이 주인이니 얼마나 좋아 / 好箇齋公作主人
그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만 / 邇來消息平安未
한 봄 넘도록 그리워한 정 알려드리리다 / 爲報相思過一春
김생은 연소해도 기예가 이미 능숙하니 / 年少金生藝已工
뒷날 시험장에서 뛰어난 공을 거둘 터 / 他時場屋捷奇功
우리 집 돈견은 무엇 하는 놈인지 / 吾家豚犬何爲者
죽어라 책만 본다고 아비를 비웃으니 / 勤苦看書笑乃翁
1) 재공(齋公) : 원래는 도사(道士)의 존칭이나, 여기에는 고승(高僧)의 뜻으로 쓰였다.
2) 돈견(豚犬) : 못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자기 아들을 남에게 낮추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대(五代) 후량(後梁)의 태조(太祖) 주온(朱溫)이 후당(後唐)의 태조
이극용(李克用)이 죽은 틈을 타서 공격했다가 이극용의 아들인 장종(莊宗) 이존욱
(李存勗)에게 패하자, “자식을 낳으려면 이아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극용은 죽지
않았구나. 내 자식과 같은 경우는 돼지나 개일 뿐이다.(生子當如李亞子 克用爲不亡矣
至如吾兒豚犬耳)”라고 탄식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資治通鑑 卷266 後梁紀1)
아자(亞子)는 이존욱의 어렸을 때의 자이다.
주석 : 연안김씨 김자지(金自知1367~1435)는 자는 원명(元明) 호는 일계(逸溪)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7世 조윤선의 첫째 사위이다. 9남 1녀를 낳았다.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등을 거쳐 세종 때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했다. 학문이 뛰어나 음양(陰陽), 복서(卜筮), 천문, 지리, 의약,
음률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다. 유항 한수도 "김소년 원명의 시권에 짓다"
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도은집 제5권 / 문(文)
배열부전(裵烈婦傳)
열부의 성은 배씨(裵氏)요, 이름은 모(某)이니, 경산(京山) 사람이다. 부친은
전(前) 진사(進士) 중선(中善)이다. 비녀를 올린 뒤에 사족(士族) 이동교(李東郊)
에게 시집가서 집안일을 잘 다스렸다. 경신년(1380, 우왕6) 가을 7월에 왜적
(倭賊)이 경산에 육박하여 온 경내가 소란스러웠는데도 감히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이때 이동교는 합포 (合浦)의 원수(元帥) 군막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적의 기마병이 열부가 사는 마을로 돌진해 들어왔다. 열부가
젖먹이를 안고 달아 나니 왜적이 추격하여 강까지 왔다. 열부가 강물이
바야흐로 불어나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는 젖먹이를 강기슭에 두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왜적이 화살을 메겨 활을 한껏 당기고 겨누면서 말하기를
“네가 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니, 열부가 왜적을 돌아보며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빨리 나를 죽이지 않느냐. 내가 어찌 적에게 몸을
더럽히겠느냐.”라고 하였다. 왜적이 활을 쏘아 어깨를 맞혔는데, 두 번 쏘아서
두 번 모두 맞히니 마침내 강물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왜적이 물러난 뒤에
집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지내었다. 체복사(體覆使) 조공 준(趙公浚)
이 그 일을 위에 보고하여 마을의 문에 정표(旌表)하였다.
도은자 이숭인(陶隱子 李崇仁)은 말한다.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주부가 되어서는 주부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큰 환란을 당해서는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배씨는 일개 부인의 신분으로 죽음을 보기를 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며, 적을
꾸짖은 말을 보면 비록 옛날의 충렬지사(忠烈之士)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일찍이 남쪽에서 노닐면서 소야강(所耶江)을 건넌 적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열부가 사절(死節)한 곳이었다. 그때 여울의 물은 슬피 울
고 숲의 나무도 소슬(蕭瑟)하여 사람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하였다.
아, 얼마나 열렬하였던가.
나의 문사(文辭)는 본디 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열부가 한번 목숨을
던진 것이야말로 명교(名敎)와 (名敎)와 크게 관련이 있는 일인 만큼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뒷날 중국의 인사들이 동방에 이런 열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응당 경연(景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부디 이 내용을
기록해 주었으면 한다.
- 경연의 성은 두(杜)요, 이름은 호(浩)이니, 하남(河南) 개봉(開封) 사람이다.
내주(萊州)의 공관에서 해후하였는데, 작별할 즈음에 열부의 전(傳)을 적어서
가져가기에 내가 그 글 뒤에 이와 같이 제(題)하였다. -
1) 비녀를 올린 뒤에 : 성년(成年)의 예식을 행했다는 말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여자는 15세에 비녀를 올리고, 20세에 시집을 간다.(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라고 하였다.
주석 1 : 1380년 경상도에 왜구가 침략하자 8世 조준은 체복사가 되어 왜구를 물리친 후에
지역민을 위무하고, 성주배씨 배중선(裴仲善)의 딸의 의로운 죽임을 기리기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야강(所耶江 현 성주군 이천) 근처에 열녀문을 세워주었다. 그후에
이숭인이 이 곳을 지나며 배열부전 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고려사에는 열녀전으로,
도은집에는 배열부전(裵烈婦傳)으로, 세종 때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는
열부입강(烈婦入江)으로, 동문선(東文選) 제101권에는 배열부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일 앞선 기록에는 배중선(裴仲善) 버금중(仲)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이숭인의 도은집에는 배중선 이름이 가운데 중(中)으로 기록되어 있다. 배중선(裴仲善)
은 공민왕 11년 동진사에 합격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형제들 이름도 배중보(裵仲甫),
배중유(裵仲有), 배중륜(裵仲綸) 등은 모두 공민왕 때 과거에 합격하였다.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裵仲孫)과 같은 돌림자(버금중 仲)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배부열전의 배씨의 부친 배중선(裴仲善)과 삼별초 배중손은 혈족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은 성주이씨로 목은 이색의 제자이고, 8세 조호(趙瑚)와
동문으로, 조호가 12살 많다. 이숭인의 누이는 정숙공의 외증손자 염정수(廉廷秀)의
부인이다.
주석 2 : 성주이씨 도은 이숭인은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 부친은 이원구(李元具)이며,
모친은 언양 김씨 언양김씨 김경덕(金敬德)의 딸이다. 이숭인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문사(文辭)가 전아(典雅)하여, 이색은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구할지라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주석 3 : 8世 조준이 37세 때인 1382년 (우왕 8년) 경상도 체복사로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고, 피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무하고,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일들은 기록으로 남겨,
배씨 부인의 기상을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8世 조준은 이외에도
대구 수성현 사람 조희참(曹希參)의 효행을 기록하여 고려사 효우전(孝友傳)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대구읍지(大丘邑誌)에도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했고,
영산신씨(靈山辛氏) 낭장(郞將) 신사천(辛斯蕆)의 딸이 부친을 살해한 왜구를 구타하다가
살해당한 기록을 고려사 효우전에 기록하였고, 후에 동국여지승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 영산신씨 열효신씨지려비석(烈孝辛氏之閭
碑石)을 세워 신사천과 딸의 효행을 기려왔는데, 일제 때 회손된것을 1982년 찾아내어
비각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문화재자료 제 183호이다.
신사천의 아들 신열(辛悅) 태종 때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등을 지냈는데 7世 조덕유의
첫째 사위 문화류씨 유량(柳亮)이 추천이었고, 이후에 외교관으로 역할을 하는 등 공적이 있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도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파주염씨대종회.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