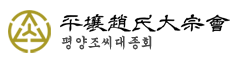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시(詩) 1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양촌선생문집 제2권 / 시(詩)
대제(待制) 염민망(廉民望)에게 부치다.
웅제하던 그 시절 그대와 함께 / 當時應製與君俱
날마다 먼 길을 나란히 갔네 / 每日長途並轡驅
뜻밖에 황종이 버림을 받아 / 豈意黃鐘遭廢棄
졸한 솜씨 호로를 그리다니 원 / 獨將拙手畫葫蘆
1) 황종(黃鐘) : 십이율(十二律)의 하나인데, 곧 십이율의 기본음이 된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중동(仲冬)의 달은 율이 황종에 해당한다.” 하였다.
2) 호로(葫蘆) : 의양호로(依樣葫蘆)의 약칭으로, 모방(模倣)을 비유한 말이다.
도곡(陶穀)의 시에 “우습도다 한림 도 학사는 해마다 똑같이 호로를 그린다오.
(堪笑翰林陶學士 年年依樣畫葫蘆)” 하였다.
주석 :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3남이 염정수이다. 자는 민망(民望) 호는 훤정(萱庭)이다.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고, 1383년(우왕 9) 지신사(知申事)로서 한때
인사행정을 맡았으며,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호복(胡服: 원나라의 복식)을 폐지하고
중국의 제도를 따르자고 건의하였다. 저서에 훤정집(萱庭集)이 있다. 우왕과 최영이
형 염흥방을 제거할 때 함께 살해되었다. 염정수의 배위는 성주이씨 이원구(李元具)의
따님으로 도은 이숭인의 누이이다. 1383년 4월 지신사(知申事) 염정수(廉廷秀)가
우홍명(禹洪命) 등 99명, 명경(明經) 6명을 뽑았다.
염정수 제자로는 광산김씨 김한로(金漢老 양녕대군 장인), 부유심씨 심효생(沈孝生
개국공신, 이방석 장인), 태종 이방원(李芳遠), 해주정씨 정역(鄭易 효령대군 장인)
등을 뽑았다.
주석 : 권근(權近, 1352~1409)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자·문신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사숙(思淑), 호는 양촌(陽村),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양촌 권근은 6世 조련의 사위 권렴(權廉)의 사촌인 권희(權僖)의 아들이다. 권근의
배위는 고성이씨 이숭의 따님으로 8세 조준의 배위 고성이씨 이강의 따님과 사촌
지간이며, 권근의 3남 권규(權跬)와 9世 조대림은 동서지간으로 태종의 사위들이다.
9世 조대림의 따님이 순흥안씨 안진(安進)과 혼인하여 낳은 안탁(安擢)의 사위가
권적(權勣)으로, 권근의 5대손이며, 권적의 손자가 행주대첩의 권율(權慄)장군이다,
권율의 사위가 경주이씨 백사 이항복(李恒福)으로 오성과 한음 중에 오성대감이다.
9世 조대림의 외손자 안탁(安擢)의 후손이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중장)으로
한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도마 안중근(安重根)이다.
양촌선생문집 제2권 / 시(詩)
병중에 염 고사(廉庫使) 정수(廷秀)에게 답하다.
온 동산 도리화는 비 뒤에 거의 지고 / 一園桃李雨餘稀
병중에 봄 지나니 허리띠가 줄어졌네 / 病裏經春帶減圍
베갯머리에 철을 느껴 시름 다시 무거운데 / 枕上感時愁更重
문 앞에 인적 없어 일은 되려 적어졌네 / 門前屛迹事還微
뭇봉우리 나무라네 물이 든 이 마음을 / 攢峯竦誚心猶染
삼경이 묵어가도 객은 어이 못가는고 / 三徑將蕪客未歸
차라리 세상의 버림을 받을망정 / 世上寧爲人所棄
형해(形骸)에 얽매어 그른 일을 범해서야 / 莫因形役冒非機
1) 뭇봉우리 나무라네 : 공치규(孔稚珪)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서 나온 말인데,
은거하다가 변심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주옹(周顒)을 나무란 것이다.
2) 삼경(三徑) : 은사(隱士)의 문전을 말함. 한(漢) 나라 장후(蔣詡)가 일찍이 집앞의
대나무 아래에다 세 길을 내고서 다만 친구 양중(羊仲)ㆍ구중(求仲)과 상종했다 한다.
주석 : 고사(庫使)는 고려 시대 왕실 관련 재정기관의 하나로 내고사, 내고부사가
있었으며 종6품 관직이다.
양촌선생문집 제2권 / 시(詩)
야당(埜堂) 허 총랑(許摠郞) 금(錦) 의 시에 차운하다. 2수
먼지 쓸고 향불 핀 조촐한 서실 / 書室焚香淨掃塵
어느 때 여기 와 이웃을 맺지 / 里仁何日托比隣
의술을 배울 생각 많았지마는 / 幾回欲學醫民術
내 재주는 제세 인물 못 되는 것을 / 愧我才非濟世人
자주 : 총랑이 의술에 통하였다.
명리에 마음 팔려 온 세상이 급급한데 / 世利紛紛逐馬塵
야당에 높이 누워라 이웃 없음 어떠하리 / 埜堂高臥善無隣
다른 날 창생 위해 기용되고 말 것이니 / 他時應爲蒼生起
동산이 이분에게 전속이란 말은 마소 / 莫道東山屬此人
1) 창생 위해…말은 마소 : 다시 나라에 중용될 것이라는 뜻이다. 진(晉) 나라 사안(謝安)이
젊어서부터 명망이 높았는데 조지(朝旨)에 응하지 않고 회계(會稽)에 우거(寓居)하여
동산(東山)에서 기생을 데리고 우유자적(優遊自適)하니, 고영조(高靈祖)가 말하기를
“안석(安石 사안의 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창생을 어찌하리.” 하였는데, 사안은 뒤에
등용되어 재상에 이르렀다.
주석 : 양천허씨 야당 허금은 6世 충숙공(忠肅公) 조련(趙璉)의 장인 허공(許珙)의 후손이다.
8世 조준의 벗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허금(許錦)의 5대손이 동의보감
(東醫寶鑑)의 저자 허준(許浚)이다. 허금의 배위는 원주원씨 원송수(元松壽)의
따님으로 원송수는 6世 조련의 사위인 권렴의 5녀와 혼인하였다. 즉 원송수는
6世 조련의 외손녀 사위이다. 허금은 성품이 조용하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은퇴한 뒤에는 사재를 털어 약을 사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호하였다.
50살이 못 되어 사망하니, 사림(士林)에서 크게 애석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양촌선생문집 제2권 / 시(詩)
조밀직(趙密直) 휘는 사민(思敏) 만사
젊어서 충의로 성명 떨치어 / 早年忠義擅聲名
재상이 되어라 상기도 청춘 / 寵拜鴻樞髩尙靑
어려운 때 원묘의 신주 옮기니 / 急難能遷原廟主
자주 : 1361년 신축년 창졸한 때에 조사민이 감문위호군(監門衛護軍)이
되어 효사관(孝思觀)의 신주를 강화로 옮겼다.
공훈은 큰 종에 새겨지리다 / 殊勳應溢景鍾銘
성대에 정승 될 것 기했더니만 / 方期盛代親調鼎
오늘밤 뜻밖에 별이 지다니 / 豈意今宵忽殞星
상엿줄 잡은 사람 뉘 가장 슬프던가 / 執紼行中誰痛甚
남녘 이웃 옛친구 눈물 자주 떨어지네 / 南隣舊客涕頻零
1) 원묘(原廟) : 한 혜제(漢惠帝)가 숙손통(叔孫通)의 말을 받아들여 원묘를 만들었다.
원(原)은 재(再)의 뜻인데 고묘(高廟) 외에 다시 하나의 고묘를 세운 것이다.
(史記 叔孫通傳)
주석 : 7世 평양군(平陽君) 조충신의 3남인 8世 조사민(趙思敏 ?~1378년 6월)은
대동보에 출생년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 저자 권근이 1352년 생이고
남녘 이웃 옛친구라고 하였으니 1350~1354년 사이에 출생했다 할 수 있겠다.
원문 번역자는 원묘(原廟)를 혜제로 설명했으나, 1377년 건립되어 공민왕비인
노국공주의 원찰(願刹)이 된 광통보제선사(廣通普濟禪寺)의 비명(碑銘)에
8世 조사민이 기록되어 있으니, 원묘(原廟)는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있는
사찰인 광통보제선사라고 할 수 있겠다.
광통보제선사의 비명은 목은문고 14권에 기록되어 있다.
양촌선생문집 제3권 / 시(詩)
민망(民望)이 부쳐 준 시에 차운하다.
지는 잎 우수수 뜨락에 가득한데 / 蕭蕭落葉滿中庭
오랜 장마에 사립문 두드리는 사람 없네 / 久雨來人絶叩扃
적막한 시 회포를 어디다 펴보리 / 寂寞詩懷何處展
탑 위에 높이 앉아 술병이나 기울이세 / 擬從高榻倒長甁
한가한 날이라서 독우도 마심직해 / 閑日惟堪喚督郵
벗님네 아니 오니 뉘랑 함께 수작할꼬 / 賓朋不至與誰酬
공 문거(孔文擧)의 동이엔 좋은 술 가득하리 / 尙知文擧尊盈酒
좌상에선 행여 나를 용납해 주려는지 / 座上還能許我不
1) 독우(督郵) : 평원 독우(平原督郵)의 준말로 나쁜 술을 가리킨다. 진(晉) 나라때 환온
(桓溫)의 속관(屬官)에 술맛을 잘 아는 주부(主簿)가 있었는데, 맛이 좋은 술은 청주
종사(靑州從事), 나쁜 술은 평원 독우라 하였다. 이는 청주 땅에는 제군(齊郡)이
있었고 평원 땅에는 격현(鬲縣)이 있었는데 제(齊) 자에서는 배꼽(臍)의 뜻을, 격(鬲)
자에서는 명치(膈)의 뜻을 따, 좋은 술은 곧장 배꼽 밑으로 내려가고 나쁜 술은 명치
위에 있어 내려가지 않는다는 은어(隱語)로 쓴 것이다.
2) 공문거(孔文擧)의…가득하리 : 문거는 후한(後漢) 때의 명사 공융(孔融)의 자(字).
그는 요동(遼東)으로 피난하여 북해(北海)에 살면서 시주(詩酒)로 세상을 보냈는데,
일찍이 이르기를 “좌상에는 언제나 손이 가득하고 술동이엔 언제나 술이 가득하면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하였다. (三國志 魏志 孔融傳)
주석 :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막내아들이 염정수이데, 자는 민망(民望) 호는
훤정(萱庭)이다. 1383년 지신사로 과거를 주관하여 여러명의 합격자를 뽑았는데,
9世 조대림의 장인인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 김한로(金漢老 양녕대군 장인),
심효생(沈孝生 개국공신, 세자 이방석 장인), 정역(鄭易 효령대군 장인)등을 뽑았다.
양촌선생문집 제3권 / 시(詩)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권씨(權氏) 만사
시중(侍中) 염제신(廉悌臣)의 부인이다.
천성이 아름답다 복과 경사 함께하니 / 天賦柔嘉福慶俱
한 평생 부귀란 옛적엔들 뉘 있으리 / 平生尊富古猶無
대대로 과거 올라 언니 아우 연달았고 / 科名世美兄連弟
이판(吏判) 벼슬 가전인 양 어버지와 남편일레 / 冢宰家傳父與夫
공사의 영예는 역사에 빛이 나고 / 貢士賀榮光竹帛
왕비 책봉 새 은혜는 예복에 비치도다 / 冊妃新渥照褘褕
오늘 아침 상여가 저승길로 돌아가니 / 今朝靈櫬歸幽宅
시마 복인(服人) 길에 가득 양 옆으로 부축하네 / 滿路緦麻左右扶
1) 공사(貢士)의…비치도다 : 공사는 옛날 제후(諸侯)가 재주와 학식이 높은 선비를
천자에게 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염제신이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원(元)의
평장사(平章事)로 있는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에서 자라났고, 태정제(泰定帝)의
총애를 받았으며, 또한 그의 딸이 공민왕 20년, 신비(愼妃)로 책봉되었으므로
한 말이다.
2) 시마(緦麻) :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주석 :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권씨는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부인이며,
예천부원군 권한공의 따님이고, 남동생 권중달의 사위는 목은 이색이다.
권씨의 여자형제 한 분은 8世 조후(趙煦)의 장모(함양박씨 박경의 따님)이다.
양촌선생문집 제4권 / 시(詩)
동정(東亭) 염 상국(廉相國) 흥방(興邦)이 전후의 문생(門生)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
젊었을 적 세 번이나 시험 맡더니 / 妙年三掌試
오늘은 또 잔치를 열었네그려 / 今日又開筵
끼리끼리 연달은 잠리의 귀인 / 濟濟連簪履
넘실대는 관현의 풍악소릴세 / 洋洋奏管絃
한때의 글 모임 성대한지라 / 一時文會盛
천추에 아름다운 얘기 전하리 / 千載美談傳
용문의 손 된 것 다행이지만 / 幸忝龍門客
시가 볼품 없어 부끄럽구려 / 裁詩愧斐然
1) 잠리(簪履) : 비녀와 가죽신. 즉 높은 벼슬아치들의 예복(禮服) 차림을 뜻하는데,
비녀란 곧 관(冠)에 꽂는 것이다.
2) 용문(龍門)의 손 된 것 : 훌륭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비유한 말이다. 용문(龍門)은
성망(聲望)이 높은 사람에게 비유한 말인데, 후한(後漢) 때 이응(李膺)이 고사(高士)로
명망이 높아, 누구든지 그로부터 한 번 접견만 받으면 세상에서 그 접견받은 사람에게
“용문에 올랐다"고 일컬은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李膺傳)
주석 : 정숙공의 외손자 염흥방은 3번의 과거를 주관하여 수많은 인재를 뽑았는데,
8世 조준, 유항 한수의 아들 한상질(韓尙質), 오몽을(吳蒙乙 개국공신), 심온(沈溫
세종의 장인), 조연(趙涓 이성계의 친조카), 야은 길재(吉再) 등 총 99명을 뽑았다.
권근의 시에 문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것을 기록한 시가 있다. 염흥방은 1374년,
1380년, 1386년 5월등 3번의 과거를 주관했으니 1386년 5월 이후에 지은 시이다.
그러나 1388년 정월에 일어난 무진피화 때 우왕과 최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신호열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고려사, 양촌집, 안동권씨대종회, 파주염씨대종회,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