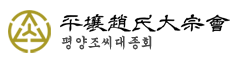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시(詩) 3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양촌선생문집 제10권 / 시(詩)
우정(雨亭) 조안석(趙安石)이 꿩과 시를 보내 왔기에
그 운을 차하여 사례한다.
보낸 시에 ‘사월에 서리 내려도 몹시 놀랍거든, 어찌하여 시월에 우레
소리 울리는가. (四月飛霜甚可驚 如何十月又雷鳴)’라는 말이 있었다.
여름 서리 가을 장마 못내 놀랍거든 / 夏霜秋潦已堪驚
겨울에 우레 소리 또 요란함에야 / 又使多雷殷殷鳴
하늘 뜻 무엇을 꾸짖음일까 / 天意未知何所譴
아마도 백성의 기쁨과 슬픔 살피게 함이리 / 合將休戚察民情
어젯밤 우레 소리에 꿈이 깨어 / 聞雷昨夜夢初驚
앉아 지새는 밤 닭마저 울지 않았네 / 坐久寒雞不肯鳴
명위는 높고 몸은 늙었으니 / 名位謾高身已老
밀려 오는 시름에 감회 금할 수 없네 / 憂來不禁感懷情
꿩 가지고 오는 사람 반갑게 맞아 / 執雉人來喜且驚
시 읊으니 새 울음 듣는 듯하네 / 誦詩如聽鳥嚶嚶
요리하여 온 집안이 배불리 먹으니 / 渾家得飽烹調味
그대의 오붓한 정 잊을 수 없구려 / 久客難忘譴綣情
사리를 분석함이 놀랍도록 신묘하니 / 如神剖決鬼猶驚
하늘이 성대를 위해 훌륭한 이 내었네 / 天爲明時擇善鳴
공이 클수록 나라 걱정 오히려 깊고 / 功夫尙存憂世念
은혜 깊은데도 구제의 뜻 언제나 도탑더라 / 仁深常篤濟窮情
주석 : 9世 조박은 조선개국후 3공신에 문신으로는 유일하게 봉해졌다.
조선개국일등공신, 정사일등공신, 좌명사등공신이다.
양촌선생문집 제10권 / 시(詩)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공 사형(金公士衡)에 대한 만사
너그럽고 후한 자질 덕망도 높아 / 寬厚天資德望尊
개국한 공훈이 성조에 으뜸이라 / 聖朝開國作元勳
잇달은 철권은 맹부에 간직되고 / 聯翩鐵券藏盟府
빛나는 금장이 상문에 줄지었네 / 煥赫金章繼相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은 늘 목마른 것같이 하였고 / 心爲憂民常自渴
아들 잃은 슬픔에 눈이 더욱 어두웠네 / 眼因哭子更多昏
하늘이 남기지 않는 뜻 참으로 모를레라 / 蒼天不憖誠難料
해로가 슬픈 소리 애가 끊어지누나 / 薤露聲中正斷魂
1) 철권(鐵券) :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훈공을 기록한 책. 사기(史記) 고제기(高帝紀)에
“공신과 더불어 부절(符節)을 가르고 맹세를 기록한 철권과 단서(丹書)를 금궤
(金匱)에 넣어 종묘(宗廟)에 보관하였다.” 하였다.
2) 맹부(盟府) : 서약한 문서를 보관하는 곳.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26년
조에 “공을 기록하여 맹부에 보관하는 것은 태사(太師)의 직책이다.” 하였다.
3) 금장(金章) : 금으로 만든 인장(印章)으로 금장자수(金章紫綬)와 같다.
진한(秦漢) 시대 재상들이 사용했다.
4) 해로가(薤露歌) : 만가(挽歌). 사람은 부추잎의 이슬 같아서 해만 뜨면 말라
버린다는 것인데, 한(漢) 나라 전횡(田橫)의 문인(門人)이 지은 만가에 해로와
호리(蒿里) 2장이 있다. (古今注 音樂)
주석 : 김사형(金士衡1341~1407 조선 판문하부사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자(字)는 평보(平甫), 호(號)는 낙포(洛圃), 시호는 익원(翼元)이다.
6世 조련의 장인 김흔(金忻)의 동생 김순(金恂)의 증손자이자, 개국일등공신이며,
8世 조준과 8년 동안 함께 정승을 지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묘당(廟堂)을 진압하니, 물의가 의중(依重)하였다.
김사형은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한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니,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것이 이와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396년 8世 조준이 좌의정
(당시는 영의정이 없고, 좌의정이 최고 관직) 일 때, 김사형은 우의정으로 일본의
일기도,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김사형의 사위 평산신씨 신효창(申孝昌)이 세종 때
평양조문의 원찰인 청계사 주지 각승 스님에게 시주하여 화엄경판을 조성하였으나
사망으로 중지 되었을때 9世 조대림의 배위 경정공주(慶貞公主)와 동생 효령대군
(孝寧大君)의 도움으로 화엄경판 1470판이 완성될 수 있었다. 안동김씨 익원공파
파조이며, 직계 후손이 백범(白凡) 김구(金九)로, 김구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후
9世 조대림의 외손자 순흥안씨 안탁(安擢)의 후손이자, 도마 안중근의 부친인
안태훈(安泰勳)이 백범 김구를 보호해주었고, 이 내용은 백범일지에 적혀져 있다.
양촌선생문집 제10권 / 시(詩)
우정(雨亭) 조공 박(趙公璞)이 문병하러 와서
율무(薏苡)를 주고 갔다는 말을 듣고서
베개 베고 신음한 지 달포가 넘었는데 / 呻吟伏枕數旬餘
높은 수레 오실 줄 어이 생각했으랴 / 豈意高軒枉弊廬
이로부터 사귀는 정 더욱 두터운데 / 自是交親情最厚
만나서 이야기 못하는 그 슬픔이 어떠하랴 / 未成會晤恨何如
임기 응변의 뛰어난 재주는 겨룰 이 없고 / 應機英邁雄無敵
선을 따르는 겸손은 매우 충실해 / 從善謙恭實苦虛
어느 날 취한 흥으로 좋은 시구 들을까 / 何日醉聞佳句妙
정자 밖을 바라보니 비만 내리네 / 坐看亭外雨疎疎
되로 말로 담아도 넘치는 명주알이 / 明珠升斗有贏餘
갑자기 집안에 가득하구나 / 忽見今朝滿草廬
비방을 두려워 아니함은 마원과 같거니 / 不畏謗言同馬子
소갈병에 시름함이 사마상여 같네 / 只愁消渴似相如
입에 넣으니 늙은이 입맛에 맞고 / 滑流脣上堪供老
창자선 따스하여 허기를 보해 주네 / 暖入腸間可補虛
구슬로 갚지 못함 스스로 부끄러우나 / 自愧未成瓊玖報
앞으로 좋은 정 길이 변치 않으리 / 誓將相好永無疎
1) 명주알 : 율무(薏苡)에 비유한 말
2) 비방을…같거니 : 남의 비방을 개의하지 않는다는 말. 후한(後漢)의 마원(馬援)이
교지 태수(交趾太守)로 있을 때, 교지의 율무가 알이 굵고 특히 장기(瘴氣)를
치유함에 효험이 크다 하여, 돌아올 때 수레에 싣고 왔다. 그 뒤 비방하는 자가
수레에 가득 싣고 온 것이 다 뇌물로 받은 명주(明珠)라고 참소하였다. 그래서 받은
명주(明珠)라고 참소하였다. 그래서 수뢰(受賂)의 비방을 받는 것을 의이지방
(薏苡之謗) (後漢書 卷54)
3) 소갈병(消渴病)에…같네 : 당뇨병처럼 목이 말라서 물이 자꾸 먹히는 병.
한(漢) 나라의 사마상여 (司馬相如)는 사부(詞賦)에 뛰어난 문호인데,
일찍이 소갈병에 걸려 무릉(茂陵)에 살았다고 한다.
4) 구슬로 갚지 못함 : 아름다운 구슬로 상대방의 호의에 보답하지 못 한다는 뜻.
시경(詩經) 위풍(衛風)에 위풍(衛風)에 “나에게 오얏을 주었으니 “나에게 오얏을
주었으니 경구로 보답하리라.” 하였다.
주석 : 9世 조박(趙璞, 1356년~1408년)의 호가 우정(雨亭), 자(字)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평(文平), 군호는 평원군(平原君)이다.
양촌선생문집 제12권 / 기류(記類)
수원 만의사 축상화엄법회중목기(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수원 동쪽 몇십 리 밖에 만의사가 있는데, 비보(裨補)를 기구(祈求)하던
옛절이다.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어 가시덤불로 변했었는데, 황경(皇慶 원
나라 인종의 연호) 연간에 천태종(天台宗)의 진구사(珍丘寺) 주지인 대선
사(大禪師) 혼기(混其)가 옛터를 와서 보고 새로 절을 중건했다.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琁公)이 이어받아 주관하면서 임금에게 자세히
사정을 계문(啓聞)하니, 판지(判旨 임금이 재가한 분부)로 절을 묘련(妙蓮)의
문인(門人)에게 소속시켜 서로 전해 가도록 했는데, 세월이 오래 되매 실로
천태종의 불법을 일으키는 사(社)가 되어, 지조(地租)를 받는 밭이 있고 사역
(使役)을 하는 하인이 있게 되자, 이득을 탐하는 무리가 또한 차지하려고
하게 되었다. 근자에는 천태종과 조계종(曹溪宗)에서 서로 주지를 임명했었
는데, 그 뒤에 조계종에서 그만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여 법사(法司)에 송사
하게 되니, 당시의 공론이 ‘절에 밭과 하인을 둠은 삼보(三寶)를 공양하려는
것이요, 주승(主僧)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데, 양종(兩宗)이 서로 다툼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이어 노비 약간
명은 수원부(水原府)에 소속시키고, 본 절은 도로 천태종에 귀속시켰었다.
지금 주상(主上)께서 왕통(王統)을 이어받아 나라를 중흥하고 모든 정사를
갱신(更新)하되, 곧 조종(祖宗)들의 법도대로 따라 삼보를 존숭하고 중시하여
왕화(王化)를 돕게 하였었다. 이때 천태종 용암사(龍巖寺)의 주지 대선사
중대광(重大匡) 봉복군(奉福君) 신조(神照)가 일찍이 현릉(玄陵 공민왕)의
총애하여 친근히 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공민왕이 죽자 사모하여 명복
빌기를 오랠수록 더욱 힘썼었다. 홍무(洪武) 무진년 (1388, 창왕14)에 병화
(兵禍)가 일어나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조공(照公 곧 신조 스님)은
완산(完山) 이 시중(李侍中 이성계를 가리킨다)의 휘하에 있으면서 능히 장상
(將相)들과 큰 계책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켜 회군(回軍)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켜 오늘날 중흥의 왕업을 만들어 놓았다. 주상은 마음으로 이를 아름
답게 여겨, 다음 경오년 8월에 특별히 공신패(功牌)를 내리고, 만의사 및 그
노비들을 영구히 그의 법손(法孫 교리를 계승한 제자)에게 전하도록 하였
으며, 또한 절에 밭 70결(結)을 주어 불공과 중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화엄삼매참의(華嚴三昧懺儀)를 열고, 경강(經講)은
묘법연화경환사소해(妙法蓮華經環師疏解였는데, 삼칠일(三七日)이 되어서야
끝났으니, 그의 임금에게 축수하고 나라의 복을 빎과 창생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도록 한 기원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가존(家尊 아버지) 영가군(永嘉君)이 친히 왕명을 받아 봉향(奉香)하고
오게 되었으므로, 모시고 수행(隨行)하여 성대한 행사를 참관하였다. 하루는
조공(照公)이 전말(顚末)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게 하여 주기를 부탁하여
왔다. 내가 생각하건대, 석씨(釋氏)는 인륜 (人倫)을 버리고 임금과 어버이를
떠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저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 유가(儒家)
에서 꾸짖는 바이다. 사대부(士大夫)로 이 세상에 뜻 두는 사람들은 공업
(功業)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에게 보답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근심인데, 지금 조공(照公)은 비록
석원(釋苑 불교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능히 임금과 정승들에게 신임을 받아
국가에 공을 세움이 이와 같이 탁월하고, 전심 전력하여 좋은 인연을 맺음
으로써 군부(君父)에게 은덕 보답하기를 또한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대부가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돌아보건대, 내가 어질지 못하여 일찍이 귀양살이로 쫓겨났다가, 특별히
어진 임금과 현명한 정승의 살리기 좋아하는 은덕을 입음으로써 목숨을 보존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다시 살아난 은덕이 하늘처럼 한이 없어, 비록
다소나마 보답하고 싶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 이 법회(法會)
에서 불성(佛聖)을 모시고 대중들과 더불어 소리를 같이하여 주상(主上)의
만수무강을 축수함으로써, 다소나마 하신(下臣)의 구구한 뜻과 소원을 펴게
되었으니,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양하지 않고 기(記)를 쓰는
것이다. 법회 때의 여러 가지 사목(事目)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열거한다.
1392, 태조1 중춘(仲春) 하순에 적는다.
1) 외호(外護) : 법회(法會)를 할 때 여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의복ㆍ음식 등 물질적인
문제를 담당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자신의 신ㆍ구ㆍ의(身口意) 삼업(三業)
의 잘못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계율(戒律)은 이를 내호(內護)라고 한다.
주석: 만의사(萬義寺)는 5世 대선사 혼기가 중창하고, 6世 삼장법사 의선이 주석하였으며,
조선 개국의 공로로 봉리군(奉利君)이라는 공신호를 받은 신조(神照) 스님이 주석
하였고, 이곳 만의사에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내에 그의 부도가 있다.
이 내용은 동문선 제78권 기(記)에도 실려 있다.
권근(權近)은 안동권씨로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부친은 영가군(永嘉君) 권희(權僖)이며, 권근은 목은 이색의 제자이다. 8世 조준의
고종사촌인 권현(權鉉)과 권주(權鑄)는 권근과 육촌지간이며, 권주는 8世 묘혜 대사,
목은 이색과 교류가 있었고, 권현의 사위는 제주고씨 출신의 개국공신 고여와 경주
김씨 개국공신 김균(金稛)이다. 김균의 후손 가운데 대종교 2대 교주 김교헌(金敎獻)
이 있으며, 그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해 서일, 김좌진, 홍범도, 나중소, 이범석
등이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8世 조준의 배위는 고성이씨 이숭(李崇)의 딸이며, 권근의 배위는 고성이씨 이강
(李崗)의 딸이다. 이숭과 이강은 모두 행촌 이암(李嵒)의 아들로 각각 2남과 4남으로,
조준과 권근의 부인은 사촌 자매이며, 조준과 권근은 이암의 손녀 사위들이다.
개국공신 의령 남은(南誾) 역시 이암의 외손녀 사위이다. 이암의 대표 저서로는
단군세기(檀君世紀)와 태백진훈(太白眞訓)이 있다.
조준의 아들인 9世 조대림은 태종의 둘째 사위이며, 권근의 아들 권규(權跬)는
태종의 셋째 사위이다. 조대림의 사위인 순흥안씨 안진(安進)의 후손이
도마 안중근이며, 권규의 후손 중에는 권율(權慄) 장군이 있다. 9世 조대림의 사위
안진의 손녀딸이 안동권씨 권적(權勣)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영의정 권철(權轍)
이며, 권철의 아들이 권율이다. 권율의 사위는 경주이씨 이항복(李恒福)으로,
흔히 “오성과 한음”으로 불리는 오성대감이다.
양촌선생문집 제13권 / 기류(記類)
우정기(雨亭記)
평원(平原) 조공 안석(趙公安石)이 일찍이 원(元) 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자앙(趙子昂)이 쓴 대우부(大雨賦) 두루마리 한 축(軸)을 구득하여 보배로이
간직한 지 오래였는데, 하루는 가지고 와서 나에게 붙이려는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대우부의 뒤에 붙이려는 것이니, 우정(雨亭)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고 하니, 공이 기쁘게 여기며 말하기를,
“좋다. 이왕이면 한마디 말을 써 주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내가 보건대,
“천지의 기운이 한정이 없어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내려오면 비가 되어 하토
(下土 대지)를 적시어 주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여, 싹트고 자라며 무성하고
열매 맺게 되는데, 단 것과 쓴 것, 향내 나는 것과 구린내 나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동물과 식물 따위의 천지 사이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비로써 생명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주역에 천도(乾道)의 큼을
말함에도 ‘구름이 나돌고 비가 내리매 만물의 형태가 갖추어진다.’ 하였고,
성인의 덕을 말함에도 ‘구름이 나돌고 비가 내리듯하여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였으니, 비의 공효가 실로 크다 하겠다. 만약 인사(人事)가 잘못되어 천도가
어그러지면, 날마다 폭양이 따르고 가무는 재앙이 들어 초목이 타고 금석(金石)
이 녹아, 만물이 병들지 않는 것이 없고 백성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에 큰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모든 것이 다 소생하게 될 것이니, 만물에 혜택
주는 도움이 어떻다 하겠는가? 옛날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정승 시키며 이르기를 ‘크게 가뭄이 든다면 너로써 장맛비(霖雨) 노릇을
하도록 하겠다.’ 하였으니, 그 의뢰(倚望)함도 막중하고 비유함도 간절하였다.
아, 천도(乾道)가 만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원(元)이요, 인도(人道)가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인(仁)인데, 천도의 원이 대기(大氣)에 발동하여 비가 내리고 인심(仁心)이
사물에 나타나 정교(政敎)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 된 이는 반드시
원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 인을 행하고, 신하 된 사람은 반드시 원의 이치를
조화시켜 그 정사를 행한 뒤에야, 임금의 덕이 건괘(乾卦)에 말한 성인에게
합치되고, 신하 된 사람의 공이 은(殷) 나라의 어진 정승(부열(傅說))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되어, 이른바 ‘구름이 나돌고 비가 내리듯’ 하는 공효와
‘큰 가뭄에 장마지듯’ 하는 공로를 또한 친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로써 정자의 기(記)를 하고 싶으니, 공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가령 이슬비가 주렴에 뿌리고 이끼낀 뜰이 고요한 낮이면 바둑두기 알맞고,
주룩주룩 빗소리가 섬돌에 요란하고 처마 밑 오동잎이 우는 밤이면 거문고
타기 알맞고, 찌는 더위가 이미 가시고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면
술자리를 벌이거나 시(詩)를 읊조리기 알맞고, 소나기가 구슬처럼 쏟아지고
가랑비가 실처럼 휘날리며 더디 오다 빨리 오다 하여 변태(變態)를 종잡을
수 없는데, 안석에 기대앉아 쓸쓸하게 혼자 즐기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숨은 선비로서 고요하게 지조 지키는 사람들의 소위이니, 공을 위해 말할
것은 못 되나, 공은 개국 원훈(開國元勳)으로서 정승 벼슬에 있으면서 뜻이
초야(丘壑)에 있어 이룬 공로를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니, 뒷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에게 혜택 입힌 다음
녹야(綠野)에 수레를 매달게(懸車) 되면, 또한 마땅히 거문고와 바둑과 시
(詩)와 술을 가지고 이 우정에서 이 우정에서스스로 즐길 것이니, 내가 장차
도롱이에 지팡이 짚고 찾아가 객석(客席)에서 다시 빗속의 한가한 흥취를
시로 펴겠다.” 하였다.
신사년(1401년) 가을 9월 중양일(重陽日)
1) 조자앙(趙子昂) : 이름은 맹부(孟頫). 호는 송설 도인(松雪道人). 원나라 사람으로
서화(書畫)에 뛰어났다.
2) 녹야(綠野) : 당 나라 배도(裵度)가 치사(致仕)한 뒤 별장을 마련, 녹야당(綠野堂)이란
현판을 달았다.
3) 수레를 매달게(懸車) : 관직을 떠나는 것, 곧 치사(致仕). 한(漢) 나라 설광덕(薛廣德)이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隱居)할 때, 하사 받은 수레를 매달아 자손에게 전하며 영광
(榮光)을 보인 고사이다.
주석 : 9世 평원군(平原君) 조박은 1398년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좋은 내용을 뽑아
사서절요을 제작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좌정승 조준· 겸 대사헌(大司憲) 조박(趙璞)·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첨(李詹)·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조용(趙庸)· 봉상 소경
(奉常少卿) 정이오(鄭以吾) 등이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撰述)하여 바쳤다.
바친 전문(箋文)은 이러하였다."
"군주의 정치는 심학(心學)에 매여 있으니, 마땅히 마음이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용
(中庸)의 도(道)를 꼭 잡아 쥐고서, 함양(涵養)하고 확충(擴充)하여 수신(修身)·제가
(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을 삼아야 될 것이니, 성현(聖賢)의 글을
두루 뽑아 보건대,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에서
대개 이를 다 말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성학
(聖學)으로 계속하여 밝히고 공경하셨는데, 당초에 왕위에 오르실 때부터 사서
(四書)를 관람하여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학문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만 제왕의 정치를 보살피는 여가에 두루 관람하고 다 궁구(窮究)하기가
용이(容易)하지 않은 까닭으로, 신 등에게 명하여 그 절요(節要)한 말을 찬술(撰述)
하여 바치게 하셨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성현(聖賢)의 말씀은
지극한 도(道)와 정밀한 뜻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지마는, 그러나 그 의논을 세움이
혹 사건에 따라 나오고, 혹은 묻는 사람의 공부의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얕고 깊음과
상세하고 소략한 같지 않음이 있게 되니, 그 군주의 학문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먼저 하고 뒤에 해야 할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삼가 그것이 학술(學術)에 간절
하고 치도(治道)에 관계되는 것을 주워모아 정서(淨書) 장정(粧幀)하여 바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연회(燕會)하는 사이에 때때로 관람하여 심학(心學)을 바르게 하고,
간략(簡略)한 데로부터 해박(該博)한 데로 들어가서 《사서(四書)》의 대지(大旨)를 다
알아내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고, 학문이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진보된다면,
장차 시종(始終)이 흡족하고 덕업(德業)이 높아져서, 성현(聖賢)의 도(道)가 다시
밝아지고 태평의 정치가 이루게 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들었다.
양촌선생문집 제16권 / 서류(序類)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평양(平壤) 조공 준(趙公浚)을 축하하는 시의 서
사제 간의 예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니, 성인이 임금과 어버이에게 비겨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도록 한 것은, 미덕(美德)을 이루고 인륜을 후하게 하려
한 것이다. 삼대(三代) 이전은 사도(師道)가 가장 밝았기 때문에 치화(治化)가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웠거니와, 한(漢) 나라 이후로 과거(科擧)가 처음 시행
되어서는 사제간의 예가 그래도 다 변하지는 않았었다. 당 나라 때에와서
과거법이 점점 성하여져, 고시(考試) 맡은 사람을 좌주(座主)라 부르고 선발된
사람을 문생(門生)이라 하여 사제의 예가 겨우 남아 있게 되니, 이에 그 문생
이 좌주가 생존해 있을 적에 그 시관(試官) 자리를 계승해서 맡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아름답게 여겼었다.
우리 동방(東方)은 고려의 광종(光宗) 시대 이래로 그 예가 지극히 풍성하여,
무릇 고시를 맡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 놓고, 공복(公服)
차림으로 문생을 거느리고 좌주를 모셔다가 그의 집에서 잔치하는데 자기
어버이 대접과 다름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려 왕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청사(廳事)를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히 내악(內樂 궁중악)을 내려 총애하니,
이로 말미암아 좌주는 문생 보기를 자식과 같이하고, 문생은 좌주 보기를
아비와 같이하였으니, 사제의 예가 후하였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오랫동안 태평하여 오로지 문교(文敎)만 숭상하매, 서로 더욱 화려
하고 사치하게 하려 하여 소모하는 비용이 점차 많아져서, 때로는 군현
(郡縣)에까지 징색(徵索)하되 여러 달이 걸려 마련하게 되니, 공민왕 기유년
(1369, 공민왕18)에 이 폐단을 개혁하려고, 한결같이 중국의 회시(會試)
제도에 따르고 잔치 차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었다.
갑인년(1374, 공민왕23)에 광양(光陽) 이공(李公)이 정당 문학(政堂文學)으
로서 공사(貢士)의 고시(考試)를 맡아 보았었는데, 지금의 시중(侍中) 평양
조공이 대전(大殿)의 명으로 발탁되어 대과(大科)에 오르니, 당시 사람들이
인재(人材)를 만났다고 칭찬하여, 명성이 날로 전파되었다. 좋은 요직을
두루 지내며 미원(薇垣 사관원)에서는 제고(制誥)를 맡고, 백부(柏府 사헌부)
에서는 기강(憲綱)을 떨쳤으며, 형조(刑曹)의 장관 때는 간특한 무리들이
제거되고, 남방(南方)을 순찰할 때는 해적들이 도망가니, 사람들이 모두 그가
크게 쓰이기를 바랐었다. 무진년(戊辰年)에 지금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대장(大將)으로 있으면서 대의(大義)로 군사를 돌려 내란을 평정하고, 맨
먼저 조공을 발탁하여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을 삼으니, 공이 마음을 다해
봉공(奉公)하여 아는 일은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전(私田)을 개혁해서
경계(經界)를 바로잡고, 기강과 법도를 세워 간흉들이 두려워 복종케 하였
으며, 공양왕(恭讓王)을 세워 왕씨(王氏)의 종사(宗祀)를 회복하니, 중외(中外)
가 모두 지극한 정사를 기대했었다.
경오년 여름에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문형(文衡)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광양공(光陽公)이 일찍이 검교시중(檢校侍中)을 지내고 나이 80이 되었으나,
강건하여 노쇠하지 않고 청덕(淸德)과 절조(節操)로 진신(縉紳)의 모범이 되며,
지감(知鑑)이 정밀하여 선비들을 얻고, 복록이 번창하어 수(壽)를 누리게 되니,
존경하여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임신년 가을에 이르러 공양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을 자초(自招)하자, 공이
아상(亞相)으로서 대의(大義)를 주창하며 계책을 세워 대덕(大德)을 추대함
으로써, 만세의 반석 같은 왕업을 닦아, 개국(開國) 수석 공신이 되고 벼슬이
시중(侍中)에 올랐다. 부귀가 이미 극하여졌으되 광양공 섬기기를 진실하게
하여 제자의 예를 닦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하였는데, 광양공이 문생을 거느
리고 공을 청하여 그의 집에서 잔치하며 시(詩) 한 수를 지어 시중에 제배
(除拜)된 것을 축하하고, 그의 동문(同門) 및 조정의 문사들이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지으니 하나의 큰 축(軸)이 되었었다. 그 이듬해 여름에 공이 또 공사
(貢士)를 맡아 보았다. 대저 문생으로서 좌주 생전에 진실로 좋은 벼슬에
오르거나, 한 번만 시관(試官)을 맡게 되어도 또한 영화로 여기거늘, 하물며
벼슬이 총재(冢宰)가 되고 두 번이나 시관을 맡았음에랴. 과거가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병조 정랑(兵曹正郞) 송인(宋因)은 공과 동방(同榜)
인데, 그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시에는 반드시 서가 붙는 것이 옛 예인데,
이 시축(詩軸)은 더욱 그 미덕(美德)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가 그
머리에 서문을 붙여야 하겠다.” 하였다.
나 근은 생각하건대, 평양 조씨는 대대로 인후(仁厚)한 덕을 쌓았는데, 정숙공
(貞肅公)이 충렬왕(忠烈王)을 도와 벼슬이 백관의 위에 있으면서 우뚝하게 큰
공적을 세움으로부터 대대로 그 미덕을 성취시켜 왔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이 이윤(伊尹)ㆍ여상(呂尙)과 같은 재질로 육경의 글을 강명 (講明)하고
염(濂)ㆍ락(洛)의 학문으로 백대의 역사를 꿰뚫으며, 큰 역량은 만물을 구제할
수 있고, 고상한 인망은 세속을 진압할 수 있으며, 위엄은 사직(司直)들에게
신임 받고 덕은 구첨(具瞻 온 국민이 쳐다본다는 것. 곧 재상의 지위)의 자리
에 알맞아서, 능히 가문의 명성을 계승하고 왕업을 보좌하여, 사업이 역사에
빛나고 유복(裕福)이 후손에게 미칠 것이다. 이는 그의 풍성한 공로와 많은
업적이 종정(鐘鼎)에 새겨지고 죽백(竹帛)에 실려서, 만세토록 전하고 썩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니, 어찌 시인(詩人)의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기욱
(淇澳)의 시가 아니면 위 무공(衛武公)의 문덕(文德)을 알 길이 없고, 대명
(大明)의 아(雅)가 아니면 사상보(師尙父 여상(呂尙))가 응양(鷹揚)한 업적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니, 시도(詩道)의 관계되는 바가 어찌 또한 적은 것이
겠는가. 그러므로 공이 개국(開國)한 공로는 국사(國史)에 실리고, 스승을
높인 도리는 마땅히 제현(諸賢)의 시가 있어야 한다. 공이 스승을 지극히
후하게 섬겼는지라, 이미 이로써 그의 좌주를 섬기고 또한 이로써 그의
문인을 거느린 것이니, 이 도리를 미루어 사람들에게 시행하여 간다면,
어찌 인륜이 후하여지지 않고 풍속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공의 문인에
또한 이름난 사람과 사람과 통달한 인재가 많으니, 앞날에 반드시 공이
광양공(光陽公)을 섬기듯이 공을 섬길 사람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
아아, 사제(師弟)의 예절이 행하여지매 사제의 도리가 다시 밝아졌거니와,
사제의 도리가 밝아짐은 교화(敎化)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풍습이 순박해
지고 세속이 아름다워져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삼대(三代)의 융성한 정사를 또한 거의 이루게 되리니, 보상(輔相
정승)의 사업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반갑게 서를 짓는 것이다.
계유(1393, 태조2) 7월 어느 날
1) 염(濂)ㆍ락(洛)의 학문 : 곧 정(程)주(朱)의 학문을 뜻함.
염은 주돈이(周敦頤), 낙은 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킨다.
2) 대명(大明)의 아(雅) : 시경 대아의 대명지십(大明之什)을 말한다.
주석 : 8世 조준의 스승인 광양부원군(光陽府院君) 이무방(李茂芳)은 광양이씨의
시조이다. 목은시고 제25권에 광양군 이 선생을 위하여 계당에 대한 글을 짓다.
[爲光陽君李先生記溪堂]〉라는 시가 있으며, 목은 이색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8世 조준은 1390년에 창녕성씨 성석린(成石璘)과 1393년에 낙안김씨 김주(金湊)와
과거를 주관하였다.
양촌선생문집 제17권 / 서류(序類)
금강산으로 가는 나암상인(懶庵上人)을 전송하는 시(詩)의 서(序)
금강산이 우리나라 동해(東海) 가에 있는데, 그 형승(形勝)이 천하에 으뜸
이므로 소문이 천하에 퍼졌다. 내가 어릴 적에 듣건대, 천하에 구경하러
오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길이 없음을 한탄하여, 그 그림을 걸어
놓고 예찬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니, 그 간절히 흠모함이 이러하다.
내가 다행히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산과의 거리가 몇백 리도 못되는데,
명예에 얽매이고 세리(世利)에 팔리어 일찍이 한 번도 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연(飄然)히 멀리 가 보고 싶은 뜻은 언제나 마음속에 오가지 않는
때가 없었다. 병자년 가을에 내가 중국에 들어가 천자를 뵙고 경광(耿光
임금의 덕(德))을 접하게 되자, 제(帝)가 친히 글 제목을 내리며 시 20여 수를
짓게 하였는데, 그 중에 제목 하나는 ‘금강산’이었다. 이래서 이 산의 이름이
과연 천하에 중하고, 내가 어릴 때에 들은 것이 자못 빈말이 아님을 알았다.
그야말로 평소에 한 번 가 보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만일 하늘이 복을 주어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먼저 이 산을 가 보아 평생의 뜻을 풀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돌아왔으면서도 전일과 전일과 같이 얽매여
나의 뜻을 또한 풀지 못하였다.
하루는 나암스님 이라는 사람이 시(詩)를 가지고 왔기에 받아 보니, 금강산에
유람 가는 길을 전송한 작품들이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책을 어루만지며
자탄(自歎)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세속의 누(累)를 털고 구름처럼 자유롭게
놀기를 추구하여, 찬완(巑岏 연이어 솟은 산)의 험준한 곳을 넘나들고 최외
(崔嵬 극히 높고 험한 산)의 마루턱에 올라가 천 길 별랑을 발 아래 두고 천
리나 한없이 바라보면서, 구릉을 적게 보고 진세(塵世)를 좁게 여기며, 창명
(滄溟 바다)에서 해 돋는 것도 보고 천지의 대기(大氣)에 휩싸이기도 하며,
동해(東海)의 노중련(魯仲連)을 상상하기도 하고, 태산(泰山)의 공자를 희구
(希求)하기도 하여, 호호 탕탕(浩浩蕩蕩)하게 자득(自得 만족)하다가 유유한한
(悠悠閑閑)하게 돌아갈 생각을 하여, 나의 평소에 답답했던 가슴속을 풀게
될까.” 하였다.
아, 이 산을 구경하려는 사람이 많거니와, 나 역시 구경하고 싶어 한 지 오래
면서도, 몇백 리 안 되는 가까운 데를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였으니, 천하에 구경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이겠는가.
아직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한가하고 바쁘고 멀고 가까운 사세가
달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운수라는 것이 있어서 세속 사람은 선경(仙境)
을 밟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또한 알지 못하거니와, 이미 구경한 사람들의
얻은 바는 모두가 같은 것일까, 같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사(師)의 얻는 바
역시 뭇 사람들의 그것과 같고 말 것인가. 후일에 내가 혹 한 번 올라가 보게
된다면, 내가 얻는 바가 또한 장차 어떠할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스
러운 일은, 내가 이번에도 구경하려다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시축(詩軸)
을 보니 더욱 감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암은 세족(世族)으로서 환기(紈綺
부귀)를 버리고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용모가 청수하고 행신이 고결하니,
내가 장차 방외(方外)의 벗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무인(1398, 태조7) 2월 초하루
1) 동해(東海)의 노중련(魯仲連)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사람으로 높은 뜻을 지니고
벼슬하지 않았다. 사기(史記) 권83에 “중련이 말하기를 ‘진 나라가 방자하게 황제가
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고 말겠다.’ 하니, 진 나라 군사가 퇴각했다.” 하였다.
2) 태산(泰山)의 공자 : 성인의 도가 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자가 동산(東山)에 올라가서는
노(魯) 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겼다 한다.(孟子 盡心上)
주석 : 나암원공(懶菴元公)은 나잔자(懶殘子)로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 이색,
유항 한수의 시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오며 도은 이숭인은 나잔자의 제자인 휴상인
(休上人 ,여태허)과 친밀한 관계이다. 나난자는 목은 이색의 목은집에도 등장을 하며
양촌 권근의 스승인 목은 이색의 친우였던 나잔자와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목은문고 제8권 서(序) 휴상인(休上人)에게 준 글" 을 보면 알 수 있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이병훈, 김주희,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고려사, 양촌집, 안동권씨대종회,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