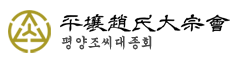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시(詩) 4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양촌선생문집 제17권 / 서류(序類)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의 서
의술과 약으로 요찰(夭札)과 질병을 구제함은 인정(仁政)의 한 가지 일이다.
옛적에 신농씨(神農氏)가 기백(岐伯)으로 하여금 풀과 나무의 성질을 맛보게
해서 의원의 직을 맡아 병을 고치게 하였고, 주례(周禮)에는 ‘의사는 의약에
관한 정사를 맡아, 약초를 모아서 의료하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하였으며,
그 뒤에는 의술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유부(兪跗 황제 때의 명의(名醫))ㆍ편작
(扁鵲 전국 시대의 명의)ㆍ의화(醫和 춘추 시대 진(秦) 나라의 명의)ㆍ의완
(醫緩 춘추 시대 진(秦) 나라의 명의)의 무리 등 전기(典記)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서적이 모두 전하지 않고, 당(唐) 나라 이래로는 그
방문이 시대마다 증가되어, 방문이 많아질수록 의술은 더욱 소루해졌다.
대개 옛적에 용한 의원은, 한 가지 약종만을 가지고 한 가지 병을 고쳤었다.
그런데 후세 의원들은 여러 가지 약종을 써서 공효 있기를 노렸기 때문에,
당 나라의 명의 허윤종(許胤宗)은 ‘사냥하는데 토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온 들판에다 널리 그물을 치는 격이다.’하고 조롱하였으니, 참으로 비유를
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약을 합쳐서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이,
한 가지 약종을 알맞게 쓰는 것만 못한데, 다만 병을 제대로 알고 약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어서,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약종을 누구나 구득하기 어려운 것이 실로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라
풍속이 가끔 한 가지 약초를 가지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하되 그 효험이 매우
신통했었다. 일직이 삼화자(三和子)의 향약방(鄕藥方)이 있었는데, 이는 자못
간단하게 요령만 뽑아 놓아, 논병(論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간략함을
결점으로 여겼더니, 요전에 지금의 판문하(判門下) 권공 중화(權公仲和)가
서찬(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다 수집을 더하여 간이방(簡易方)을 편저
(編著)하였다. 그러나 그 책은 아직도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했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인성(仁聖)한 자품으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시고, 널리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이 하였으나, 매양 가난한 백성이 병이 나도 치료할 수 없음을
염려하여 몹시 측은하게 여겼었다. 좌정승 평양백(左政丞平壤伯) 조공 준
(趙公浚)과 우정승 상락백(右政丞上洛伯) 김공 사형(金公士衡)이 위로 성상의
마음을 체득하고 ‘서울에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노비(奴婢)를 지급하여
향약(鄕藥)을 채취시켜서, 약을 만들어 널리 펴서 백성이 편히 쓸 수 있게
하기’를 주청하매, 중추(中樞) 김공 희선(金公希善)이 그 일을 도맡았었다.
각 도(各道)에도 또한 의학원(醫學院)을 설치하고 교수(敎授)를 나누어 보내어
이와 같이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입게 하였다.
또 그 방문에 미비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특명관(特命官) 권공(權公) 약국
관(藥局官)과 함께 모든 방문을 다시 상고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방문을 채집하여 부분(部門)으로 분류 편집하여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
成方)이라 이름하고, 우마의방(牛馬醫方)을 부록(附錄)하였는데, 김 중추
(金中樞)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때 공장(工匠)을 모아
인쇄하여 널리 전파하니, 모두 구득하기 쉬운 약물이요, 이미 증험한 방문들
이다. 이 방문에만 정통하다면 한 병에 한 약물만 쓰면 되니,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나지 않는 구하기 어려운 것을 바라겠는가.
또 오방(五方 동서남북과 중앙)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 리(千里)면 풍속이
같지 않아, 평상시의 좋아 하는 음식의 시고 짬과 차고 더움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가 구하기도 전에
병만 이미 깊어지거나 혹은 많은 값을 주고 구하더라도 묵어서 썩고 좀이
파먹어 약기운이 다 나가 버린다면, 토산 약재가 기운이 완전하여 좋은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약을 써서 병을 고친다면 반드시 힘이 덜
들고 효험은 빠를 것이니, 이 향약제생집성방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전(傳)에 이르기를 “용한 의원은 나라도 치료한다.” 하였다. 지금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 원대한 국운(國運)을 열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의
고통을 건지고 만세의 반석 같은 기초를 세워, 밤낮없이 부지런히 다스리기
에 마음을 다하고, 백성을 살리고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방법을 더욱 꾀하매,
백성을 인해(仁愛)하는 정사와 나라를 풍요하게 하는 도리가 본말(本末)이
아울러 시행되고 대소(大小)가 다 갖추어져서, 의약으로 병을 고치는
일까지 도 정성을 다하였다.
백성을 잘 보호하고 배양하기를 이토록 지극하게 하니, 나라 다스리기를
원대하게 한 것이다. 어진 정사가 한 시대에 덮이고 은택이 만세토록 흘러갈
것을 어찌 쉽사리 헤아리랴.
1399년 (정종1년) 무인 여름 6월 하한(下澣)
주석 :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은 8世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안동김씨 김사형이
주장하여 안동권씨 권중화(權仲和)와 김희선 등이 편찬한 의학서로서, 대한민국
보물 제1178호이며, 총30권으로 되어있다. 김사형은 8世 조준의 8촌으로 개국공신
이며 태조와 태종 때 국가를 합심하여 운영했다. 권중화는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장인인 안동권씨 권한공(權漢功)의 아들이다. 김희선(金希善) 태조 때 호조 판서를
지냈는데 본관은 알 수 없다. 1397년, 8世 조준의 건의로 제생원(濟生院)이 설치되어
의료·의약, 특히 향약(鄕藥)의 수납·보급, 의학교육 및 의서 편찬 사업을 담당했다.
1398년에는 제생원에서 향약제생집성방을 간행하였고, 혜민국(惠民局)·전의감
(典醫監)과 함께 일반 서민의 질병 치료와 돌봄에 힘썼다.
이 책은 1433년 세종 때 발간된 향약집성방의 기초가 되었으며,
1490년대에 서거정, 노사신, 허종 등이 이를 한글로 번역했다.
서거정, 노사신, 허정 등은 모두 정숙공과 관계가 있는 분들의 후손들이다.
양촌선생문집 제20권 / 서류(序類)
송당(松堂) 조 정승 준(趙政丞浚) 시고(詩藁)의 서
우리 조선이 처음 일어날 적에 개국원훈(開國元勳)으로 정권을 맡은 대신이
있었으니 그는 평양(平壤) 조공(趙公)이다. 공은 실로 우리 태상왕(太上王)을
도와 의(義)로 정책을 세워 대업(大業)을 이루었으며, 조용히 당폐(堂陛)
위에서, 호령과 위엄을 쓰지 않고도 전조의 어지러운 정책을 일소하고 우리
조선 억만년 태평의 기반을 열어 백관을 거느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상왕(上王 정종(定宗)) 및 우리 전하를 내리 도왔다. 임금의 신임을 받고
정사를 행한 지 10여 년에 그 거룩한 공렬이 맹부(盟府)에 간직되고 국사
(國史)에 실렸으며, 은택은 당시에 입혀졌고 명성은 후세에 빛나 근세의
대신으로서는 그와 더불어 비할 만한 이가 없으니, 아, 참으로 거룩하도다.
그가 세상을 뜬 뒤에 맏아들인 부마(駙馬)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이
유고(遺藁) 몇 수를 모아 장차 간행하기 위해 나에게 그 책머리에 서문을
지어 달라하면서 세 차례나 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예절이 더욱 공손
하였다. 내가 사양할 수 없어 유고를 받아 읽어 보니, 문세가 힘차고 빼어나
공교롭게 억지로 얽어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호방하고 걸출한 태도는
노심초사하면서 공교하고 화려함에만 전심하며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문인 재사(文人才士)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난을 평정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뜻이 간간이 거듭 나타
나니, 평생에 품고 있는 뜻과 길러 놓은 기운은 이 시만 읽어 봐도 상상할
수 있다. 참으로 어진 임금을 만나 서로 뜻이 맞아 비상한 큰 공로를 세움이
이같이 특출하니, 이 문집을 전하는 것이 어찌 문장만일 뿐이랴.
1404년 (태종 6년) 병술 겨울 11월 동지 후 갑자일
주석 : 8世 조준의 문집으로 송당집(松堂集)있는데 양촌 권근이 서문을 써주었다.
송당 조준과 양촌 권근 부인이 서로 사촌지 간이며, 권근은 조선 초 많은
외교문서를 작성했으며, 권근은 8世 조준의 시가 일반 문인과 다르게
호방하고 걸출하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과거에 합격한 문신이지만,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왜구를 물리친 무신의 역량을 가진 조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송당집은 한자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오다가,
2012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글판이 제작되었다.
양촌선생문집 제21권 / 설류(說類)
안석(安石)에 대한 설
나의 벗 평원(平原 본관) 조공(趙公)의 이름은 박(璞)이요, 자는 안석(安石)인데,
나에게 그 의설(義說)을 청하였다. 대개 옥(玉)이 돌 속에 있는 것을 박(璞)이라
하는데, 옥은 순수하고 윤기가 나며, 돌은 거칠고 억세어서 그 동아리는 미악
(美惡)의 같지 않음이 있다. 그러나 옥이 처음에는 돌이 아니면 정기가 엉기어
그 질(質)을 이룰 수 없고, 종말에는 돌이 아니면 티를 갈아 내고 그릇을 이룰
수 없으니, 이는 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옥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또 시경(詩經)
에 “다른 산의 돌로 옥을 다듬을 수 있다.”고 이르지 않았는가. 이는 선유(先儒)
들이, 군자가 소인의 침해로 인하여 그 덕을 더하는 것에 비유함이요, 또 끌어
다가 비유한 것이 가장 절실하다. 조공이 이것으로 자를 삼은 것은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함이요. 또한 경계함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근본을 잊지 않으면
덕이 두터워지고, 경계함을 잊지 않으면 덕이 닦아지리니, 이 두 가지는 덕에
나아가는 급무이다. 조공이 이것으로 스스로 힘써서 항상 옥을 갈고 닦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온후한 기풍과 견고한 품질이 티를 없애고 아름다움을
이루어, 귀중함은 호련(瑚璉) 같고, 존엄함은 개규(介珪) 같고, 순결함은 찬(瓚
제기(祭器)의 일종) 같고 곧음은 시위(鉉)고 화(和)함은 명구(鳴球 옥으로 만든
악기) 같고 미더움은 보새(寶璽 옥새) 같은지라, 기(器)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덕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공이 어찌 이것으로 만족하겠는
가! 더욱 힘써 대성(大成)의 경지에 이르러 금성옥진(金聲玉振)이 되게 해야
하리라. 공이 개국 원훈(開國元勳)으로 이어 정사(定社)와 좌명(佐命)의 공이
있어 세 번이나 맹부(盟府)에 참여하여 훈렬(勳烈)이 이미 나타나고 지위
또한 높았다. 그러나 공이 국가에 충성을 다함과 사람들이 공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기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 옛날에 천자를 보좌하여 공명이 있은
이로는 진(晉) 나라 사공(謝公 사안(謝安). 자는 안석(安石))과 송(宋) 나라
왕씨(王氏 왕안석(王安石))가 있었는데, 그 이름과 자가 같다 하여 사람들이
“공이 두 분을 사모하여 이렇게 자를 지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공을 아는
자가 아니다. 두 분의 성공이 또한 각기 다르니, 문장과 학술은 사공이 왕씨
에게 미치지 못하나 아량과 침착함은 왕씨 또한 사공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제 공이 경술과 언변이 왕씨와 같고 풍류와 한아(閑雅)함은 사공과 같으니,
이는 두 분의 장점을 다 가져서 고명 정대하고, 의리로 마음을 기른 것은 두
분이 감히 바랄 바 아니다. 뒷날 재상으로서의 공렬이, 임금을 성군(聖君)
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는 효과는 마땅히 이윤(伊尹)과 주공
(周公)으로 법을 삼을 것이니, 어찌 진(晉)ㆍ송(宋)을 족히 운운할 것이랴.
1) 금성옥진(金聲玉振) : 금은 종(鐘)이고 옥은 경(磬)임. 음악을 합주할 때 먼저 종을
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 경을 쳐서 마치기 때문에, 전하여 사물의 집대성(集大成)을
찬미하는 말로 쓰인다.
주석 : 의설(義說)은 의리나 도리에 관한 말이라는 뜻으로 9世 평원군 조박이 어릴 적
스승인 권근에게 본인의 자인 안석(安石)의 설명을 요청한 글이다. 안석은
건축물이나 제단, 혹은 석비의 일부 명칭에도 사용되는데 나라의 받침돌
(주춧돌)을 뜻 할 수 있겠다.
양촌선생문집 제22권 / 발어류(跋語類)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의 발
제생원(濟生院)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백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처음에 평양백(平壤伯) 좌정승(左政丞) 조공 준(趙公浚)과 상락
백(上洛伯) 우정승(右政丞) 김공 사형(金公士衡)이 국사를 다스리던 여가에,
곤궁한 백성들이 병이 들어도 치료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 널리 구제하
고자, 동지중추(同知中樞) 김공 희선(金公希善)과 협력하여 제생원을 설치
하고 약제를 모아놓고 치료를 하였으며, 또 예천백(醴泉伯) 권상 중화(權相
仲和)와 더불어 그가 전에 저술한향약방(鄕藥方)을 토대로 다시 더 수집하여
전서(全書)를 만들어서 중외에 반포하고 영원히 전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모두 지역에 따라 약을 구할 수 있고 병에 따라 치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또 우마(牛馬)의 병에 약을 잘못 써서 죽게 함을 염려하여 그 처방
(處方)을 집성하였으니, 백성을 사랑하고 짐승을 아끼는 마음이 깊고 또
간절함이 이와 같았다. 1399년 (정종1년에) 그 책이 완성되자, 김중추
(金中樞)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각공(刻工)을 시켜 목판에 새겨 그 전함을
영원하게 하였다.
아! 평양백과 상락백의 인후한 덕으로 그 일을 총괄하였으며,
예천백의 정박(精博)한 학문 으로 그 책을 편찬하였으며,
김공이 또 능히 힘을 써서 그 일을 시종 성취하였으니,
네 분이 우리 우리나라 백성에게 혜택을 베푼 바가 마땅히 이 책과 함께
만세에 전하여 무궁함을 기할 것이다.
이 제생원의 일을 주간(主幹)하는 이는, 서원군(西原君) 한공상경(韓公尙敬)
순흥군(順興君) 안공 경량(安公敬良)ㆍ김군 원경(金君元囧)ㆍ허군 형(許君衡)
이군 종(李君悰)ㆍ방군 사량(房君士良)으로서 모두 여기에 공로가 있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아울러 책머리에 밝힌다.
기묘년(1399, 정종1) 여름 5월 상순(上旬)
주석 : 제생원은 1397년(태조 6) 8世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 의료·의약, 특히
향약(鄕藥)의 수납(輸納)·보급과 의학교육 및 편찬사업을 맡아보았다. 의학교육으로는
1406년(태종 6) 창고궁사(倉庫宮司)의 동녀(童女) 수십 명을 선발하여 맥경(脈經)·
침구법(針灸法)을 가르쳐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의녀(醫女)의
시작이다. 편찬사업으로는 향약을 써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 (30권)을 1398년에 편찬하는 등,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과
함께 일반서민들의 질병을 구료함과 동시에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처럼 구호사업
에도 관여하여 조선 초기 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청주한씨 한공상경(韓公尙敬)은 개국공신 한상경으로 부친 유항 한수는 6世 삼장
법사 의선의 제자인 8世 조순(법명 묘혜), 나잔자(懶殘子)등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을 지냈다.
순흥안씨 안경량은 8世 조준의 사돈 연일정씨 정홍의 처남이자, 개국공신이
안경공의 동생이다.
김원경(金元囧)은 경주김씨이나 자세한 역사 기록이 없다.
양천허씨 허형(許衡)은 6세 조련의 장인 허공의 후손이다.
남양방씨 방사량(房士良)은 8세 조준과 신찬집성마의방우의방(新撰集成馬醫方
牛醫方) 편집에도 참여했다. 이런 의학과 관련된 기관 설립과 서적 출간은 국방에
참여하는 군사들과 군말를 위한 부분도 있다. 또한 방사량은 1391년 3월에
시무(時務) 11조(條)를 올렸는데, 왕이 감탄하여 형조 정랑에 임명했다.
김중추(金中樞) 경주김씨 김구(金鉤)로 종학박사(宗學博士), 성균관(成均館) 대사성
(大司成), 중추원(中樞院) 판사(判事) 등을 역임했다. 김말(金末), 김반(金泮)과 함께
경학삼김(經學三金), 관중삼김(館中三金)이라 불렸다.
양촌선생문집 제22권 / 발어류(跋語類)
평원군(平原君) 조공 박(趙公璞)의 시권(詩卷)의 발
옛날에 내가 처음 급제하여 벼슬할 때에 관동(冠童) 6~7명이 와서 글을 배웠
는데, 지금 평원군 (平原君) 공 안석(趙公安石)이 가장 연소하고 명민하였으나,
세가(世家)의 자제임을 자부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심한 비가 내려도
맨발을 꺼리지 않고 오므로 내가 몹시 애중하였다. 사사로이 시험을 보일
때에도 그 문장이 화려하고 내용이 생동하여 볼 만하므로, 나는 매양 평점
(評點)을 더하여 권장하였다. 동료들은 자못 그가 어렸기 때문에 그를 더욱
힘쓰게 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뒤에 과연 한 번 과거를 보아 장원에
뽑히고 현달한 벼슬에 올라 명망이 날로 높으니,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무리가 모두 그만 못하였으므로, 비로소 내가 전에 찬미한 것이 빈말이 아니
라는 것을 믿었다. 전조(前朝)의 말엽에 정사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워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공이 아직 연소하였으나 능히 천명을 밝혀
한두 장상대신(將相大臣)으로 더불어 힘을 합쳐 거의(擧義)하여, 임금을
도와 국운을 일으켜서 난세(亂世)를 치세(治世)로 바꾸어 우리 한 나라의
죽어가는 생령을 구제하였으니, 높고 거룩한 공렬은 진실로 이미 만세에
관계된다. 또 나라의 사직을 정하여 화란을 진정하고 천명을 도와 태평을
열어서 멀리 3대(태조ㆍ정종ㆍ태종)의 훈맹(勳盟)에 참여하였으니,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와 뛰어난 계획을 결단함이 밝고도 큰 것이다.
이제 서도(西都 평양)로 출진(出鎭)한 지 한 달도 못 되는 동안에, 백성을
수고롭게 아니하고 안주성(安州城)을 장엄하게 쌓았으니, 으니, 번병(藩屛)
의 공고함은 만세에 길이 힘입을 것이요, 짜임새의 주밀함과 규모의 방대
함은 모두 전인들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공이 전후로 중외의 직을 역임할
때에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치적이 높고 높았으나,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에게는 대단찮은 일이라 구태여 쓰지 않고,
특별히 그 큰 것만을 써서 발을 짓는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바야흐로 공을
등용하여 함께 서정(庶政)을 도모하니, 큰 훈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붓을 잡고 또 기다리겠다.
주석 : 권근은 1368 성균시에 합격하고, 1369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되었는데,
이 때 9世 조박이 양촌 권근에게 글을 배운 것 같다. 권근이 조박의 시 권에 발문
(跋文)을 써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9世 조박의 시문집이 있었으나 안타깝게
전해지지 않는다. 성주이씨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개국공신 이직(李稷)의 문집인
형재시집 (亨齋詩集)에 조 평원군 만사(趙平原君挽詞)에 9世 조박이 생전에
바둑을 좋아하고 잘 두었다는 내용이 있다. 안주성(安州城)은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에 있는 고구려때 세워진 성으로 9세 조박이 증축한 것을 나타내며
안주성의 남문인 백상루와 청남루, 현무문 등이 유명한데, 안주성 백상루에는
8世 조준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읊은 안주회고(安州懷古)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국보 158호 이다.
양촌선생문집 제23권 / 제문류(祭文類)
조우정(趙雨亭)을 대신하여 어은 선생(漁隱先生)에게 드리는 제문
어은(漁隱)은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공 제(閔公霽), 우정(雨亭)은 그의
사위로, 이름은 박(璞)이다. 가을 달의 결백함은 오직 공의 청렴한 것이요,
아름다운 옥의 단단함은 오직 공의 절개로다. 말끔한 것은 티끌에서 빼어난
기상이요, 청고한 것은 속세를 끊은 표정이로다. 이것이 혼연한 천성 그대
로라, 초년에는 유자(儒者)로서의 가난에 처하였으되 굳은 의지를 바꾸지
않았고, 말년에는 국구(國舅)로 서의 본래의 지조를 손상하지 않았도다.
경제의 학이로되 풍류의 흥취가 있었고, 조정의 기국이로되 구학의 자세를
가졌나니, 크기는 고금을 포함해 꿰뚫어 한이 없었고, 세밀하기는 털끝만한
것도 분석하여 남기지 않았도다. 우직한 말은 족히 큰 의리를 결단하였고,
민첩한 지식은 족히 큰 의혹을 풀었나니, 진신의 으뜸이요 국가의 시귀(蓍龜)
로다. 대들보가 무너지고 철인이 가거니 하늘은 왜 남겨 두지 않고 갑자기
이에 이르게 하였는가?
공도(公道)를 위해 욺이요 나의 사정일 뿐 아니로다.
아, 슬프도다.
나는 배(腹)를 드러내고 욕되이 그의 사위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은혜는
부자와 같고 의리는 사제(師弟)로 독실하였도다. 바둑도 두어 주고 화살을
안게 한 것은 자애로움의 지극함이라, 30여 년 동안 잠깐도 변함이 없었
도다. 공의 적덕으로 말미암아 가문에 경사가 발양했나니, 난간에선 용(龍)
이 일어나 하늘로 오르는 듯, 어헌(魚軒)은 광채가 나고 학금(鶴禁)에는
상서가 엉겨라, 존귀와 영화 갖추 누렸으며 문호가 번창하였도다.
나는 미천한 유생으로 벼슬이 묘당(廟堂)에 이르렀나니, 이 연줄을 인해
은총이 빛나게 된 것이로다. 중간에 비운을 만나 아내가 죽었으되, 공평하게
어루만져 여전히 간격이 없었도다. 입은 은혜 망극한데 보답을 어찌 잊을쏘냐.
아침저녁 언제나 고당(高堂)에 모시려 하였는데, 어찌 하루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랴. 그 정명(精明)하고 어둡지 않아 유명(遺命)이 낭랑
하거니, 어찌 감히 공손히 받들어 좋은 헌장으로 보존하지 않으랴.
이에 변변치 못한 제물을 갖추어 정성껏 한 잔을 드리건만,
공이 앉아 흠향치 않는지라 나는 눈물만 쏟아지도다.
영명한 영혼이 있다면 생시와 같이 오르내리며 막힘 없이 감통(感通)하여
나의 진심을 알아주리.
아, 슬프도다.
1) 배(腹)를…사위 : 극감(郤鑒)이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왕도(王導)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왕도의 자제와 문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위의를 차렸으나, 그 중
왕희지(王羲之)는 가식이 없이 태연하게 배를 긁으며 밥을 먹고 있기에 그를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晉書 王羲之傳)
2) 화살을 안게 : 투호례(投壺禮)를 행할 때, 시종하는 비자(卑者)로 하여금 화살을 안게
하는 것. 예기(禮記) 소의(少儀)에 “어른을 모시고 활 쏠 적에는 화살을 모아 잡고,
어른을 모시고 투호할 적에는 화살을 안는다.” 하였다. 활 쏠 적에는 화살을 모아
잡고, 어른을 모시고 투호할 적에는 화살을 안는다.” 하였다.
3) 어헌(魚軒) : 제후의 부인이 타는 수레의 별칭. 어피(魚皮)로 꾸미기 때문에 어헌이라
한다. (春秋左傳 閔公 2年 注)
4) 학금(鶴禁) : 황태자(皇太子) 궁(宮)의 별칭.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晉)이 백학
(白鶴)을 타고 신선이 되어 갔기 때문에, 태자의 수레를 학가(鶴駕)라 하고
태자의 궁을 학금이라 한다. (錦字箋)
주석 : 여흥민씨 민제의 호가 어은(漁隱)이다. 9世 조박의 장인이며, 태종의 장인이다..
여흥부원군 민제의 조부 민적(閔頔)의 장님이 급암 민사평으로 6世 삼장법사
의선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민사평의 장인은 언양김씨 좌정승 정렬공(貞烈公)
김륜인데 6世 조서의 사위 언양군(彦陽君) 김경직(金敬直)의 부친이다.
양촌선생문집 제35권 / 동현사략(東賢事略)
판문하(判門下) 조인규(趙仁規)
공은 자는 거진(去塵)이요,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아버지 영(瑩)은 금오위 별장(金吾衛別將)을 지냈는데 추밀원 부사
(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큰 뜻이 있었다.
당시에 서산(西山 평양을 말한다) 자제 중에 통민(通敏)한 자로 몽고어
(蒙古語)를 익히게 하였는데, 공이 이 선발에 참여되어 공부가 동료 가운데
으뜸이었다.
충렬왕이 세자로 입조할 때 공이 따라갔으며, 4년간 호종(扈從)하면서
도운 바가 많았다.
왕위를 이어 나라로 돌아옴에 이르러서는 두루 요직을 역임하여서 지위가
총재(冢宰)에 올랐으며, 또 원(元)의 삼주호부(三珠虎符)를 받았다.
대덕(大德 원 성종의 연호) 무술년(1298, 충렬왕24)에 무고를 받고 경사에
불려갔으나, 대의를 굳게 지니고 시종 변치 않으면서 인하여 도하(都下)에
7~8년을 머무르니, 제(帝)가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겼다.
을사년에 조서를 받들고 돌아와 복직하여 일을 보았으며,
지대(至大 원 무종(元武宗)의 연호) 무신년(1308, 충렬왕34) 4월에 처음
종기가 났는데 공이, “내가 평생 나라일을 위해 애쓰노라 자리가 따뜻한
적이 없었고, 높은 품계에 올라 나이 70이 넘었으니, 사생(死生)은 명이
있는 것이라 마땅히 그 바름을 순히 받겠다.”
하고, 약을 먹지 않고 졸하였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공은 사람됨이 풍의가 아름답고 과묵하였으며,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전기(傳記)를 널리 읽었으며, 평소에 남을 대할 때는
부드러우나 일에 임하면 굳세어서 아무도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사명을 봉행한 것이 모두 30번이었으며 여러 번 공을 세웠다.
처음에 왕(王)의 집안 사람이 우리나라와 숙감(宿感)이 있어 고유한 풍속을
고치려고 제에게 아뢰어 일이 일이 헤아릴 수 없게 되매,
공이 혼자서 경사에 들어가 분명히 가려 주달(奏達)하여
고려의 풍속을 그래로 두겠했으며,
또 서북의 두 국경 지방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은
모두 공이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한 공이다.
주석 : 정숙공이 원에 빼앗긴 평안도를 단기 필마로 되찾아왔고, 원이 고려의 풍속을
바꾸려 할 때 홀로 고려 풍속을 유지시킨 일 등을 권근의 양촌집과 동현사략
(東賢事略)에 기록되어 있다.
번역 : 국학자료원.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희, 장순범, 정기태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고려사, 양촌집, 안동권씨대종회, 파주염씨대종회,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