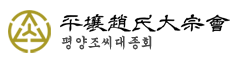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 경사(京師) 보은광교사(報恩光敎寺)의 기문
법호 : 순암(順菴), 당호 :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이곡(李穀) 가정집 제2권 / 기(記)
경사(京師) 보은광교사(報恩光敎寺)의 기문
연우(延祐) 정사년(1317, 충숙왕 4)에 고려 국왕 휘(諱) 모(某 충선왕 )가 이미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경사(京師 연경 )의 저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성(故城)의 창의문(彰義門) 밖에다 땅을 구입하여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3년이 지난 기미년(1319)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거처할 곳을 비롯해 재를 올리고 법회를 열 때의 도구 등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사찰의 이름을 대보은광교사(大報恩光敎寺)라고 내걸었다. 그리고는 전당(錢塘)의 행 상인(行上人)에게 명하여 천태교(天台敎)의 강석을 펴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이 다시 산으로 돌아갔으므로, 그 이듬해에 화엄교(華嚴敎)의 대사 징공(澄公)을 초빙하여 사찰의 일을 주지(主持)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왕이 황제의 명을 받고서 강남으로 향을 받들고 가기도 하고, 서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기도 하는 등 편히 거처할 겨를이 없다가 태정(泰定) 을축년(1325)에 경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징공도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입적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그대로 사찰에 거주하였으나 모든 일이 이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금상(今上) 원 순제(元順帝)이 즉위한 해 3월에 현재의 고려 국왕과 심왕(瀋王)이 부왕(父王)의 유명(遺命)에 따라 본국의 천태사(天台師) 주지영원사(住持瑩原寺) 중대광(重大匡) 자은군(慈恩君) 특사 정혜원통지견무애삼장법사(特賜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 선공(旋公)을 불러서 그 사찰을 주지하게 하였다. 그러자 선공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여기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니, 사찰의 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기문을 지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선왕은 세황(世皇 원 세조(元世祖) )의 외손으로, 좌우에서 모시며 천자의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덕(大德) 말년에는 난리를 평정하는 데에 참여하여 제실(帝室)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왕작(王爵)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내팽개치고 불교에 온통 마음을 쏟았는데, 불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불경을 보시하고 불공을 올리고 불승을 공양한 일 등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사찰을 지을 적에도 동우(棟宇)를 웅장하게 하고 자저(資儲)를 풍부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불자로 하여금 그 도를 정성껏 닦아서 임금과 국민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등 성대한 복덕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1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지할 적임자를 얻지 못한 가운데, 동우는 위태하여 제대로 부지하지를 못하고 자저는 사람들이 각자 이익을 꾀하여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고(鐘鼓)는 적막해지고 향화(香火)는 쓸쓸해지고 말았으니, 이른바 도를 닦는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불교를 숭상하고 믿은 왕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었다고 하겠는가. 지금 고려 국왕과 심왕이 부왕의 유명을 받들어 적임자를 택해서 위임하였으니, 어버이의 뜻을 계승한 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선공(旋公)과 같은 분은 선왕의 뜻을 제대로 체득하여 전인이 행한 일을 결코 답습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른바 복전(福田)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더욱 굳어지고 그 이익이 더욱 확대되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게끔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 기문을 쓰게 되었다.
사찰은 대지가 50묘(畝) 남짓 되고 동쪽에 부속 토지 3묘가 있다. 건물은 100여 동이다. 양향(良鄕)에 밭을 산 것이 3020묘요, 소주(蘇州)에 소주(蘇州)에 산 것은 30경(頃)이며, 방산현(房山縣)에 과원(果園) 120묘가 있다. 사찰을 조성하는 데에는 저폐(楮幣)로 모두 50여 만 민(緡)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지원(至元) 2년(1336, 충숙왕 복위 5) 8월 모일에 기록하다.
1) 왕이 …… 없다가 :
양위(讓位)한 상왕(上王) 즉 충선왕이 참소에 걸려 유배당한 것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가정집》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대략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그 과정을 아래에 간단히 설명한다. 원 영종(元英宗)이 즉위한 해인 1320년(충숙왕 7) 3월에 상왕이 환자(宦者)인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 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4월에 상왕이 장차 시사(時事)가 변할 것을 감지하고는 환란을 피할 목적으로 황제에게 어향(御香)을 강남(江南)에 내리기를 청하여 5월에 향을 받들고 강남으로 갔다. 6월에 상왕이 금산사(金山寺)에 이르자 황제가 사람을 보내 체포하여 압송하게 하는 한편, 8월에 백안독고사 등에게 토지와 노비를 다시 지급하게 하였다. 9월에 상왕이 대도(大都) 즉 연경(燕京)에 이르자 황제가 본국에 호송하여 안치하게 하였으나, 상왕이 머뭇거리며 떠나지 않자 10월에 상왕을 형부(刑部)로 내려 보냈다가 이윽고 머리를 깎아 석불사(石佛寺)에 안치하였다. 그러다가 12월에 결국 백안독고사의 참소에 걸려 황제의 명을 받고 토번(吐蕃)의 철사길(撤思吉) 지역으로 귀양 갔다가, 영종 3년에 타사마(朶思麻)로 양이(量移)되었다. 그해 9월에 영종이 시해되고 진종(晉宗)이 즉위하여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며 왕을 소환하였으므로 11월에 마침내 대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2) 고려 국왕과 심왕(瀋王) :
국왕은 충숙왕을 가리키고, 심왕은 심양왕(瀋陽王)의 준말로 여기서는 왕고(王暠)를 가리킨다. 심양왕은 당초 원 무종(元武宗)이 충선왕에게 내린 봉호인데, 충숙왕 3년 3월에 충선왕이 황제에게 주청하여, 심왕의 세자로 삼았던 왕고에게 심왕의 지위를 전하고 자신은 태위왕(太尉王)이라고 칭하였다. 충숙왕 왕도(王燾)는 충선왕의 장자(長子)이고, 심양왕 왕고는 충선왕의 조카이다. 순제(順帝)는 1333년 6월에 즉위하였는데, 이에 앞서 그해 4월에 충숙왕과 심왕이 연경에 있다가 귀국하기 전인 3월에 먼저 의선(義旋)을 연경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 1년 전인 1332년에는 충혜왕(忠惠王)이 연경으로 소환되고, 상왕으로 있던 충숙왕이 복위하는 등 이 사이의 사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3) 선공(旋公) :
승려 조의선(趙義旋)을 가리킨다. 《가정집》 권3 ‘조 정숙공(趙貞肅公) 사당(祠堂)의 기문’에 “정혜원통 지견무애 삼장법사(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의 호를 특별히 하사받고, 천원연성사(天源延聖寺)의 주지(主持)와 본국 영원사(瑩原寺)의 주지를 겸하였으며, 복국우세 정명보조 현오 대선사(福國祐世靜明普照玄悟大禪師)로서 삼중대광(三重大匡)의 품계에 오르고 자은군(慈恩君)에 봉해졌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는 정숙공 조인규(趙仁規)의 아들인데, 이 밖에 조순암(趙順菴)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4) 대덕(大德) …… 세웠다 :
대덕은 원 성종(元成宗)의 연호이다. 대덕 11년(1307, 충렬왕 33) 정월에 성종이 죽자 황후가 임조(臨朝)하였다. 황질(皇姪)인 애육여발력팔달(愛育黎拔力八達) 태자와 우승상 답라한(答剌罕)이 회령왕(懷寧王) 해산(海山)을 황제로 세우려고 꾀하였는데, 이 모의에 충선왕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2월에 안서왕(安西王) 아난달(阿難達)을 추대한 좌승상 아홀태(阿忽台) 등을 복주(伏誅)하고 해산을 황제로 세우니, 이 사람이 무종(武宗)이다. 무종이 즉위하고 나서 익찬(翊贊)의 공이 있다 하여 충선왕을 공신에 녹훈하고 심양왕(瀋陽王)에 봉하였다.
5) 어버이의 …… 효 :
“효라는 것은 어버이의 뜻과 사업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는 말이 《중용장구(中庸章句)》 제 19 장에 나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주석 :
6世 삼장법사 의선은 당시의 다른 스님들과 다르게 고국인 고려에서 승과에 합격하여 20대 초반 선사라는 법계를 얻었다. 의선은 개성 묘련사에서 출가하여 여러가지 예법을 익혔는데, 이런 능력으로 원의 수도에 있는 대천원연성사의 주지를 역임했는데 당시 많은 스님들은 원에서 불교를 배워 고려에서 고승의 대접을 받았다면, 의선은 고려에서 고승이 되어 고려의 불교의 예법을 원에서도 펼쳤다고 수 있는 것이 다른 고려말 고승과 다른 점이다. 기문을 작성한 가정 이곡도 고려에서 과거에 합격하고, 원의 과거에도 합격하여 고려의 학문을 원에서 펼쳤다. 이런 점에서 6世 삼장법사 의선과 가정 이곡은 서로 잘 통했다 할 수 있다. 보은광교사(報恩光敎寺)는 원의 수도 대도(현 북경)에 있던 절이다.
동문선 제70권 / 기(記)
경사 보은 광교사 기(京師報恩光敎寺記)
이곡(李穀)
연우(延祐) 정사년에 고려국 왕 모(某)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 경사(京師)의 저택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옛 성 창의문(彰義門) 밖에 땅을 사서 범찰(梵刹)을 창건하였는데, 3년이 지난 기미년에 공사가 준공되었다. 부처님을 모시고 승려가 거처할 곳과 재 올리고 법회 볼 때에 소요되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이름을 대보은광교사(大報恩光校寺)라 하고, 전당(錢塘)의 행상인(行上人)에게 명하여 천태교(天台敎)를 강연하게 하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산으로 돌아갔다. 그 이듬해에 화엄교사(華嚴敎師) 징공(澄公)을 초청하여 절 일을 맡게 하였더니, 얼마 후에 왕이 명령을 받들고 강남으로 향을 가지러 가고 또 서역에서 교법을 구하느라고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더니, 태정(泰定) 을축년에 경사에서 세상을 떠나고, 징공도 바로 입적(入寂)하게 되니 그 문도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었으나 일은 폐지되고 해이해졌다.
금상(今上)이 즉위하신 해 3월에 지금 고려국 왕과 심양왕(瀋陽王)이 부왕의 유언으로 본국의 천태사(天台師) 영원사 주지(瑩原寺住持)이고 중대광자은군(重大匡慈恩君)이며 특별히 하사한 정혜원통지견무애삼장법사선공(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旋公)을 불러서 그 절을 맡게 하였더니 선공(旋公)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본고향 사람이니 이 절의 옛 일을 알 것이다. 이 절의 기문을 지으라.”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선왕이 세황(世皇 원나라 세조(世祖))의 외손으로 좌우에서 계속해 모시고 있다가 하늘의 은총을 입어서 대덕(大德) 말년에 난리를 평정하는데에 참여하여 황실(皇室)에 훈공을 나타냈고, 중년이 되어서는 왕이란 작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교에 전심하여 그 탑과 절을 짓고 불상을 제조하고 내전(內典)을 시주하였으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스님에게 시주한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절을 짓는 데에는 그 재목과 집을 웅장하게 하고 그 자재와 저축을 풍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불교 신자들로 하여금 그 도를 정성껏 닦아 임금이 장수하게 하고 나라가 복되게 하여 큰 이익이 무궁하게 가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십 수년도 못 되어 적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둥과 집이 위태하여 성치 못하고, 자재와 저축은 서로 빼내어서 제 이익을 삼았으므로, 종고(鍾鼓)가 고요해지고 향불이 쓸쓸해졌으니, 이른바 도를 닦았다는 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왕의 숭상하는 마음이 또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제 두 왕이 능히 유명(遺命)을 따라서 적임자를 택하여 맡겼으니 뜻을 계승한 효도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선공 같은 이는 능히 선왕의 뜻을 본받아서 이전 사람들이 하던 짓을 답습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복전(福田)이라는 것이 그 기초가 더욱 견고하여 그 이익됨이 더욱 넓어질 것이니,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기문을 쓰노라. 절의 대지는 50묘(畝)가 조금 넘고 동쪽에 붙어 있는 3묘에 집 1백여 칸을 지었고, 양향(良鄕)에서 밭을 산 것이 3천 2십 묘가 되고, 소주(蘇州)에 있는 것이 30경(頃 백묘)이고, 과수원으로 방산현(房山縣)에 있는 것이 백 20묘이니, 모든 비용이 지폐로 50여 만 민(緡)이라고 한다. 지원(至元) 2년 8월 어느 날에 기문을 쓴다.
1) 왕이 명령을…겨를이 없더니 :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토번(吐藩 지금의 서장(西藏))으로 귀양갔던 일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2) 지폐 :
원나라 시대에는 종이로 화폐(貨幣)를 만들어 썼으므로 그것을 지폐[楮貨]라고 문장상에 쓰지만, 전의 이름은 초표(鈔票)라 하며, 민(緡)은 꿰는 끈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 엽전에는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백닙씩으로 꿰서 한 냥(兩)으로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68
주석 :
한산이씨 가정 이곡은 6世 삼장법사 의선과 원의 수도 대도(현 북경)에서 함께 친교를 맺고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아들 목은 이색은 조선 성리학자들의 스승으로, 부친 이곡처럼 6世 삼장법사 의선 및 우리 가문과 관련있는 인물들과 의선의 제자들과 친교하며, 목은집에 많은 기록을 남겨두었다. 8世 조호(趙瑚)는 목은 이색의 제자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가정집, 목은집,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작성사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