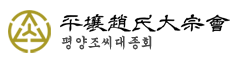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 계림부(雞林府) 공관(公館) 서루(西樓)의 시서(詩序)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이곡(李穀) 가정집 제10권 / 서(序)
계림부(雞林府) 공관(公館) 서루(西樓)의 시서(詩序)
내가 동경(東京 경주(慶州) )의 객사에 도착한 뒤에 동루(東樓)에 올라가 보았더니 아름다운 경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서루에 올라가 보았더니 꽤나 장려하였음은 물론 앞이 툭 틔어서 성곽과 산천이 한눈에 모두 들어왔다. 그런데 삼장법사(三藏法師) 선공(旋公)이 의풍루(倚風樓)라고 큰 글자로 쓴 현판만 붙어 있을 뿐, 제영(題詠)한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생각건대 이 계림부는 1000년을 이어 온 왕도(王都)로서 고현(古賢)의 유적이 가는 데마다 남아 있고, 본국에 편입되어 동경이 된 뒤로 또 장차 500년이 되려고 하니, 번화하고 가려(佳麗)한 면에서 동남 지방의 으뜸이 되는 곳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절(符節)을 나누어 받고 이곳에 와서 풍속을 관찰하고 교화를 선양한 자들 또한 시인 묵객이 많았을 것이니, 짐작건대 홍벽(紅壁) 사롱(紗籠)과 은구(銀鉤) 옥저(玉筯)가 그 사이에서 휘황하게 비쳤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빈헌(賓軒)에 걸린 절구 한 수가 유일한데, 이 시는 선유(先儒) 김군수(金君綏)가 수창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말하기를 “과거에 관사에 화재가 났을 적에 시판(詩板)도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혹자의 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향교의 어떤 유생이 말하기를,
“김공의 시가 지금 우연히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100년 전의 풍류 인물(風流人物)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대개 그 당시에는 백성이 순박하고 정사가 간편해서 일이 생기면 선뜻 처리하고 흥이 일면 곧장 풀곤 하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서를 앞에 벌여 놓고 이와 함께 악기를 뒤에 진열해 놓더라도 남들이 그르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혐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뒤에는 스스로 겉모양을 닦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조차 때에 맞지 않을까 겁내고 있으니, 어떻게 감히 등림(登臨)하여 소영(嘯詠)함으로써 부유(腐儒)의 시빗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겠는가. 지금 선생으로 말하면 풍속을 관찰하고 교화를 선양할 책임도 없이 자연의 승경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다. 그리하여 만 길 높이의 풍악과 설산(雪山 설악산(雪嶽山) )을 마음껏 관람하고, 다시 철관(鐵關 철령(鐵嶺) )을 넘어 동해로 들어와서 국도(國島)의 기이한 비경을 끝까지 돌아보았으며, 마침내는 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총석정(叢石亭)의 옛 비갈(碑碣)과 삼일포(三日浦)의 단서(丹書) 여섯 글자를 어루만져 보았다. 그리고는 영랑호(永郞湖)와 경포(鏡浦)에 배를 띄우고 사선(四仙)의 유적을 탐방하였는가 하면, 성류굴(聖留窟)을 촛불로 밝혀 그 유괴(幽怪)한 모습을 빠짐없이 구경한 뒤에 드디어 이곳에 이르렀으니, 선생의 유람이야말로 원하는 대로 실컷 구경했다고 이를 만하다. 그렇긴 하지만 신라 고도(古都)의 장관과 조망이 모두 이 누대안에 모여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다면 이는 선생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내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미 앞에서 운운하지 않았던가. 다만 나는 시인 묵객의 무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 하였다.
그러나 제생(諸生)의 말에 깊이 느껴지는 점이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의 변천도 살펴볼 수가 있었으므로, 장구(長句) 사운(四韻)의 시 한 수를 지어서 이 누대에 오르는 자들에게 보여 주기로 하였다.
동쪽 서울 풍물이 아직도 번화한데 / 東都風物尙繁華
다시 고루 일으켜 자하를 떨쳤어라 / 更起高樓拂紫霞
성곽은 천 년을 이은 신라의 건축이요 / 城郭千年羅代樹
여염은 반절이나 부처 모신 집들일세 / 閭閻一半梵王家
구슬발 다 걷으니 마치 그림 같은 산들 / 珠簾捲盡山如畫
옥피리 다 불어도 아직 날은 기울기 전 / 玉笛吹殘日未斜
기둥에 기대어 시 읊자니 혼자 우스워 / 倚柱吟詩還自笑
다시 와도 벽사롱(碧紗籠)은 필요없다오 / 重來不必要籠紗
1) 선공(旋公) :
승려 조의선(趙義旋)을 가리키는데, 순암(順菴)으로 많이 알려졌다. 《가정집》 권3 ‘조 정숙공(趙貞肅公) 사당(祠堂)의 기문’에 “정혜원통 지견무애 삼장법사(定慧圓通知見無礙三藏法師)의 호를 특별히 하사받고, 천원연성사(天源延聖寺)의 주지(主持)와 본국 영원사(瑩原寺)의 주지를 겸하였으며, 복국우세 정명보조 현오 대선사(福國祐世靜明普照玄悟大禪師)로서 삼중대광(三重大匡)의 품계에 오르고 자은군(慈恩君)에 봉해졌다.”고 소개되어 있다. 정숙공은 그의 부친 조인규(趙仁規)이다.
2) 홍벽(紅壁) 사롱(紗籠) :
붉은 칠을 한 벽에 푸른 깁으로 장식해 놓은 시문이라는 뜻이다. 홍벽에 대해서는 당(唐)나라의 시인 허혼(許渾)의 재유고소옥지관(再游姑蘇玉芝觀) 시에 “달빛 어린 푸른 창은 오늘 밤의 술자리요, 비 자욱했던 붉은 벽엔 거년의 글씨로다.〔月過碧窓今夜酒 雨昏紅壁去年書〕”라는 구절이 있다. 사롱은 즉 벽사롱(碧紗籠)으로, 옛날 귀인과 명사가 지어 벽에 걸어 놓은 시문을 청사(靑紗)로 덮어서 오래도록 보존하며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을 말한다. 당나라 왕파(王播)가 어려서 가난하여 양주(楊州) 혜소사(惠昭寺) 목란원(木蘭院)의 객이 되어 글을 읽으며 승려들을 따라 잿밥〔齋食〕을 얻어먹었는데, 승려들이 염증을 내어 재가 모두 파한 뒤에야 종을 치곤 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뒤에 왕파가 중한 지위에 있다가 이 지방에 출진(出鎭)해서 이 절을 찾아갔더니, 지난날 자기가 지어 놓은 시를 벌써 푸른 비단으로 감싸 놓고 있었으므로, 그 시의 뒤에 “이십 년 동안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오늘에야 푸른 깁으로 장식되었구나.〔二十年來塵撲面 如今始得碧紗籠〕”라고 지어 넣은 고사가 있다. (唐摭言 起自寒苦)
3) 은구(銀鉤) 옥저(玉筯) :
초서(草書)와 전서(篆書) 등의 멋진 필법으로 써넣은 글씨를 말한다. 진(晉)나라 색정(索靖)이 서법(書法)을 초서(草書)와 전서(篆書) 등의 멋진 필법으로 써넣은 글씨를 말한다. 진(晉)나라 색정(索靖)이 서법(書法)을 논하면서 “멋지게 휘돌아 가는 은빛 갈고리〔婉若銀鉤〕”라는 표현으로 초서를 형용한 고사가 있다. 《晉書 卷60 索靖傳》 옥저는 진(秦)나라 이사(李斯)가 창안한 소전(小篆)의 서체를 말한다.
4) 국도(國島) :
고성(固城) 위에 위치한 안변(安邊) 앞바다의 작은 섬 이름이다.
5) 총석정(叢石亭)의 옛 비갈(碑碣) :
사선봉(四仙峯) 동쪽 봉우리 위에 비면(碑面)이 떨어져 나가고 닳아 없어진 채 남아 있는 비갈을 말한다.
6) 삼일포(三日浦)의…글자 :
신라 시대의 이른바 사선(四仙)이 사흘 동안 머물며 노닐었다는 곳의 석벽에 새겨진 ‘술랑도남석행 (述郞徒南石行)’이라는 붉은색의 여섯 글자를 말하는데, 사선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 비문의 해석이 다양하여 아직 정설이 없다.
7) 그리하여…이를 만하다 :
가정집 권5 동유기(東遊記)에 이상의 여러 곳을 유람한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주석 : 의풍루는 경주시에 있는 동경관(東京館)의 부속 건물로 고려시대 건축물이다. 현 건물은 정조대왕 1786년 지은 것으로 고려, 조선시대 중앙에서 지방에 부임해 내려오거나 부임 도중에 그곳을 거치는 관리, 나아가 외국 사신들을 위한 숙소로써 기능하였으며, 동시에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하여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방관들이 모여 전패에 대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望闕禮)를 올리는 예식이 시행 되는 곳이기도 했다. 6世 삼장법사 의선이 쓴 현판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아쉽게도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송당집 제1권 / 칠언절구(七言絶句)
계림 의풍루 시의 운을 빌려〔次鷄林倚風樓詩韻〕
하나〔其一〕
어느 집이 이원 제자 집이런가 / 誰是梨園弟子家
허공에 우뚝한 나무에 석양이 많기도 하네 / 半天喬木夕陽多
그 당시의 문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 當時文物今安在
단지 구산이 짙푸름을 간직하고 있다네 / 秪有龜山學翠華
둘〔其二〕
경작하는 땅은 모조리 오후 집에 다 들어가니 / 犁鋤盡入五侯家
머리 긁으며 언덕에 올라선 옛 생각에 잠기네 / 搔首登臨古意多
천 년의 은나라 귀감 너무도 분명하니 / 千載分明殷鑑甚
진실로 알겠네 천명은 사치로 잃는다는 것 / 固知天命失奢華
1) 의풍루(倚風樓) :
계림부(鷄林府)의 공관 서쪽에 있는 누각의 이름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尙道 慶州府)
2) 이원 제자(梨園弟子) :
이원은 배우(俳優)들의 기교(技巧)를 닦는 곳이고 제자란 연극(演劇)하는 배우와 악인(樂人)을 지칭하는 말이다. 당 현종(唐玄宗) 때 장안(長安)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의 궁정에다 제자 3백 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가르쳤던 데서 연유한 것이다.
3)구산(龜山) :
경주부(慶州府) 구산현(龜山縣)에 있는 산이다.
4) 짙푸름 :
원문의 ‘취화(翠華)’는 푸른 깃털 장식의 깃발 혹은 수레로, 대가(大駕)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구산의 푸른 산빛이 당시의 화려했던 왕의 행차를 상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5) 오후(五侯) :
한 성제(漢成帝) 때 황실의 외척인 왕씨(王氏)로서 같은 날 똑같이 후(侯)에 봉해진 왕담(王譚)ㆍ왕상(王商)ㆍ왕립(王立)ㆍ왕근(王根)ㆍ왕봉시(王逢時) 등 다섯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특히 음식 사치를 대단히 숭상하였다. 여기서는 권문귀족을 말한다.
6) 천…귀감 :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석 : 8世 조준이 1382년 전법판서(典法判書) 일 때 경상도체복사(慶尙道體覆使)로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 하였는데 이 때 경주 의풍루에 올라 지은 시로 추정된다. 시는 8世 조준의 송당집(松堂集)에 수록되어 있다.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의풍루 현판의 대자는 서거정의 사가분집 제1권 기(記)경주(慶州)의 의풍루(倚風樓)를 중신한 것에 대한 기문, 임하필기 제11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전조(前朝)의 궁전(宮殿) 등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기록 되어있다.
경주신문 2020년 5월 28일 기사에 의풍루의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www.gjnews.com/news/view.php?idx=67774
출처 : 이색 목은집(牧隱集), 조준 송당집(松堂集), 서거정 사가집(四佳集), 이유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사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